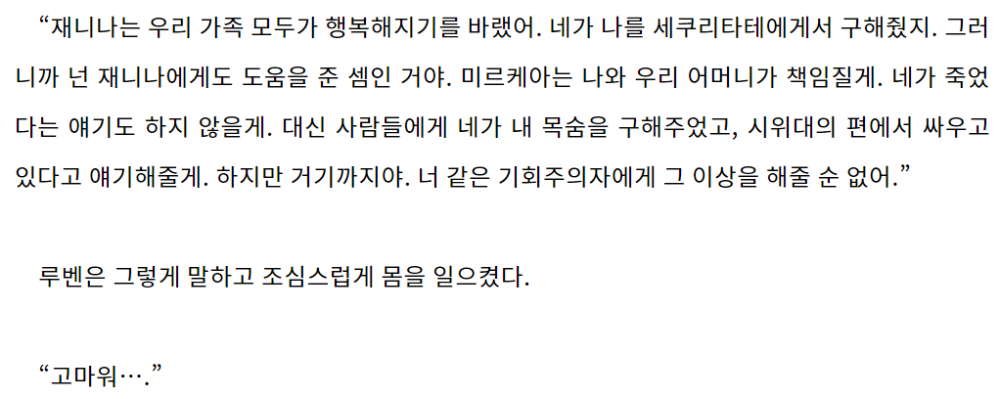작품 속 주인공인 “라즈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될 만한 캐릭터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많이 동정이 가기도 하지만, 역사의 냉엄한 평가로는 독재세력의 소극적인 동조자쯤으로 간주될 “나약한 지식인”의 전형이다. “거울”은 죄의 무게를 견딜만큼 드세지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만큼 뻔뻔하지도 못했던 여린 청춘의 말로(末路)를 비추고 있다.
** 이하 작품 스토리가 있으니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작품의 주요 소재인 “거울”의 변화가 재미있다. 처음에는 회피의 수단으로, 두번째는 부재(不在)함으로써 현실을 일깨우고, 종국에는 다시 나타나 “라즈반”의 모습을 비춘다. 거울의 본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라즈반의 양심이 돌아왔음과 양심을 외면했던 댓가를 치루고 있다는 걸 한번에 보여준다.
“거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대사는 “루벤”을 구해주던 “라즈반”을 “루벤”이 쏘는 장면에서 나온다.
“라즈반”은 시작부터 끝까지 죄의 무게에 눌려 지내던 주인공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어두운 분위기가 작품 전체에 묻어나고 있다. “라즈반” 가족이 독재자의 빌붙어 살아오면서 “루벤”의 가족에게 끼친 피해는 복구될 수 없다. “라즈반”이 종반부에 실천하는 행동은 용서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라즈반” 스스로가 본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확인하는 발버둥이라고 본다.
그 심판자로써 “루벤”의 모습은 가히 명판결에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공과(功過)를 확실하게 구분짓고 “라즈반”에게 선언하듯 알려준다. “고마워…”라는 “라즈반”의 대사가 잘 씌여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짧은 한 마디로 독자에게 그간의 힘든 여정을 감상할 여운의 시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라즈반”에겐 뜻밖의 일이었겠지만 “루벤”에게 죽게 되어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정확한 심판자에게 적확한 판결내용을 듣고 마침내 죄의 무게를 털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