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 작품이 매우 개인적인 이유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독자의 (매우 개인적인)입장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 20대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어요. 답답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해방되자마자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수업을 듣고, 서클 활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와 밥을 먹고, 연애를 하고, 즐거운 일 때로는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에 대한 추억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어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의 상당수가 도쿄나 도쿄 같은 대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저도 도쿄에서 5년을 살았지만, 또 그만큼 시간을 일본의 어느 지방도시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추억이 어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디냐고요? 안 알려줄겁니다. 이 작품처럼 말이죠. 대신 ‘그곳’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아마도 일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뚜렷한 랜드마크가 드러나지도 않죠. 덕분에 저는 제 추억의 장소를 대입할 수 있었어요. 약간 색이 바랜, 인스타그램의 필터를 덮어 쓴 듯한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면서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전 비록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지만, 추억 속 ‘그곳’에서 있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바로 그곳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매일 아침, 비가 내리고 아마 하루 종일 내릴 것 같습니다. 전 이런 날씨를 매우 좋아합니다. 빗방울이 창문과 물웅덩이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소설 속에서 ‘비’라고 하면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 해도 가뭄 뒤의 비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 작품에선 그저 일상의 한 요소일 뿐이고, 저는 오히려 초여름에 내리는 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느낀 비의 느낌이 바로 이거에요. 아마도 작가님의 담담한 서술이 이런 비의 느낌을 제게 전달해준 것 같습니다. 참 좋았어요.
미나가와 히로미, 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에쁜 이름이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제 지인 중에 미나가와 히로미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미나가와라는 사람이 있었고, 히로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노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일본인의 이름을 지을 때는 뭔가 독특한 이름을 가져올 때가 많다고 느끼는데, ‘미나가와 히로미’라는 흔하면서도 부드럽게 울리는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네, 저는 좋은 이름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매우 개인적인’이라는 부분은 조금 덜겠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있으니, 독자와 작가가 섞인 입장에서 바라 볼게요.
소설의 첫 인상은 반복되는 일상을 조금씩 다른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작가님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같은 일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약’에 대한 언급은 있을 때고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이 풍부한 문장력과 표현력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루프물을 썼는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결국엔 똑같이 반복될 틈을 주지 않고 사건을 키우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이기도 했죠. 작가님이 쓰신 아침 풍경 하나하나가 버리가 아까울 만큼 마음에 들어서, 루프물이라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이 작품에선 여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앞서 ‘약’에 대해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해주지는 않아요. 즉, 반복되고 있음에도 생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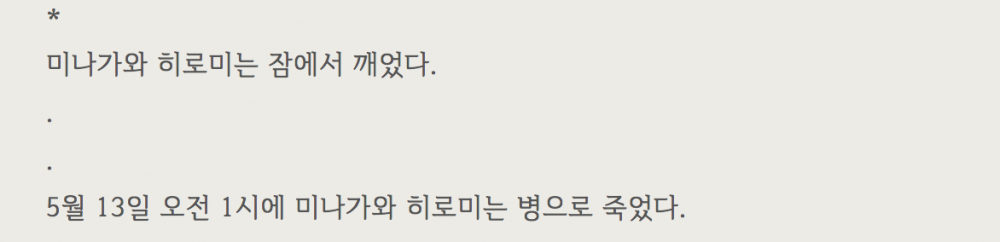
이 부분입니다. 미나가와 히로미는 잠에서 깼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죽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완벽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날을 반복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죠. 그런데 작품 속에선 겨울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저 히로미와 인사하고, 시간을 좀 보낼 뿐이죠.
하지만 겨울은 말합니다.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 안 할래.”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날을 반복해서 지켜보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저 여백 사이에서 겨울이 히로미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한 건 아닐까, 상상했습니다. 의사를 불렀을 수도 있고,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 비상용 제세동기를 썼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히로미의 증상에 대해 공부해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이건 본문에서도 살짝 보여주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도 히로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저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작가님이 남겨주신 여백 덕분에 저는 이런 상상을 했고, 그 여운이 굉장히 진하게 남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았기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야기를 거기에 채워넣을 수 있었어요.
작가님께서 저 여백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그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다뤄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히로미는 작품 속에서 홋카이도 여행, 버킷 리스트, 피아노, 벗꽃 축제, 병원, 약, 그리고 비오는 날을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 겨울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겨울은 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홋카이도는 그날 아침에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저 모든 걸 이야기 했을 때 히로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 과거에도 말한 적 없다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저 루프의 여백 속에서, 히로미가 자신의 시한부 운명에 대해 겨울에게 말하게 되는 어떤 일, 어쩌면 작품 속에서 서술되는 그 어떤 루프보다도 극적인 어떤 일이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또 한가지, 신선하다고 생각한 건 타임루프를 인지하지 못하는 히로미의 시선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루프물은 루프를 인지한 사람들이 루프를 벗어나거나 그걸 이용하려는 이야기에요. 하지만 여기서 히로미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겨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루프를 인지하고 있는 겨울의 심리변화를 히로미의 시선에서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겨울도 처음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에요. 그래서 루프 초반엔 그저 ‘아, 저 사람 꿈에서 봤어.’하는 정도죠. 그냥 인사만 해요. 하지만 후반부로 갈 수록 겨울은 자꾸 히로미에게 다가서려고 하고 점점 절실해지다가 자살시도까지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히로미의 품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루프물들을 통해, 우리는 루프 속에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 사실 읽기도 전에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작품에선 루프를 인지하지 못하는 제3자의 시선을 통해 서술되면서 그동안 익숙하다고 느껴져온 루프 속 인물의 감정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금 곱씹게 만들어 줍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 되지 않았기에, 겨울이 터뜨린 감정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 뒤로도 어김없이 루프는 반복되고 미나가와 히로미는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히로미는 다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왠지모르는 기시감과 함께.
.
.
그래서 전 이 작품이 참 좋았습니다.
(여담)
전 어느 작품을 문학적 측면에서, 혹은 실전적 글쓰기 측면에서 비평할 수준은 못됩니다. 이 글에는 장점도 단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우유부단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쉬움을 느끼더라도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작품의 아쉬운 점? 아마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제목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물론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작품 속에서 직접 언급되지도 않는 단어이고, 10분 길어야 20분이면 다 읽는 단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런 수고를 감수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며칠 씩 읽는 장편과는 다른 전략의 제목을 붙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작품에서 제목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그리고 기승전결이라고 해야하나요, 긴장의 리듬이 별로 없어서 저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몰입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따분해 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적이고 평화로운 일본영화의 일상물이 인기를 끌기도 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죠.
어제 ‘주례사 비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보니, 좋은 말만 늘어놓을 것에 대해 살짝 도망갈 샛길을 하나 써봤습니다.
제겐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