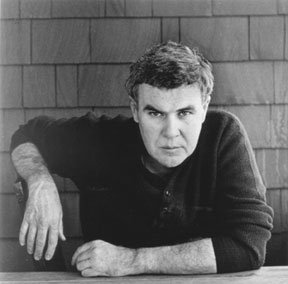창작 관련 강좌를 수강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다.
“설명하지 말고 묘사하세요.”
그리고 훌륭한 묘사를 보여준 고전 작품으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적어도 한번은 언급한다.
적어도, 나의 경험으론 그러했다.
재밌게도, 온라인 플랫폼 소설(소위 웹소설)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와는 정 반대의 이야기를 들었다.
“불필요한 묘사를 줄이세요.“
이건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차이도 아니요,
무엇이 더 좋은 문장이고 아니고의 논쟁거리도 아니다.
문장을 씀에 있어 ‘이렇게 써야 한다’라든가
‘저렇게 써야한다’라는 식의 궁극적인
정답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문장 구사가 그럴 진데, 하물며
‘단편소설’의 형식에 정답인들 있을 리 없다.
창작 교실, 특히 단편소설 가르쳐준다는 강의 또는 스터디에서
레이먼드 카버를 다루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 같다.
한국 문단 작가들이 좋아하는 미국 작가로 알고 있다.
<보바리 부인>과 플로베르는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래서 근시기의 사람을 골라야했을까,
단편소설 가르치는 자리면 카버라는 이름은 항상 거론되었다.
대표작 <대성당>도 그렇고, 카버의 단편 소설은 짧은 순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듯 날렵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그려낸다.
카버를 예시로 들며, ‘단편소설은 이래야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게
대부분 단편소설 창작 강좌의 패턴이다.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교육 패턴이 너무 지겨워서 그렇다.
카버의 스타일로 단편을 쓰자면 세세한 정물화가 그려지겠지만,
긴 시간의 서사는 구축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단편이란 원래 짧을 수밖에 없다며
긴 시간의 서사를 단편의 형식에 구사하려는 것을 객기로 치부한다.
얼씨구, 그럼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은?
짧은 분량으로 영겁의 세월을 담아낸 아시모프의 작품은 뭐란 말인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로 시간을 초월한 테드 창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문장의 구사 형식에 정답도 오답도 없고, 오직 ‘잘 구사했느냐 아니냐’만 있을 뿐.
마찬가지의 논리로, 단편소설도 ‘맞는 형식과 아닌 형식’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잘 쓰면’ 되는 거다.
나는 카버의 작품이 훌륭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내 취향은 카버보다 마르셀 에메에 가깝다.
마르셀 에메와 카버 모두 단편 작가로 유명하지만
두 사람이 단편을 구사하는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
카버가 길어봤자 며칠에 불과한 짧은 순간을 묘사한다면,
마르셀 에메는 시간을 넘나들며 이야기의 상상력을 극대화한다.
나는 <개도둑>을 읽고
마르셀 에메의 단편 하나가 떠올랐다.
<마음이 약한 개는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작품이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다.
단, 반려견과 주인의 이야기라는 점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빚어진 이야기라는 공통점만 언급하겠다.
궁금하시면…. 직접 보세요! 엇흠.
한마디로 <개도둑>이 내 취향이라는 말을
참 길고 길게 돌려서 말한 셈이다.
<개도둑>은 앞서 언급한 마르셀 에메의 작품보다도
더 긴 시간을 작품 속에 녹아내었다.
아마도 근미래 사회라고 짐작되는 공간, 그리고
일견 판타지에 해당하는 마술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반려견이 사건의 중심이자 ‘인물’로 기능하여
우화로서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개도둑>은 단편이라는 짧은 분량에
다채로운 요소들이 화학적으로 잘 조합되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요소들이 배합되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노는
이질성의 위험은 항상 조심해야한다.
<개도둑>이 화학적으로 조합되었다는 말은
앞서 언급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이질적으로 놀지 않고
하나의 서사로 끈끈하게 연결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심층적 감성을
건드리는 데에 성공했다.
나는 무한한 상상력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내 취향이다.
그리고 <개도둑>은 상상의 힘이 아름답고 아련하게 빚어낸 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