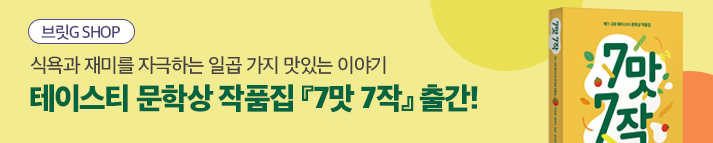21세기 중반이 다 되어가는 어느 적당한 시대를 그려본다. 스마트폰 검색 엔진을 가동하면 화면위로 4D 입체 형상의 퍼스널 인공지능이 떠오르는 세상. 인공지능이 기자도 하고, 요리사가 되기도 하는 세상. 뭐 이런 첨단이 판치는 세상이 <해피 버스데이, 3D 미역국!> 에서 그려지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혹은 이 소설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것은 한식, 중식, 양식은 물론 유행하는 괴상한 음식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3D 푸드 프린터’ 의 존재이다. 레시피만 입력하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내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골라 인터넷으로 결제만 하면 팩스처럼 그 음식이 바로 전송되어오기도 하는 기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푸드 프린터가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의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 소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까?! <해피 버스데이, 3D 미역국!>은 그런 세상의, 그런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른두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는 ‘민주’에게 주간 푸드 칼럼을 작성해야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그 주제는 ‘3D 푸드 프린터의 시대가 오기 전,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의 생일에 손수 끓여 주었던 미역국을 기억하는가?’ 이다. 애당초 엄마가 끓인 미역국을 먹어보지도 민주에게는 기억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감성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다는 사실도 알지만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미역국부터 먹어야 했다. 그런데 때마침 푸드 프린터가 고장이다. 어쩔 수 없이 직접 끓여먹기로 했지만 맛은 엉망이고, 결국에는 직접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안드로이드가 아닌 인간이 하는 포장마차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맛있는 미역국을 맛보게 된다.
배가 고파지는, 그래서 잠자리에서 보면 안 되는 작품이라는 글을 봤다. 이미 야식까지 든든하게 먹었으니 난 괜찮다고 -그게 뭐라고- 어깨에 힘까지 줘가며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꼴깍 침을 넘기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매콤한 고추장 양념의 탱글탱글한 오징어, 두툼한 삼겹살, 치즈가 흘러내리는 계란말이와 흰 쌀밥, 그리고 소고기 미역국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찌 참을 수가 있을까! 사실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군침 도는 음식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을까 싶다. 민주가 그토록 찾고 싶어 하는 맛과 각자가 경험했고 저마다 찾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맛이 교감을 가지면서 모두 각자의 추억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순간의 행복한 맛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 요리사들이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 사람들은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아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맛있는 추억을 공유했다.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즐기는 순간까지 모두 인간의 손끝과 혀를 거쳐 가던 시대였다.
최첨단이 무조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아는 만큼 그 반대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 하냐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훨씬 간편해진 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새삼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편하지만 기계에 둘러싸인 외로운 세상과 조금은 번거롭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많은 세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가족들이 따뜻한 밥상 앞에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는 시간을 떠올리게 된다. 참 맛있고, 따뜻한 이야기였다.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