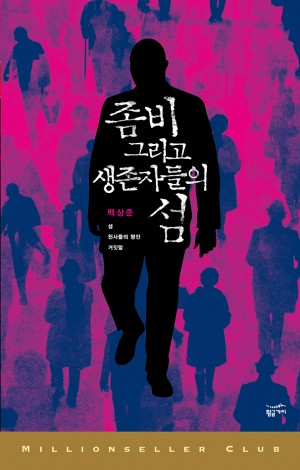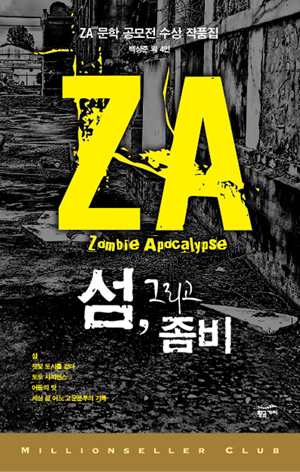대상은 큰 고민 없이 「섬」으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거창한 설정을 동원하거나 진지하게 무게 잡을 생각이 없어보였고 그 점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언뜻 어수룩하고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듯 보이나 깊은 고민 없이는 쉽게 떠올리기 힘든 세밀함이 돋보였다. 갈등이 부족한 게 아쉽지만 짜임새에 있어 다른 작품에 비해 월등했다는 생각이다.가작은 「도도 사피엔스」, 「잿빛도시를 걷다」, 「어둠의 맛」 세 편을 선정했다. 「도도 사피엔스」는 병리학과 해부학 등의 전문지식을 이야기 속에 능숙하게 녹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으나 지나치게 설명조인 데다 흐름이 식상하다는 게 약점이었다.「잿빛도시를 걷다」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절박함이나 가족 혹은 인간관계에 집중한 심리묘사가 장점인 반면 매끄럽지 못한 어설픈 이야기 전개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어둠의 맛」은 좀비문학상의 특성을 비교적 잘 살린 작품이다. 좀비를 통해 용산철거민, 농촌문제, 도시빈민, 현실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적절한 농담과 은유를 섞어 흥미로운 블랙코미디로 풀어냈다. 하지만 설명적이고 평면적인 구성이 재미를 반감시킨다.
심사위원 최종태 영화감독
좀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빨리 떠오르는 것은 흐느적거리며 다가오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의 이미지이다. 그만큼 우리는 좀비를 매우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역질나는 처참한 몰골만으로도 공포와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좀비는 일찍부터 영화에 출연하고 급기야 좀비영화라는 그들만의 장르까지 갖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의 스토리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그런 영화들을 그대로 소설로 옮겨놓는다면 어떨까? 아마도 영화만큼의 재미와 흥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를 펼쳐가는 소설은 영화보다 자유로우며, 영화에서는 다루기 힘든 정서적인 혹은 사색적인 심연의 세계 속으로 독자를 안내할 수도 있다. 아무튼 이번 심사를 통해 영화가 아닌 문학의 방식으로 재탄생한 한국산(?) 좀비들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럴 때엔 영화를 보는 것보다 즐겁고 재미있었다. 조만간 그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좀비 영화가 한국에서도 제작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