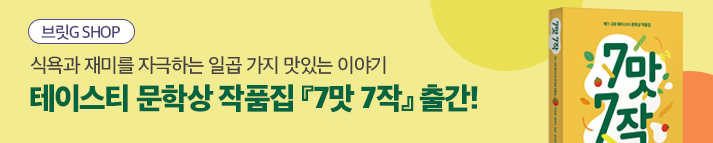어렸을 때부터 종이로 만든 모든 것을 좋아했던 ‘나’는 늘 책에 둘러싸여 지냈지만, ‘종이만으로 마땅히 할 일’을 스스로 찾지는 못했다. 그러다 입간판부터 ‘古書店’인 고서점을 우연히 발견하고선 생활비를 벌 요량으로 하나둘 책을 팔기 시작했고, 그날도 특별할 것 없이 밀린 수도세를 내기 위해 고서점에 들렀을 뿐이었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나 싶더니, 늘 마주하던 서점 주인 대신 이마 사이에 ‘빈디’를 붙인 웬 여자가 등장하고 대뜸 책은 안 팔고 커리를 판단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와중에 자신의 커리를 먹고 평가해달란다. 오늘까지 아무도 찾지 않으면 가게를 접을 작정이었다나.
그렇게 낯선 커리 식당의 낯선 여주인과 기묘한 밀당을 하던 ‘나’는 난생 처음으로 ‘카레’가 아닌 ‘커리’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내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난 엄마를 생각하게 된다. 늘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카레를 만들어놓던 엄마. 그날따라 평소의 두 배나 되는 카레를 만들어놓고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 그런 엄마와 나의 암묵적인 일상식이었던 카레가 아닌, 정통 인도 커리의 깊은 맛에 담뿍 취해있을 무렵 이 낯선 여자는 더 수상쩍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한다.
그녀가 한때 일했던 회사의 사모가 알려준 전설 같은 이야기는 바로 ‘커리우먼’에 얽힌 것이었다. 커리어우먼 같은 것이 아니라, 커리를 끓여놓고 새로운 차원으로 떠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황당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커리우먼의 존재를 알게 된 주인공이 유난스레 카레를 끓여놓고 떠난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을지 궁금해진다. 가장 먼저 자신을 생각하라는 ‘메시지’에 걸맞게 행동했던 엄마를, 커리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차원으로 떠나간 수많은 여성들을.
일상과 환상 사이를 어색함 없이 오가며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커리우먼>은 음식이라는 작은 미덕에 한줄기 빛을 더하는 작품이다. 지겹도록 먹었던 카레는 사실 엄마와 내가 나누었던 유일한 평상식이었고, 평범했던 모든 것은 그 일상성 때문에 그리워지기 마련이라는 깨달음을 던진다. 그렇게 음식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미덕에 빗대어, 평범한 한 끼 식사를 반추하는 동안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책을 팔러 왔다가 인도 커리를 맛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문득 떠난 이들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커리를 끓여놓고 다른 차원으로 떠나간 수많은 커리우먼들은 어떤 일상과 다시 마주하고 있을까. 그 더없는 궁금함을 뒤로 하고, 일단은 뭉근하게 잘 끓여진 인도 커리를 맛보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