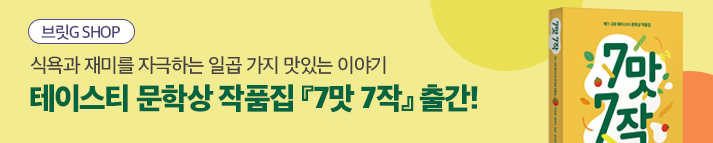아침부터 고서점에 왔다. 문 앞에 낡은 나무판자로 만든 ‘古書店’ 입간판이 눈을 맞고 있다. 나는 얼어붙어 뻑뻑해진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지? 서점 주인의 자리에 전에 없던 붉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보호막처럼 주인을 빙 둘러싸고 있던 책장도 어딘가 사라지고 없다. 텅 빈 홀에는 둥근 탁자 세 개. 예전보다 다소 어두워진 조명이 으스스한 기분까지 불러일으킨다. 재채기를 유발하던 케케묵은 먼지 냄새 대신 산사에 들어온 듯 차분한 향냄새도 희미하게 느껴진다.
마치 ‘고서점’이라는 무대가 끝나고 또 다른 무대가 시작된 것 같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배우가 등장했다. 여자의 목소리는 붉은 커튼 사이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왔다.
슥슥 하고 천을 덧댄 신발 바닥이 땅을 스치는 소리가 난다. 앞코가 버선코처럼 뾰족한 이상한 신발이 내 앞에 멈춰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보다 한 뼘은 큰 장신의 여자가 두 손을 합장하고 서 있다.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서구형 얼굴이다. 움푹 패인 커다란 두 눈 사이에는 붉은 빈디(bindi)가 붙어있다. 나이를 짐작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 힘든 연륜이 느껴진다. 나는 그녀의 빈디를 보면서 말했다.
“저는, 헌책을 팔러 왔습니다만…”
조금 당황했지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생각해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서점은 다른 헌책방보다 책값을 후하게 쳐주던 내 든든한 밥줄이었다.
현재 내 유일한 재산은 책이다. 나는 책을 읽는 것보다 단지 그걸 사서 모으는 데 관심이 있다. 어릴 적부터 종이로 된 모든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종이만으로 마땅히 내가 할 일은 찾지 못했다.
나는 헤밍웨이 같은 끈기와 모험심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스티븐 킹처럼 흥미롭게 쓰는 능력도 없다. 그냥 그것들이 쌓여있는 풍경에 만족하는 것뿐. 하지만 한순간에 이 모든 것에 진력이 났다.
어느 밤,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떨어질 뻔 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야 정확히 알았다. 어찌나 놀랐던지 운동신경이 바닥인 내가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황급히 창문을 열었더니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도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시 쾅! 하고 이전보다 더 큰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가파르게 쌓여있던 책 무덤이 도미노처럼 시차를 두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첫 번째 천둥은 내 머리맡에서 한 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일어났다. 그날따라 평소와 달리 왼쪽으로 눕고 싶었던 건 무슨 이유였을까.
가장 사랑하는 것에 살해 위협을 받다니.
그 날부터 책을 팔기 시작했다. 가장 애착이 없는 것부터. 아무리 죽을 뻔했어도 사랑하던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고서점은 내게 구원과도 같았다.
“책은 안 팔고 커리는 팔아요.”
경쾌한 인사와는 달리, 여자의 목소리는 낮은 저음이었다. 순간 깊은 동굴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이 든다.
뭘 파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굳이 그것까지.
이미 그녀의 영업방침에 걸려든 것은 아닐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 나는 ‘카레’든 ‘커리’든 좋아하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 않다. 그럼 다시 나가야겠지. 그러나 내가 들어온 저 문 앞에는 여자가 서 있다. 나는 얼떨결에 무대 위에 오른 관객처럼 난처해졌다.
“짐은 여기에 두세요.”
여자는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다음 동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