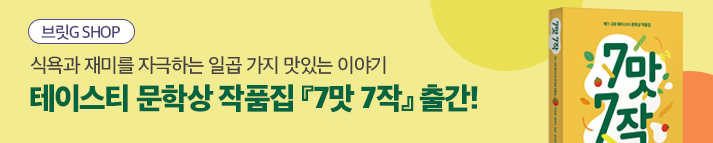후루루룩. 면발이 넘어가는 소리가 참 맛깔나다. 고작 라면 따위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천천히 삼켜.”
귀신 주제에.
“제삿밥이 라면이라니 서글프지도 않냐?”
알 게 뭐야, 라는 뜻일까? 녀석은 아랑곳 않고 젓가락에 걸려 있는 면발을 훅훅 분다. 서늘한 한기가 확 밀려온다.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지.”
꿀꺽. 꿀꺽. 국물까지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제 저 반합 씻는 것까지 다 제가 해야 합니다요.
“하아, 군생활도 서러운데 이제 귀신 수발까지 들어야 하다니.”
조그맣게 투덜거렸다. 들은 걸까? 녀석은 ‘화 풀어.’라고 말하듯 내 팔에 부비부비 볼을 비벼 댄다. 깨진 뒤통수에서 뇌수가 튀어나와 군복 소매를 찰싹찰싹 때린다. 그만 웃고 만다. 그래, 이 엿 같은 군 생활,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겠니?
라면을 좋아하는 이 귀신과 만난 건 처음 전입 왔을 때였다. 잔뜩 긴장한 채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두 명의 선임이 있었다. 한 명은 활동복 차림으로 세상 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반쯤 드러누워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군복 차림으로 창가 근처 그늘진 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활동복 선임이 방구를 한번 뿡 뀌더니만 갑자기 물었다.
“신병, 사회에서 뭐하다 왔어?”
“자영업 하다 왔습니다!”
순간 활동복 선임이 초롱초롱 눈빛을 빛내면서 일어섰다. 군복 선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우. 이건 유니크하네. 대학생이 아니야? 청년 사장님? 아이티, 벤처 뭐 이런 거 하다 온 거야?”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분식집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활동복 선임이 성을 냈다.
“새끼가 헷갈리게!”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싶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라면은 진짜 잘 끓이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등에 소름이 쫙 돋았다. 뭐지, 하는데 군복 선임이 바로 귓가까지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방금 전까지 맞은편 창가에 있었는데. 그 선임의 얼굴을 본 순간 오줌을 쌀 뻔했다. 깡마른 얼굴에 주근깨, 짝짝이 광대뼈는 평범하나 그 피부색이 너무 하얬다. 일부러 분을 칠한 것처럼 하얬다.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망울만 아니었다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군대서 이쁨 받으려면 존나 웃기든가, 존나 개념이 있든가, 아니면 존나 예쁜 누나가 있든가 이 셋 중 하나야. 라면 잘 끓이는 게 뭐 잘난 거라고 큰 소리로 ‘라면은 잘 끓이지 말입니다!’야? 킥.”
다음 순간 기겁을 했다. 활동복 선임이 비웃자 군복 선임이 그를 무섭게 노려봤던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간담이 오그라들 정도로 이글거리는 눈빛이었다. 저 선임은 편하게 활동복을 입고 있고, 이 선임은 군복에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는 걸 볼 때 누가 고참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저렇게 노려봐도 괜찮은 걸까? 그때 행정보급관이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충성.”
활동복 선임이 일어나 경례를 붙인다. 또 놀랐다. 군복 선임은 상급자가 들어오건 말건 본척만척했던 것이다.
“야! 뚱띠. 너 왜 또 대낮부터 누워 있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입니다…….”
“지랄하네. 야, 저건 뭐야. 신병이냐? 너 할 거 없으면 쟤 데리고 다니면서 미리미리 이것저것 숙지시켜!”
“아, 행보관님. 너무 하시지 말입…….”
또 놀랐다. 행보관이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던 것이다. 군복 선임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지?
“아이, 씨…… 피곤한데……. 얘 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야! 따라와!”
발을 직직 끄는 활동복 선임을 황급히 따라갔다. 군복 선임은 뒤에 남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등 뒤에 꽂히는 게 똑똑히 느껴졌다. 나, 뭐 실수한 거 아니겠지?
“뭐 궁금한 거 없냐?”
앞서 걷던 활동복 선임이 물었다.
“어…… 없지 말입니다!”
“아이, 씨…… 군대에서, 없으면 끝나냐? 없음 만들어, 인마!”
물론 궁금한 거야 잔뜩 있지만, 고참한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언제 전화할 수 있습니까? 남는 시간에 개인 공부 좀 해도 됩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질문들뿐이었다. 그러다가 간신히, 아니, ‘간신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조금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거니까.
“저, 아까 내무반에 계셨던 다른 선임…….”
‘분’을 붙여야 할까? 군복하고 활동복, 둘 중 누가 고참일까? 활동복 선임이 뚝 멈춰 섰다.
“저희 소대입니까?”
활동복 선임이 날 뚱하니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인마.”
아, 역시 다른 소대였던 걸까? 아니, 군복도 입고 있고 행보관까지 무시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병사가 아닐지도 모르지. 다른 부대의 간부?
“내무반에 누가 있었는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완전히 달랐다.
“어,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내무반에 너하고 나 둘밖에 없었는데.”
딱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평범한 군대 괴담이었을 뿐이다. 누구나 겪는 건 아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일도 아니었고, 전역한 후 여름밤 술자리의 안주거리로 삼기에 딱 좋은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전입 온 후 처음 경계를 서던 날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스산한 밤에 날벌레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걸 괴이하게 여기며 사수와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수와 경계를 마치고 무사히 복귀한 나는 그저 암구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근무표를 용케 외워 놨던 것을, 함께 근무한 사수가 연애한 이야기해 봐라, 노래해 봐라 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었다. 사수가 첫 근무하느라 수고했다며 라면이나 먹고 가자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대로 하루가 끝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도 아들내미, 첫 근무 아무 일 없이 마쳤네?”
사수는 딱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온, 군칭 ‘아버지’뻘 고참이라 나를 계속 ‘아들’이라고 불렀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아버님’이 컵라면을 잘못 끓이고 있는 것에 더 신경이 쓰였다.
“여기가 음기가 아주 강한 땅이래. 죽은 동물 같은 거 묻었다가 며칠 뒤에 꺼내 보잖아? 그럼 썩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근무 설 때 귀신 보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
‘아버지’ 선임은 가루 스프의 봉지를 찍 찢더니 사리 위에 대충 뿌렸다. 설마 저대로 끓는 물을 부으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뭐, 하긴 귀신이 대수겠냐. 아들. 너도 겪어 보면 알겠지만 이 부대에서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야. 뭔지 아냐? 아들?”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대답했다. 선임이 하도 엿같이 컵라면을 끓이길래 그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러면 스프가 표면에만 스며들어 국물의 맛이 제대로 배어 나오질 않는다. 컵라면 위에 스프를 뿌려 준 후에는, 너무 간단한 동작이라 의외로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만, 물을 붓기 전에 반드시 컵라면 통을 붙잡고 몇 번 흔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스프 가루가 컵라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면발에 풍미가 골고루 배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부대의 주적은 말이야, 너 지금 속으로 북한군 생각했지? 아들?”
지금 네 손의 그 컵라면을 확 뺏어서 직접 컵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좀 보여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야. 우리 사단장이지. 이 자식이 아아주 골 때리는 또라이인데 말이야…….”
스프 뿌리는 모습에서부터 짐작했는데 이 선임은 역시나 끓이는 것도 제대로 하질 못했다. 컵라면 뚜껑을 제대로 덮질 않아 열기가 빠져나왔다. 어이, 지금 새어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안 보여? 빨리 뚜껑 제대로 덮어! 어, 어, 벌써 먹으려고? 아직 3분도 안 됐다고! 이건 110그램짜리 신라면이잖아. 3분 48초를 익혀야 제 맛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장이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해. 알겠어? 어? 붇겠다. 어서 묵어라. 아들.”
붇긴 뭘 불어. 제대로 익지도 않았어.
“감사히 먹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한다. 그래, 어쩌랴. 여기는 군대인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체념하고 한 젓가락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나는 두 번째로 그 귀신을 보았다. 새벽 2시에, 형광등이 형형하게 빛나는 당직 사관실에서, 나 말고도 선임과 꾸벅꾸벅 조는 당직 사관 두 명이나 더 있는 상황에서 귀신이 나타났다. 그것은 천장에 붙어 있었다. 여전히 군복을 입은 채로 창백한 눈자위를 한 채 라면을 먹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왜, 맛이 없나? 아들? 잘 못 먹네?”
이때만큼은 라면 존나게 못 끓이는 선임이 고마웠다. 그의 말에 간신히 비명을 삼켰으니까.
“아, 아닙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저 귀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내가 바라보는 곳,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 있는 천장을 정면으로 한 번 쓱 훑어보더니 시큰둥하고 마뜩찮은 눈길로 고개를 돌려 버렸다.
“그럼 나는 이만 가서 잔다. 정리까지 깨끗하게 하고 와라. 제대로 안 치우면 저기 처자는 당직 사관 또 지랄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라는 말은 하지 못한다. 여기는 군대니까. 대한민국 남자들만의 공간이니까. 하지만 정말,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선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같이 좀 있어 달라고 싹싹 빌고 싶었다. 단둘이 되자 ‘그것’은 서서히 형광빛이 작열하는 천장으로부터 내려왔다. 무서워서 오줌을 쌀 것 같았다. 맞을 걸 각오하고 당직 사관을 깨울까. 맹세컨대 고3 때 오버워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때 이후, 아니, 입대 여행 때 지혜랑 잘까 말까 고민하던 때 이후 그렇게 간절했던 적은 또 없었지 싶다. 그러나 내 인생이 늘 그렇듯 우물쭈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게 되었고 그 귀신은 어느새 내 바로 앞에 내려와 섰다. 입고 있는 옷이 군복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안개인가 아니면 검댕인가 싶은 것이 잔뜩 묻어 있어 겨우 윤곽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하얗고 창백한 말상의 얼굴은 공포 영화에서 보던 귀신의 얼굴 그 자체였다.
‘호러 장르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고증을 잘했구나. 귀신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공포를 이겨 내려고 당시 필사적으로 되뇌던 생각이었다. 귀신은 그런 나를 앞에 두고 뭘 할 작정인지 입만 딱 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날 잡아먹으려 그러나 싶었는데 내 앞에 선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렇게 바보같이 입을 벌리고 계속 서 있으니 귀신이라기보다 좀비 같기도 하고. 벌린 입안이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비춰지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포심이 조금씩 희석되며 귀신의 얼굴에도 서서히 익숙해져 갔다. 그러자 귀신의 눈길이 나한테 꽂혀 있지 않다는 사실도 눈치챌 수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라면이었다. 바보처럼 멍하니 벌린 입, 도무지 떼질 못하는 눈초리. 밤에 야식을 먹을 때면 식탐 강한 남동생이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나와 식탁 모서리에서 날 바라보며 저런 표정을 짓곤 했다. 하지만 내 남동생은 인간 중학생이고, 저건 군복을 입은 귀신인데 설마.
“머…… 먹을래?”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묻고 말았다. 그리고 놀라고 말았다. 귀신의 헬멧이 상하로 열렬히 덜그럭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