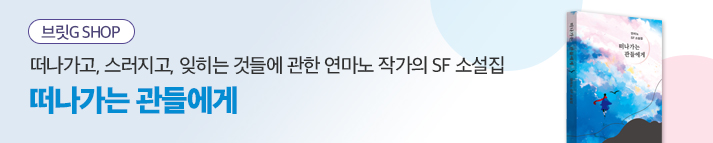나는 그때 동네의 공원 입구 표지판 한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 언제나 그랬지.
그리고 너는 이번에도 도로변에서 좌측 세 번째에 있는, 네가 다니는 컴퓨터 학원의 건물에서 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고 있어. 야간반이 끝날 시간이거든.
같은 건물 1층의 카페에서 검은 잠바를 입은 남학생이 아메리카노를 픽업해. 길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텅 빈 리어카를 끌면서 지나가지. 노인이 입은 새마을 운동 조끼 뒷면의 ‘새’자는 거의 지워져 있어서, ‘ㅅ’은 색이 바래있고 ‘ㅐ’는 이미 자취를 감췄어.
길 한쪽에는 고양이를 찾는다는 전단이 나뒹굴지. 사진 속 고양이는 아주 귀엽게 생겼어. 주황과 갈색과 검정색 털을 가졌고 꼬리는 구부러진 3살짜리 고양이. 한동안 동네에 계속 돌아다녔던 전단이야. 그걸 볼 때마다 매번 생각했지. 결국 저 고양이를 찾았을까?
나는 답을 알 수 없겠지만.
내 곁에는 졸리고 아련한 눈을 하고 있지만 꼬리만큼은 부러질 기세로 흔들어대는 땅콩이가 함께 있지. 나는 우선 네가 나오면 너를 향해 뛰어가려는 땅콩이의 리드 줄을 꽉 붙잡아. 곧 땅콩이가 그 작은 몸집과 어울리지 않는 중후하고 우렁찬 소리로 짖기 시작해. 너는 나를 보지.
네가 활짝 웃고 네 얼굴에 보조개가 생기는 과정을 나는 새삼스럽게 바라봐.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해 뛰기 전에 손을 들어 올려 멈춰 세우고, 어느새 헐거워지기 시작해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땅콩이의 리드 줄을 다시 꽉 조인 뒤 신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
횡단보도에 서서 잠깐 기다리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한 대가 갑작스럽게 내 앞을 질주해서 지나가. 기겁한 네가 뛰어오려는 것을 나는 또다시 제지하지. 땅콩이를 안아 올리며 입으로 ‘괜찮아’라는 모양을 만들면서.
너의 경악한 표정을 보고 기이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는 마침내 길을 다 건너와서 너를 길가의 웅덩이 쪽에서 조금 물러서게 하지.
몇 초 뒤에 갑작스레 전신주에서 전깃줄 하나가 떨어지며 웅덩이에 떨어져 스파크가 튀어.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땅콩이를 네 품에 안겨주고 너의 팔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걷기 시작해.
곧 건물 5층에서 화분이 떨어지면서 방금 우리가 서 있었던 자리를 꽝 소리와 함께 스쳐 가. 아주 간발의 차로, 아슬아슬하게. 우리에게 튀는 흙더미를 피하면서 나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스릴러 영화에서 반전을 밝혀낸 뒤 ‘정답이지?’하고 주인공이 짓는 종류의 미소 같은 거 말이야. 그 뒤에 우리를 향해 날아드는 닌자의 표창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면서 네가 그것을 못 보게 하지.
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내게 붙잡혀있어. 네 품에 안긴 땅콩이는 꼬리를 하도 세차게 흔들어서 네 팔에 부딪힌 꼬리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지.
나는 우리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 떨어지는 간판, 넘어지는 자판기를 지나서 급기야 아무것도 없는데 돌연 지진이 일어나 싱크홀이 생기는 공터와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을 피해 너를 끌고 가.
그리고 너는 어느 시점이 지나자 이 모든 일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태풍의 눈을 보듯 나를 보고 있어. 네 입이 몇 번 뻐끔거리더니 쥐어짠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이게 다 뭐야?”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고?”
“알아. 아. 배고프지. 저녁을 못 먹었을 테니까. 근데 일단은 아무것도 먹지 마. 뭘 먹건 급성 식중독이나 알레르기가 일어날 거야. 뭐라도 하나 마시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
“뭐?”
“일단 아직 걸을 길이 남아있으니까 걸으면서 얘기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답이 없어. 멈춰있으면 거기로 무언가가 돌진하거나 떨어질 테고, 쉬어가면 그 자리가 꺼지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도 몰라. 공터에 지진 나는 거 봤지? 탁 트인 공간에서조차 어떻게든 건수를 만든다니까. 차라리 움직이고 있으면 대응하기 편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물론 그럴 거야. 나는 이게 처음이 아니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 너에겐 늘 처음이지.”
“너 요즘 뭐 웹소설 신작이라도 읽어? 회귀물 같은 거?”
네 질문은 꽤 타당해. 근데 아니야. 이건 그런 재밌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웹소설은 주인공이 원하는 걸 얻으면서 끝나잖아. 나는 그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금 너를 붙들고서 걷기 시작하지. 옆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후드를 쓴 암살자를 따돌리면서 말이야.
나는 적어도 이 공간의 전체적인 짜임새나 흐름을 익힐 정도로 여기에 있어 봤어. 그 덕에 약간 버겁긴 해도 온갖 것들을 따돌리며 전진하는 데에는 도가 텄지.
발을 바삐 놀리느라 숨이 좀 차긴 했지만, 용케 암살자를 피하는데 성공해. 네 얼굴에는 슬슬 공포가 떠오르고 있어. 나는 너를 달래주고 싶어져.
“무서워하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라는 거야?”
“차분해지려고 노력해 봐.”
“그게 돼? 너는 안 무서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잖아.”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하기로 해.
“나는 죽었어. 그래서 무서운 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