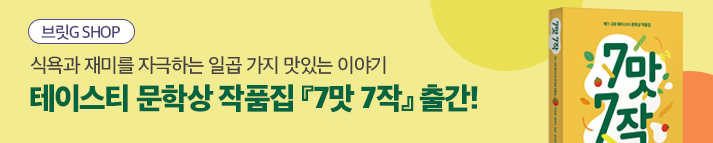쿨하게 주문하려 했다.
“늘먹던, 늘먹, 늘, 그것좀요!”
실패했다.
서문은 시뻘겋게 물든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손톱만한 국수집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구석에 놓인 배불뚝이 TV만 치직거린다. 지금이라도 뛰쳐나갈까, 서문이 속으로 고민하는 사이 국수집의 사장님이자 요리장이자 지배자인 만장이 부엌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누가 개소리 먹이러 왔냐?”
“하, 하하, 안녕하세요.”
“……나. 오늘 아직 안 마셨는데? 이게 누구야. 서문이 맞아?”
“서문이 맞아요.”
만장의 날카로운 눈은 5년 만에 만난 제자 앞에서 껍질 터진 거봉처럼 커졌다. 서문은 부엌 앞에 어깨를 펴고 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합니다, 다친 데도 없습니다, 말짱하게 잘 있었습니다……. 그걸 떨지 않고 하나하나 말할 자신이 없었다. 대신 두 팔 벌려 스스로를 내보였다.
“만장은 건강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살 좀 찌라니까.”
“고기나 한 번 사 주고 말해! 막걸리 한 병도 없냐? 빈손이야?”
“억, 죄송합니다!”
서문의 얼굴이 다시 붉게 물들었다. 얼굴 비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서 선물 생각을 전혀 못 했다. 이래갖고는 금의환향은커녕 돈 떨어진 반항아가 한 푼 달라고 온 모양새 아닌가. 서문은 지금에라도 나갔다 올까 생각했지만 부엌에서 나온 만장에게 붙잡혔다.
주름진 손이 서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머리 언제 깎았냐.”
“오늘요.”
“어째 좀 봐줄만 하더라니. 여자 만나러 가?”
“만장 보러 왔잖아요.”
“염병. 언제부터 면상을 그렇게 챙겼다구.”
염병이라는 말도 오래간만이다. 하지만 발음이 예전같지 않다. 만장이 늙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그릇같은 곡선으로 웃는 입은 발음을 죄다 흘려보낸다.
서문은 직감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쿨한 척 주문하며 들어오는 건 실패했지만, 아직 만장이 웃고 있고 가게에 아무도 없으며 분위기도 제법 부드러운 지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만장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다. 시커먼 장화가 다시 주방의 시퍼런 타일을 밟았다. 도주, 5년간의 방황, 그리고 거기 수반되었을 모든 사건과 감정에 대해 사과하려던 서문은 어정쩡하게 서서 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만장이 말했다.
“앉아. ‘늘 먹던 거’ 줄게.”
“……네, 만장.”
만장의 국수집 메뉴판은 심플하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다. 아마 2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국수’ 하나. 아침에 후딱 준비하는 칼국수 면, 대파, 시판 다시로 만드는 국물, 시간이 남을 때 만드는 계란 지단이 구성품의 전부다.
중국집처럼 벽의 1/3을 차지한 배식구 너머로, 서문은 눈을 감고도 만장의 손놀림을 떠올릴 수 있었다. 면 익히는 데 4분, 국물 붓고 파 얹어서 내놓는 데까지 1분, 기분 따라 계란 지단 썰어서 얹어주는 데 1분. 손님이 그릇을 받아 들고 침 한번 삼키고 젓가락을 들었을 때쯤엔 김이 가라앉았을 만큼 국통 보온기능도 시원찮아, 성질 급한 사람들은 홀랑 마셔버리는 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의자 없는 손톱만한 가게에서 손님들이 국수만 후루룩 먹고 빠져나가는 모습은 꼭 쥐고 흔드는 이쑤시개통같은 경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자가 생겼다.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빨간 색 의자들이 예전과 다름 없는 가게의 유일한 눈엣가시였다.
“만장. 의자는 왜 깔았어요?”
“단골 노인네들이 이제 다리 아프대서.”
“이 가게에 단골도 있어요?”
노선 끄트머리긴 해도 나름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가게고, 주 고객들은 의자 없는 식당에 불만을 토할 시간조차 모자라게 바쁜 사람들이었다. 서문이 피식 웃자 바로 주방에서 젖은 멸치가 날아와 서문의 콧잔등을 때렸다.
“아옥!”
“입으로 똥싸러 왔냐? 다 쌌으면 닦아줘?”
“……아. 만장. 요새 국물 내는데 멸치도 쓰나봐요. 장족의 발전 아냐?”
“요샌 재료 있으면 달란 대로 만들어준다. 보탤 거 있으면 말해.”
“오? 뭐뭐 돼요?”
“오늘은 돼지 삶은 거, 중하랑, 계란 장조림 있고, 유부도 있고.”
“나 없다고 만장 아주 신났구만? 예전에는 냉장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만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만 쉐프라고 불러봐.”
“아, 진짜 TV 드럽게 좋아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아무거나 만들어주는 것도 드라마 보고 배웠지?”
“어떻게 알았어?”
“만장 생각하는 거야 뻔하잖아요. 쉐프도 뭔 놈의 쉐프. 만장도 좀 노력해서 그 뭐냐, 맛집 소개 프로그램같은 데 나가면 쉐프라고 불러줄게.”
“사람이 가끔은 자극을 받아야 잘 사는 거야. 안 어울리는 짓도 해 보고, 나한테 좀 버겁다 싶은 호칭도 받아 보고.”
만장은 구석에 매달린 앞치마를 두르고는 서문이 처음 보는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가 하도 커서 꼭 뉘집 대문을 여는 것 같다. 만장은 냉장고를 뒤지며 말했다.
“그래도 서문아. 너는 너무 멀리 갔더라.”
흰 비닐로 둘둘 감아 놓은 덩어리가 떨어졌다. 만장은 짜증을 내며 그걸 안쪽에 쑤셔 넣었다.
모로 누운 사람 발모가지가 뱅글 돌아 냉장고 안으로 들어간다.
날 잡고 정리 좀 해야 쓰겠어, 정리……. 그렇게 중얼거리던 만장은 한참 뒤에야 검은 비닐봉지를 찾아서 서문 앞에 의기야양하게 내려놓았다. 냉동육이 되긴 했지만 고기팩 라벨에는 1+등급 한우라고 적혀 있었다.
거의 모든 재료가 나왔다. 가스불 위에서는 칼국수 면을 삶는 중이고, 소면도 탁자에 올라왔다. 국물은 항상 국통에 담아놓고 데워 파는 것과 비싼 돈 주고 샀다는 다시. 원한다면 추가해준다는 것들이 돼지고기 육편, 유부, 삶은 계란, 계란 지단에 얼어붙은 소고기까지.
서문의 코앞에 들이밀어진 재료들에서 냉기가 올라온다.
“너무너무 멀리 갔었지.”
자신을 떠난 제자를 향해, 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안 먹은 밥 다 처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