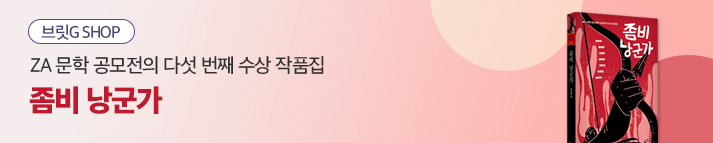이튿날 해가 뜨기 무섭게 행렬은 서쪽 숲 가장자리에서 첫 걸음을 뗐다. 이날을 맞이해 한껏 치장한 그들은 용왕님의 사자(使者)들이었다. 신의 뜻을 받들어 둔덕을 넘고 포구를 지나 마을로 입성할 것이었다.
새벽나절의 안개가 걷혀 날씨는 몹시 쾌청했다. 가파른 언덕에 올라 발돋움하면 아스라하니 먼 수평선 너머로 육지 끝자락이라도 보일 성 싶은 날이었다. 손에는 꽹과리며 징을 들고 어깨에는 북이며 장구를 걸친 채로 아낙들은 구성지게 목청을 뽑으며 어깨춤을 췄다.
“물렀거나, 용왕님께서 우리를 인도할지니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새각시에게 이를 것이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각시 후보인 아홉 명의 소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치성을 드렸다. 아궁이에 불을 때고 가마에 물을 데워 머리를 감고 몸을 정결히 했다.
이 순간 각자의 거처에서 가르마가 내려다보이도록 다소곳하게 고개를 수그리고 있을 그 소녀들의 복색은 같았다.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 소녀들의 어머니가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지은 새 옷이었다.
창호지가 흘려보낸 빛 속에서 진홍이 기름을 발라 보드라워진 손등으로 꿰맨 데 하나 없이 반지르르한 비단 치마의 결을 만끽했다. 그러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턱을 괴고서 달이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늠해보았다. 그 애 역시 인두로 다려 반듯한 동정의 감촉을 느끼면서 눈썹을 내리깔고 있겠지? 한편으로는 가슴 속에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을 품은 채로 무율과 자신의 혼례를 그리고 있을지 몰랐다.
진홍은 달이가 자신에게 고마워하리라고 믿었다. 먼 훗날 진실을 알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비록 생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안긴다고 할지언정.
장구와 징, 북과 꽹과리 소리가 경쟁하다시피 서로를 윽박질렀다. 아낙들은 이미 당산나무를 비껴 들어온 후였다. 보윤 역시 그 무리에 섞여 난장을 벌이고 있을 것이었다. 팔을 젓고 입을 벙긋거리며 눈 밑을 그늘지게 만든 근심을 떨치기 위해 애쓰고 있으리라.
아낙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르르 방앗간을 지났다. 푸줏간 앞마당에서는 한참동안 법석을 떨며 힘겨루기를 했다. 가옥들 사이에 있는 텃밭을 가로지를 때에는 꿈결에 떠올릴까 무서운 욕설을 지껄이는가 하면 안 그래도 넘어가기 직전이던 목책을 기어이 분질러놓기까지 했다.
부락민들은 그들의 행각을 훔쳐보며 연신 낄낄거렸다. 오라비의 품에 안겨 돌담 위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던 꼬마가 신나게 손뼉을 쳤다.
마을 전체를 들썩이던 함성과 웃음소리가 진홍이 들어앉은 집 앞을 지나 조금씩 멀어졌다. 방문 근처에서 바깥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둘째가 철없이 까불거렸다.
“에이, 누나가 아니었나보네.”
얼결에 그 얘기를 뱉어놓고 녀석은 진홍에게 이마라도 한 대 쥐어박힐까 겁먹은 눈치였다. 하지만 진홍은 그 경망스러운 놈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얌전히 정좌해 있을 뿐이었다.
문종이에 난 구멍으로 밖을 염탐하던 셋째가 거친 숨을 시근덕거리며 엉덩이를 뒤로 끌었다.
“오, 오고 있어, 여,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오고 있다고.”
문짝이 부서질 듯 난폭하게 밀려 나가더니 곧 아낙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화이는 평소보다 곱절은 거대하고 당당해 보였다.
“들어라, 용왕님의 목소리를 빌어 명하나니….”
진홍이 턱을 당겨 입가에 떠오른 미소를 감추었다.
“…너, 진홍을 각시로 간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