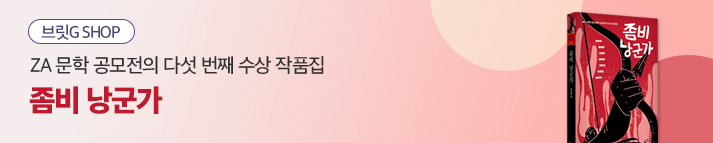<제발 조금만 천천히>는 장르 소설 독자에겐 익숙할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자고 일어났더니 낯설게 변해버린 풍경에 ‘내가 이상해졌나’ 의심하는 주인공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내 주인공은 바뀐 존재는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엘리베이터도, 다른 기계들도, 그리고 거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도 보이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주인공 ‘채하’는 세상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속인’과 ‘완인’이라는 세칭으로 분류된 것이지요. 마치 한 언어를 쓰던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언어를 쓰는 군집을 형성하며 분열되었다는 성경 속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채하가 대표하는 ‘완인’은 한 마디로 삶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입니다. ‘속인’은 당연히 그 반대고요. 어제까지 서로를 보고 만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못합니다. 같은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기묘한 일인 것이지요. 이것은 장르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다른 세계를 갖게 된 속인과 완인이 행하는 몸짓을 소설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며, 작가는 자신들을 상대적 약자로 인식하게 된 완인과 속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그려냅니다.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끝에 결말 부분에 이르러 전개가 반전되며 하나의 재밌는 단어가 독자의 머리에 콕 박혀요. 바로 ‘좀비’입니다. 소설 속 완인들은 끝내 ‘좀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속인들의 공격에 저항하다 결국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 자신들과 같은 완인으로 만들게 되면서 말입니다. 작가는 갈등 상황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이 과정에 ‘구원’이라는 개념의 해석문제를 끼워 넣습니다. 둘로 나뉜 혼란한 세상에서 혹자들은 완인이 속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 말하고 이 논리는 폭력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채하를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의 생각은 다르죠. 그리고 채하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를 구하는 등 정치적으로 정당한 행동을 주로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야기는 얼핏 채하의 관점에 동의하는 흐름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마지막에 이르면, 정말 속인을 완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의이고 구원일까 조용히 묻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인지 자신이 변한 것인지 고민하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요. 이런 질문은 특히 근래 한국의 좀비물들이 클리셰를 비틀 때 종종 보여주던 역설과 결을 같이 합니다.
소설 <제발 조금만 천천히>는 오래된 질문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과 저는 아마도 넓은 우주 속 지구라는 행성의 같은 대륙, 같은 국가에서 같은 활자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저는 같은 마음으로 이 글자들을 읽어낼까요? 함께 손을 잡고, 잠을 자고, 말을 나누고 몸까지 하나가 된 상대와도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면 바벨탑을 쌓다 말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다투다 뿔뿔이 흩어져버린 사람들처럼,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 채하처럼 다소 막막해집니다. 소설 속 속인과 완인의 갈등도 어쩌면 그 막막함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내 잔인한 방식을 써 상대를 자신의 세계로 편입시켜야만 살아남을 만큼요.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그럴 때 문학을 찾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눔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글자로 목소리로 수어로, 수많은 언어로 소통을 위해 애써보아도 끝내 나와 당신은 다르니까요. 같은 문화권에 있든, 같은 청인이나 농인이든, 혹은 또다른 특질을 공유하든 우리는 결국 다른 언어를 쓰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같은 세계에 존재하려고, 그 기묘하고 신비한 일을 해내려고 끝없이 시도하는 거겠지요. 남이 아닌 내 목을 물어뜯는 것처럼 힘겨울 때조차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은 채로 서로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비록 잔상이더라도요. 그토록 애달픈 몸짓을 지속할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제엔, 우리가 같은 세계에서 같은 언어를 썼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나 서로가 그립고 소중하여 포기하지 못하는 건 아닐지, 상상해봅니다.
<제발 조금만 천천히>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음식처럼, 누군가 싫어할 재료는 빠진 짬뽕라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갈등을 맞아도 주인공들은 정당함을 잃지 않고, 소설이 다루는 주제도 그렇습니다. 동화 <모모> 속 시간 도둑들을 연상케 하는 재치있고 귀여운 지점도, 섬뜩한 sf의 숨결이 느껴지는 지점도, 오메르타 작가 특유의 발랄한 속도감이 주는 경쾌함과 클리셰 비틀기도 물론 있고요. 심각하고도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마음에 담으며 감상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