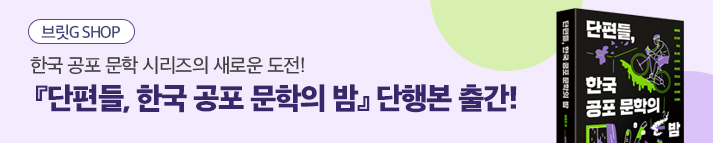성식은 애인인 윤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남을 계획하며 지방으로 향했지만 정작 그녀가 그를 바람맞힌다. 욕설을 퍼부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막차라 텅텅 빈 고속버스에서 일부러 그의 옆자리에 앉는 남자가 있다. 불편해하며 짜증을 내는 성식에게, 어딘지 수상쩍은 가방을 들고 탄 그 남자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가 있다.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연적인 상대방 여자를 죽이라는 의뢰를 했다, 그런데 만약 살인자가 자신의 목표를 살해하러 갔는데 그 대상이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상대방을 죽이라 새로운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성식과 아내와 애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은 남자는 자신이 바로 그 살인자이며, 둘 중 누구를 죽였는지 맞추면 성식을 살려 주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죽인 시체가 자기가 들고 탄 가방에 들어 있다는 말과 함께. 자, 이제 게임 시작이다.
소설 속에서 살인자라는 동반자가 불러오는 공포감은 익숙한 ‘고속버스’라는 공간을 낯설게 변모시킨다. 작품을 읽는 내내 어두운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고속버스 위, 창백하고 겁에 질린 남자와 눈을 번뜩이는 살인자의 실루엣이 까만 유리창에 비치는 상상을 했다. 남자가 입을 찢으며 웃으면 살짝 송곳니가 보일 것도 같았다. 그 동안 수도 없이 고속버스를 타면서, 단 한 번도 옆자리에 앉은 낯선 이의 정체를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둔감한 편집자로서는 놀라운 상상의 순간이었다.(더불어 ‘그러게, 좀 비싸도 우등 타고 1인석을 끊었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익숙한 공간의 끔찍한 무언가로의 변질, 여기에 우리가 공포 문학에 매혹되는 지점이 있다. 스티븐 킹이 호러 문화에 대해 쓴 논픽션 『죽음의 무도』에서 우리가 호러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가 허구의 공포 속으로 피신한 덕분에 현실의 공포를 피하고, 허구의 공포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의 세계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효과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확히 이런 문장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이런 의미였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이런, 스티븐 킹 씨에게 항의해야겠다. 나는 「고속버스」를 읽은 뒤 고속버스에서 만나는 타인의 익명성에 대해서 난생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으니 말이다. 현실의 고속버스가 처음으로 좀 무서워졌다. 이 작품은 분명히 매우 영리한 공포 소설이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사실 살인마와 불편한 여정을 함께해야 하는 주인공은 돈 때문에 아내와 결혼했고 육체만을 노리고 애인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남자다. 하여 성식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밀실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게임이라는 방식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스릴감이 고조되는 사이에도, 주인공에게 그다지 동정이 가질 않는 바람에 내심 권선징악적 결말이 기대되기도 했다. 한편 굳이 따지자면 이 극에 출몰하는 주요 인물들은 제각각 죄를 짓고 있는 셈이라서, 딱히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애인과 성식은 불륜, 남자는 살인, 다만 아내는 조금 모호하긴 하다.) 또한 13일의 금요일이나 “안녕 시드니” 류의 공포 영화에서 흔히 보이듯 희생자의 도덕성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아마 작품을 다 읽고 나면 나처럼 느끼는 분들이 제법 있을 법한데, 결론적으로 버스에서 주인공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남자가 제일 불쌍하다. 도대체 무슨 죄야, 하고 작가님을 탈탈탈 흔들고 싶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