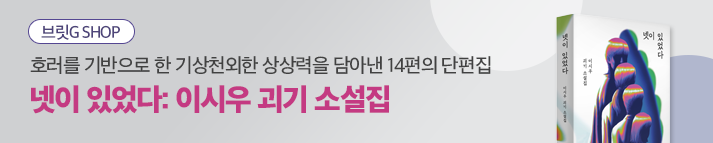18
박 노인과의 근무는 세일의 우려보다 더 숨막히고 고되었다.
이 노인과의 근무때처럼 찌라시를 읽고 농담을 하는 분위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박 노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다.
박 노인과의 8시간에 대면 이 노인과의 8시간은 재미난 놀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며칠 간은 화장실을 핑계 삼아 잠시 자리를 비우고 1,20분씩 바람을 쐬고 오곤 했지만 박 노인이 그걸 언제까지 묵인해 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뭣보다 아직 나는 수습 기간이라 했잖아? 그깟 지루함 못 참아서 이렇게 좋은 조건의 직장 짤리면 그거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겠지.’
문제는 ‘그깟 지루함’의 정도였다.
‘미친 척하고 책이나 들고 와 볼까? 의외로 영감님이 시원시원하시니 허락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세일은 이 노인의 충고 (귓방망이가…)가 떠올랐다.
‘물어나 보자. 물어 보는 게 뭐 대단한 죄도 아니잖아?’
세일이 박 노인의 눈치를 보며 막 입을 떼려는 순간 박 노인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김씨가 와서 시설물 보수 할걸세.”
세일은 이 노인이 말했던 게 떠올랐다.
“아.. 그럼 제가…. 저희가 뭘 해야 하나요?”
“우리가 관여할 일 아니니 평소대로 근무하면 돼.”
잠시라도 다른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세일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밤 8시가 넘어가자 출입문이 열리며 모자를 눌러쓴 작은 체구의 남자가 인사도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왔는가.”
평소처럼 잠깐의 시선만을 던지며 박 노인이 인사를 건넸다. 작은 체구의 남자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출입문 반대쪽의 철문을 열고 지하로 사라졌다.
두꺼운 철문에 가로막혀서 인지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몇 분 또는 몇십분이 지나갔다.
김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건물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세일은 감히 질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참 후 지하실의 철문이 열리더니 김씨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며 나오더니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