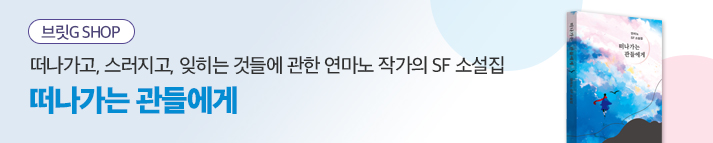“다친 곳은 어때요?”
정원은 들고 있던 홍삼 팩을 쪽 들이켜며 물었다.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진 가두리 근처에서 서큘레이터가 툭툭 걸리는 소리를 내며 돌았다. 센터 창밖에선 올가을 들어 가장 센 바람을 동반한다던 태풍의 전조가 으르렁댔다.
인어는 보호막으로 뒤덮인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고개를 돌려 수면 밑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정원은 실망하지 않았다. 냉대는 이미 일상이었다.
센터의 부지는 일부가 바다와 맞닿게 설계되었다. 덕분에 해양종이 들어가는 가두리는 뒤쪽의 수로만 열면 바로 근방 연안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고. 바다에서 온 동물들의 환경을 최대한 맞춰주고 치료나 관찰이 끝나면 빠르게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 그런 구조 덕에 매일 가두리와 외부 수로의 연결부가 느슨하진 않은지, 제어 상태는 괜찮은지 체크해줘야 했다.
정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인어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인어에게 배정된 가두리는 좁은 공간이 아니었으나 인어가 들어가 있을 땐 썩 넓어 보이지도 않았다. 실제 인어의 행동반경을 생각하면 더 그랬다. 인어는 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근거지 중심으로 어림잡아 30㎢ 안팎의 지역을 영역 삼는 동물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센터에 있는 어떤 가두리라도 좁을 것이다.
우르릉. 다시금 대기가 울었다.
그 해에 멸종위기 생태종 보호 및 복원 센터의 생태 5동에서 여름휴가를 가지 않은 것은 정원뿐이었다. 그건 정원이 다른 이들의 휴가 동안 해양 보호종의 관리를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정원은 출근해서 제게 할당된 연구동을 돌며 이곳 위기 생태종 보호 및 관찰 센터에 있는 생물들의 안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퇴근할 때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했다.
오늘 퇴근의 마지막 순서가 이 인어였다. 작년 겨울 초입에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된 인어는 그물망에 지느러미가 크게 상해 여기 들어왔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경과를 봐야만 했다.
“예전처럼 헤엄칠 수 있겠어요?”
정원의 질문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질문에도 인어가 대답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누군가가 그걸 아쉬워하며 인어의 목소리는 아름답다던데. 라고 말했을 때 생태 2동의 시현 선배가 그런 말을 했다.
“너희는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 물고기가 노래하는 건? 애초에 인어와 대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해?”
그럴싸했다. 세이렌이니 하피니 하는 것들의 노래는 어쨌든 고대인의 낭만을 덧입힌 신화에 불과했다.
진짜 인어는 어떻게 우는지,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무슨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당장 종마다 생김새와 지능 발달 체계도 천차만별인 와중에 말이다.
인어가 고등사고체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인어가 인간과 교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원래 인(人)자가 붙으면, 조금이라도 인간을 닮았다면, 실제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인어는 인간보다는 고래의 형상을 조금 더 닮아 있었다. 인어(人魚)라고 할 게 아니라 ‘고래 경’을 써서 경인(鯨人)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인어도 마찬가지였다.
머리와 상반신은 그래도 인간을 닮은 구석이 있긴 했다. 그러나 유선형으로 완곡하게 이어지는 하반신과 팔이 달려 있어야 할 곳에 달린 긴 날개 지느러미, 신체를 뒤덮은 거칠고 단단한 피부는 고래의 것을 닮아있었다. 얼핏 멀리서 보면 그 윤곽이 작은 돌고래나 상어처럼 보였다.
“그냥 물고기 종류라고 생각해야 해. 자꾸 사람 보듯 감정 이입을 하면 대상을 바라볼 때 편견이 덧입혀져. 감정이 섞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건 위험해.”
시현 선배의 말이 다시금 맴돌았다. 그래도 무심결에 말을 거는 행위를 멈출 수는 없었다. 몇 개월간 생긴 일종의 습관이었다.
“상처를 보게 해주진 않겠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인어가 눈을 내리깔았다. 저건 안 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알았느냐면, 인어가 여기 들어온 뒤로 수많은 유혈 사태와 긴급 상황을 보내면서 체득했다.
그렇게 정원은 이 인어의 이빨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날카롭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자신의 왼팔 살점을 바쳐 센터 선배들과 위기 생태종 연구 학계에 매우 기쁜 발견을 안겨주었고.
그건 이 인어가 이 종의 마지막 개체라는 사실이었다. 이빨이 이중으로 된 먹빛 지느러미의 인어. 한반도에서도 제주도에 분포하는 고유종인 먹물비단인어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30여 년 전 마지막으로 포획된 뒤 멸종된 것으로 확정되었던 종.
처음엔 아무도 그 인어가 먹물비단인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인어는 2m에 가까운 몸길이에 먹빛 지느러미와 검은자위로 뒤덮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먹물비단인어와 서식지 일부를 공유하는 묵주인어의 대표적 특징이어서 모두가 이 인어는 묵주인어라고 암묵적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었다.
애초 인어라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인어목의 생물 자체가 희귀종에 속하는지라 전문가의 수도 적은 편이었기에 다들 인어는 개체 전체의 평균값으로, 표상적으로만 알았던 탓이다.
다만 묵주인어는 주로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연안 바다에서 그물에 다쳐 올라오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이것이 새로 밝혀지는 묵주인어의 습성이 될 수 있기에 그 주에 전문가를 초빙해 생태와 습성을 조사하고 치료한 뒤 먼바다에 다시 방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었다.
그러고 나서 밝혀진 사실이 이거였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종의 부활. 코끼리땃쥐나 뉴기니 야생 개의 부활처럼. 다만 이 경우엔 앞의 두 건보다는 훨씬 이목이 쏠렸다.
그도 그럴 게 인어였다. 다른 동물들보다 더 신비로운 이야기로 느껴지는.
여기저기서 흥분한 사람들이 몰려왔다. 센터는 한동안 시끄러웠다가 휴가철이 되어서야 조금 잠잠해졌다. 정원은 인어의 상처를 살피는 걸 포기하고 그날 인어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오늘 차트에 진정제 투여 이력은 남아 있지 않았다. 최근 인어에게 투여되는 대부분의 화학적 요소들은 서서히 배제되고 있었으므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인어가 진정제 없이도 이렇게 얌전하다는 게 이상하다면 이상할 일이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
인어가 자신을 공격했을지언정 아프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물론 인어를 볼 때면 종종 물어뜯긴 팔이 욱신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덕에 먹물비단인어도 다 찾고. 효녀다 효녀. 처음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을 땐 정말로 위로가 되었다.
지금은 글쎄. 인어를 바라볼 때면 차라리 그런 일이 없어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먹물비단인어라는 걸 몰랐더라면. 그랬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