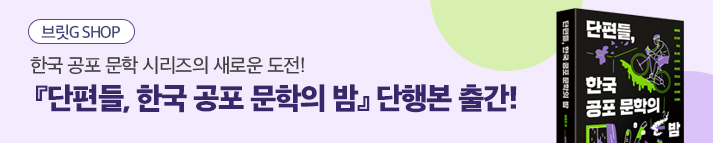여름이 다가오는 저녁 어스름에 물든 놀이터에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산자락 아래에 터를 잡은 아파트단지 중에서도 제법 명당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산모기만 아니라면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삼삼오오 모여 아줌마들의 수다판이 벌어지기 좋을 법도 했지만 달랑 두 개뿐인 가로등이 쫒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짙은 어둠 덕에 밤이 되면 으슥해져 아주 가끔 어린 연인들이 어른들 몰래 입이나 맞추는 데에 쓰이곤 했다.
“엄마, 뭐해?”
조막만한 손을 내 손 안으로 쏙 집어넣으며 성욱이가 물었다.
“응? 아냐. 얼른 들어가서 저녁 먹자.”
한 손에 들린 묵직한 쇼핑 비닐을 고쳐 잡으며 성욱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디선가 휘익 하고 바람이라도 불어오는 듯, 나는 휑한 목덜미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현관문을 여니 한숨부터 나왔다. 아이가 던져 놓은 유치원 가방이며 장난감들이 사방에 널려있었다. 아이피 티브이에서 해주는 유아용 영어만화를 틀어주고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다. 썰고 볶고 끓이는 동안 성욱이는 넋을 놓고 티브이를 보며 영어 노래를 흥얼거렸다.
“엄마 민재는 지금 추울까?”
된장국의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 뚜껑을 열다가 멈칫했다.
“글쎄…….”
뭐라고 대꾸해 주어야 할 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금으로 국간을 마저 맞추었다. 왠지 입안이 깔깔했다.
“어딘가에서 따듯하게 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성욱아. 그리고 너도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되고 모르는 사람이 따라 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성욱이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바닥에 너부러진 로봇 장난감을 하나 집어 들고 놀고 있었다.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나니 여덟 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아이는 밥상을 앞에 두고 밥알을 세고 있었다.
“왜 또 밥 안 먹고 그러고 있어?”
“엄마, 쏘세지 먹고 싶어.”
“…….오늘은 안 사왔어. 내일 해줄게. 그냥 계란 후라이랑 먹어.”
성욱이는 어릴 때부터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해 또래 아이보다 왜소했다. 밥상 앞에서 실갱이를 할 때마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 한참을 어르고 구슬려 겨우 서너 숟가락을 더 먹였을 뿐 밥공기의 밥은 반이나 남았다.
“엄마, 밖에 지금 추워?”
식탁에서 일어나며 아이가 물었다.
“아직은 밤 되면 추워. 잘 때 이불 차내면 감기 걸려.”
아이가 남긴 밥을 먹느라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성욱이는 디보 인형의 손을 잡고 질질 끌면서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민재도 지금 추울까?”
방금 입에 넣은 찬 밥덩이가 목에 콱 메였다. 민재는 일주일 전에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나간 후에 사라졌다. 그 민재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아이가 바로 성욱이였기 때문에 이삼일은 경찰서와 민재네 집에 불려 다녀야했다. 오늘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로는 요즘 부쩍 다른 때와 달리 구석에서 혼자 노는 모습이 걱정된다 하였다. 행여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던 터에 자꾸만 민재의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의 모습이 불안했다.
“그럼… 민재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디보를 집어 던졌다. 나는 아이를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조용히 팔다리가 엇갈려 바닥에 누워있는 인형을 잡아 툭툭 털어 소파 위에 얌전히 앉혔다.
“우리 성욱이가 기도하면 민재가 더 빨리 집으로 올 거야. 오늘 자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 하고 자자.”
아이는 묵묵부답으로 티브이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전화 벨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귀를 울렸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는 의례적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성욱이 좀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