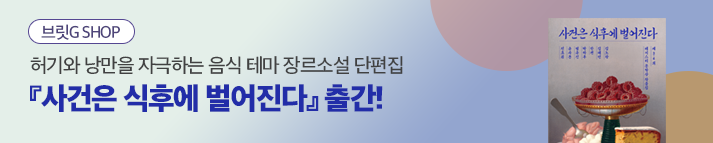“뭐라고?”
내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는 굳이 방금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이 커피가 식기 전에 돌아올게.”
나는 황당해서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지? 삼국지 패러디인가? 하지만 그는 삼국지는 하나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게 일어날 타이밍인줄 안 모양이었다.
“그럼.”
“야, 야! 잠깐만!”
난 허둥지둥 손을 뻗어 그의 티셔츠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매정하게 내 손을 뿌리친다. 난 맨바닥에 엉덩이를 찧고 말았다.
“야!”
“만일 그때가 돼도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맘이 영원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다신 찾지 말아줘. 난 머리 식힐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자취방을 떠나 버렸다. 나는 멍하니 그가 떠나간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무릎으로 기어가 문을 닫았다.
“야이 개새끼야! 문 좀 닫고 다니랬지!”
그는 내 방을 드나들면서 낡아서 삐걱대는 저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가곤 했다.
나는 상으로 돌아와 책상다리로 앉고서 나 스스로 느낄 정도로 거친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이라고는 카톡 포함해서 이게 전부다. 그는 여느 때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고 피곤에 절어 누워 있는 내가 혼자서 이것저것 떠드는 동안 가지고 온 케이크를 세팅하고 커피를 내린 그는 대뜸 “헤어질까 해.”라고 말했고 내가 또 이것저것 따지자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나가버린 것이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전혀 없었다. 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는 타입이었고 적어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언쟁 한번 하지 않았다. 그가 이러는 이유를 나로선 눈꼽만큼도 짐작할 수 없었다.
딱 하나 억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라고는 얼마 전에 우연히 데이트할 때 전 남자친구와 마주쳤다는 것 정도? 하지만 전남친과 난 “잘 지내냐.” 따위의 통상적인 인사말 외에는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우린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우린 과 씨씨였으니 어색함의 진정성을 굳이 증명해줄 필요는 없다 생각했다. 그 녀석과 난 핸드폰 잠금 패턴도 공유하는 사이였으니 미심쩍으면 몰래 뒤져봐서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커피가 식기 전이라고? 커피가 식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내 방의 온도는 25도. 커피는, 재보진 않았지만 나름 수준급 커피 알바생인 그 녀석이 만들었으니 90도 언저리일 것이다. 커피잔은 예열했을 테니 커피와 같다고 봐야 하고. 이제 커피의 질량을 열역학 공식에 대입하면……
음,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검색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단다. 그 사이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맘이 바뀐 거라고?
장난하냐고. 내가 납득할 거 같아? 이딴 황당한 이별. 나는 내 몫의 커피를 벌컥 들이켰다. 속이 뜨거웠지만 들끓는 심장만큼은 아니었다. 괜히 오기가 생긴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찬장을 뒤져 안 쓰던 커피메이커를 꺼냈다. 그 녀석이 이런 거로는 커피 향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는 바람에 사용 6개월 만에 퇴역해버린 불운의 기구였다. 물을 끓여 깔데기를 통해 유리로 된 병에 붓고 가열판이 온도를 유지해주는 방식의 기본적 커피메이커다.
그래, 커피가 식기 전에 돌아온다고? 그러면 내가 그 기한을 무한정 늘려주지. 언제든 돌아오라 이거야. 그때가 되어도 커피는 식지 않을 테니. 나는 유리통을 치우고 전원을 연결하고 보온 버튼을 누른 뒤 그의 몫으로 마련되었던 커피잔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 정도로는 뭔가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 적당한 크기의 유리그릇을 찾아 따뜻한 물을 붓고 그 안에 커피잔을 담아 가열대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식어가는 내 커피를 마저 원샷하고 기다렸다.
올 테면 와보라지. 기가 질리도록 한소리 해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