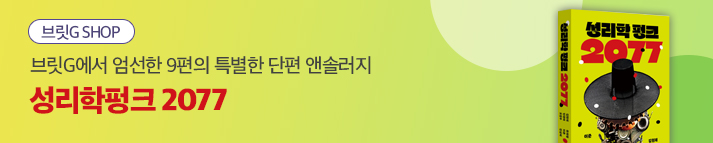1
늦은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면 언제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기분이 스물스물 올라오곤 했다. 정적 속에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내 의식과 나를 둘러싼 공기의 경계가 모호하게 풀어지는 것만 같은.
그날은 더 그랬다. 어쩌면 누구라도 그 모호함에 균열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홀린 듯 발을 멈춘 것은.
*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좋아하느냐 묻는다면, 뭐라 말하기 어려웠다. 오래되고 작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선, 기울어진 구릉 지대 사이로 난 골목길이었다. 올라가는 길 좌측 건물들을 보면 보통 창문이 땅에 붙은 지층이 잘 보였다. 우측으로 눈을 돌리면 두 계단을 올라 바로 일층으로 들어설 수 있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아마도 내가 볼 수 없는 반대편에는 지층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밤의 골목길을 노란 가로등이 느른히 물들일 즈음에는 지층이고 일층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제법 득시글거렸다. 아주 핫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후줄근하지도 않은 식당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이었다. 아마도 여행자들에게는 가성비 좋은 현지 식당이기는 하지만 맛은 평이하고 주변에 딱히 볼 것이 없으니 굳이 찾아가지는 않게 될, 딱 그런 정도의 식당들이었다.
그 틈 어딘가에 이름만 편의점인 구멍가게가 있었다. 서울에서처럼 화사한 네온 간판과 냉장식품 진열대 같은 것은 없지만 복권은 팔았다. 그 밖에도 이런저런 가게들이 있었다. 오래된 우표 가게. 수제화 가게. 이런저런 잡다한 물건들을 팔지만 도대체 뭐가 주종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게. 누구 작품인지 모를 그림들을 걸어 놓고 파는 갤러리. 세탁소. 빵집.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가게들에는 관심이 없다. 보통은 이곳에 뭔가를 먹으러 오고, 먹으면서 뭔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는 사라진다. 밤새워 술을 마시고 떠들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밤이 깊으면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골목길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거주자들의 공간으로 변한다.
끔찍할 정도로 고요하고, 낡았다.
역사와 문화 빼고도 워낙 자랑할 것이 많은 나라에 유학한답시고 왔다가 눌러앉은 지가 벌써 몇 해, 나는 줄곧 여기 살았다. 딱히 관광지도 아닌 곳이 역사 지구로 지정된 탓에 오래된 건물들을 쉽사리 뜯어고칠 수 없게 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여행자가 보기에는 눈이 혹할 만한 구석이 있어 그럴듯한지 몰라도, 건물 주인들은 골치가 아파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주인의 사정일 뿐이다. 어쨌거나 사람이 없는 동네는 아니었으니 건물을 세내어 장사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는 가게 주인들이야 그럭저럭 싼 가게세와 특유의 정취에 만족할 것이다. 점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야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바쁘다는 것 외에는 별생각이 없을 터.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곳에서 밤을 보내지는 않는다.
이 골목의 밤과 새벽이 어떤지는, 나 같은 세입자들만이 안다. 골목의 건물 어딘가에 세 들어 살며 덥고 습한 여름의 낮과 춥고 건조한 겨울의 밤을 꼬박꼬박 겪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애증의 장소다. 여름은 덥다. 벽을 뚫을 수 없으므로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 에어컨은 설치 불가인지라 여름이면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나무 창틀에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는 창문형 에어컨을 낑낑거리며 올려놓아 설치해야 한다. 가을이 되면 에어컨을 떼어놓는다. 겨울이 되면 그 나무 창틀에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을 무언가로 틀어막는다. 이 골목의 사계절의 밤을 고스란히 겪어내다 보면 역사 지구라는 이름이 전처럼 낭만적이거나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다. 집세가 싸기 때문에 좋을 뿐이다.
그런 것으로 불평할 일이냐고, 누군가는 한 마디 할지도 모른다. 하기야 어찌 보면 배부른 소리다. 외국물 먹고 공부를 했다. 여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산다. 에어컨도 있고, 내키는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창문 있는 방도 있다. 오래되고 삐걱거리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어엿한 도심지 이층의 집이다.
그래도 나는, 이곳이 좋은지 어떤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종종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타국 생활이 지겨웠고, 익숙해졌다 해도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들리지 않는 타국의 말이 지겨웠다. 관광객도 적지 않고 TV며 유튜브며 넘쳐나는 글로벌 컨텐츠에서 아시아 사람을 이제 볼 만큼 봤을 텐데도 여전히 내가 지나가면 흘긋거리는 타국의 인간들도 지겨웠다. 하지만 지나치게 길어진 타향살이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디플롬을 받고 어설프게 눌러앉은 것이 패착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럭저럭 전공을 살려 직업을 잡기는 했어도 사실 근근이 먹고 사는 데 지나지 않았다. 몇 해째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것만 보아도 알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정말로 가고 싶으냐며 누가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다. 한국에는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 돌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지금 돌아가 봐야 한국에서 그다지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는 이력 약간이 더해진, 학위 받고 귀국한 나이 많은 유학생일 뿐이다.
그래서 그날도.
나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기분으로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드물게도 나는 조금 취해 있었다. 곧 귀국한다는 후배 원영이 찾아왔길래, 그 골목의 끄트머리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고 헤어진 뒤였다. 번화가로 나오라고 불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집 근처까지 찾아온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시 머리를 스치기는 했다. 하지만 집으로 선뜻 불러들일 마음은 들지 않아서 밖에서 보자고 했다.
맥주가 몇 잔 들어가고 나서 원영은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다가 말했다.
– 선배는, 안 돌아갈 거야?
나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아마도 피식 웃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을 것이다. 새삼 한국에는 왜. 가서 할 것도 없고. 여기가 좋지. 원영은 영 건성인 내 말을 묵묵히 주의 깊게 들었다. 이어진 말은 당혹스러웠다.
나랑, 같이 들어갈래?
아마 그런 말이었을 것이다. 술기운 때문인가, 정확히 그 말의 어떤 지점에서 당혹스러워야 할지 좀 혼돈스러웠다. 나랑? 들어갈래? 나는 한참 멍하게 있었다. 당황스러움을 취기로 위장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한참만에 나는 물었다.
– 왜?
원영이 뭔가를 말했고, 나는 듣지 않은 척했다.
그곳을 나오면서, 내 집이 코 앞인 걸 알고 있던 원영은 조금 멈칫거렸다. 나는 잘 가라고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 말은 실상 거절임을, 원영도 나도 알았다. 나는 거절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원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간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고 등을 돌려 걸어갔다.
나는 큰길가로 멀어지는 원영의 뒷모습을 보다가 골목 안쪽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훅, 취기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원영과는 이전에 입을 맞춘 적이 있었다. 실수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2
– 이것 좀 사 갈 텐가?
인적 없는 골목에서 좌판을 펼치고 앉아 있던 노파가 물었다.
나는 길에서 파는 과일은 잘 사지 않는다. 며칠을 놓고 팔았는지 모를 선도 떨어지는 과일을 싸지도 않게 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전에 없이 취한 탓인지, 아니면 뭐에 홀렸는지, 나는 반들반들한 윤기가 흐르는 사과 세 알을 집어 들었다. 노파가 값을 말했고, 나는 순순히 과일값을 치렀다.
– 자네가 오늘 첫 손님이야.
– 운이 나쁜 날이었나 보네요. 자리를 옮기기라도 하시지.
왜 이 밤까지 여기 그러고 계셨는데요. 내 말에,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 오, 아니야. 달이 뜬 뒤에 나왔는걸. 나오자마자 이리 자네를 만났으니 운이 나쁜 날은 아니지.
그러면서 노파는 사과를 넣은 봉투에 무언가를 부스럭거리며 집어넣었다.
– 뭘 주세요?
– 맛이나 보시게.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눈을 트이게 해 주지. 맘에 들면 씨앗을 싹틔워보는 것도 좋고.
– 씨앗을요?
대관절 무엇을 주었길래? 노파에게 받아든 봉투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고 단단해 보이는 무언가가 사과 틈에 섞여 있었다. 이게 무어냐고 물으려고 고개를 든 나는 흠칫했다.
노파는 사라지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