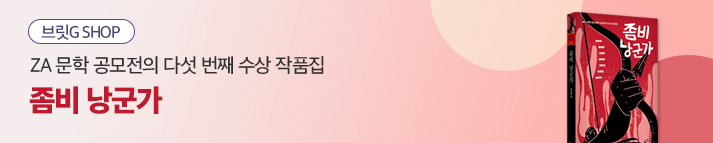감염병 정도로 세상의 종말을 운운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의 호들갑이다. 밥상이 오만 번 차려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온 기홍은 요즈음 식사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겪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감염자가 1만 명 아니고 3만 명이면 대수야? 다들 셋씩만 낳으면 그 인구쯤 만회하는 것은 금방이야. 건물이 무너졌어, 입을 옷이 없어, 약이 없어?”
건물도 그대로고 입을 옷도 그대로지만 장을 보는 일은 조금 불편해 졌다. 정부는 최근 퍼지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 ‘경계’ 단계를 선포하였는데, 감염병이 전국적인 전파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살았다고도, 죽었다고도 말하지 못할 것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다니며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다니는데도 선제대응은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국가의 기반을 흔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조였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이 서울을 빠져나갔고 상점들은 스스로 문을 닫았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그렇게나 어울리는 시기였다. 그쯤 대통령은 언론에 모습을 보이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감염병 초기에는 야당 인사들과 시위대가 광화문 일대에 모여 범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고 그것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게다가 시위 도중 감염자가 나타나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시위는 구심점을 잃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시위대는 점점 게릴라 조직이 되어갔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눈앞에 닥친 변화는 복잡하고도 미묘해 평범한 대부분은 그저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많았다. 1950년, 아버지에게 안긴 채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것을 목격한 기홍에게도 특별할 것은 없었다. 그날 이후 전쟁의 폐허가 30년 만에 눈부시게 복구되는 것을 지켜본 기홍이다. 겨우 일부 몇 사람 미쳐 날뛰는 전염병 정도는 1, 2년 안에 완벽하게 해결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경찰이 모자라면 군인들이, 우리 군인들이 모자라면, 미국군이, 유엔군이 우리를 구해 줄 것이다. 보배 역시 이 말에 동의했다. 불행하게도 부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된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전염병의 출현을 예수 탄생에 비견하는 일로 정의 내린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 바이러스는 인류를 좀 먹어갔다. 감염, 전염, 감염, 전염, 또다시 감염……. 폭탄이 터지는 일과는 조금 달랐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지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 연호(年號) AZ 1년(After Za)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봤자 기홍과 보배에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 그들은 어차피 사는 만큼만 살고 죽기 전까지의 일만 알게 되니까. 바이러스 따위가 아니라도 20년도 채 더 살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보배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 세끼의 소명을 지켜내는 일이다.
아직 인류에게는 시간이 남아있다. 여전히 보배에게 끼니를 꾸려나갈 나날들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기에 삼시 세끼는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
내일은 동짓날. 보배는 쇼핑 목록에 팥을 올렸다. 장을 보러 갈 때는 걸어서 30분 내 거리에 있는 시장으로만 갔다. 구입하는 식료품은 배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배낭에 넣고도 편하게 뛸 수 있을 무게까지 가능했다. 22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502동을 빠져나왔다. 지천명에 운동을 시작한 이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이 미치도록 지루했다. 요가로 시작해서, 필라테스로, 헬스로, 복싱으로, 킥복싱으로, 주짓수로 보배는 체력을 단련해 왔다. 직접 고르고 골라 선택한 운동들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요가원이었던 곳이 유행에 따라 종목을 바꾸고 주인도 바뀌었지만 보배는 그대로 그곳을 성실히 다녔을 뿐이었다. 어떤 관장이 오던 그녀는 가장 말 잘 듣는 수강생이었다. 관장이 하루에 200개씩 크런치를 하고 10개씩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하면 그녀는 1.5배 더해 300개씩, 15개씩을 해야 남들만큼 한다고 생각했다. 끝나고 발차기 연습을 10분하고 가라고 하면 15분씩 하고 가곤 했다. 그러던 보배는 언젠가부터 부엌에서 오래 일을 해도 허리도, 다리도 아프지 않았다. 22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1층을 내려와도 발바닥에 느껴지는 탄성이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주짓수로 바뀐, 한때 요가원이었던 곳에서 수련을 했다.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꽤 넓은 스튜디오였다. 그러다 관장이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야겠다면서 휴관을 하더니 문 여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단지 안에서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관리비에 걸맞게 어딘가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감염병 주의를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단지 내에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화단 앞 통화나 담배를 피우는 일, 그리고 배달 음식을 자제해 달라는 방송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보배는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 혹시 도장이 문을 열었나 싶어 상가를 기웃댔다. 요 며칠 개미 새끼 한 마리보이지 않더니 오늘은 10대 세 명이 주차장에서 낄낄 거리고 있다. 이제 막 초등학생 티를 벗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해 보였다. 요즘은 어른들도 한자리에 머무는 일이 드물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 보배는 걸으면서 아이들을 훑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작은 망치같이 생긴 것을 꺼내더니 주차되어 있던 BMW 운전석 유리창을 톡톡 쳤다. 옆에 있던 아이가 망치가 닿았던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니 창호지가 뚫리듯 손이 차 안으로 쓱 들어갔다. 망치를 들고 있던 아이가 보배와 눈이 마주쳤다.
“눈 깔어, 할머니. 망치로 찍어버리기 전에”
보배는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다.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너 말이야 너. 꺼지라고. 확 그냥 뚝배기 깨버릴까.”
“야, 안돼, 씨발 하지마. 우동사리 나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어느새 아이들은 보배보다 차 안에서 꺼낸 가죽 가방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보배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이.
“뭐야, 화장품밖에 없네. 씨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줄어들었다. 주차장을 완전히 벗어나고 나서야 보배는 몸이 떨리면서 분한 생각이 들었다. 보배는 마트로 걸어가며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 서너 번 다시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감염되지 않았으니 저런 싹수 노란 놈들도 건강하다고 해야겠지? 세상은 이미 망했어. 장이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내일은 동짓날이니 팥은 있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길로 접어들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스눕독&위즈칼리파의 ‘영 앤 와일드 앤 프리’가 흘러나왔다.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야
Living young and wild and free
젊고 거칠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거 말이야
왕복 8차로에서 차들이 드문드문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거리를 걷는 사람은 더 드물었다. 꼭 추석 당일 서울의 아침을 보는 것 같았다.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침 뉴스는 보도했다.
매서운 바람이 보배의 얼굴을 때렸다. 음악은 어느새 린킨 파크의 ‘블리드 잇 아웃’으로 넘어갔다. 그때 흰색 제네시스 SUV 한 대가 갈 지(之)자 모양으로 텅 빈 도로를 누볐다. 제네시스는 1차로에서 2차로를 넘어오더니 그대로 속도를 올려 3, 4차로를 건너 우회전을 하듯 보배에게 달려들었다. 보배는 상황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대로 서서 바라보는 것밖에는. 제네시스는 인도를 넘어 길가 파리바게뜨의 전면 유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유리 파편 하나가 날아와 보배의 뺨에 스쳤다. 차는 절반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를 찌그러뜨리고 멈춰 섰다. 운전석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걸어 나왔다.
“괜찮으세요? 걷지 마세요! 제가 지금 119를…”
보배가 핸드폰을 꺼내는 동안 운전자는 뒤를 돌아 보배를 바라보았다. 동공이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징그러운 것이 눈구멍을 메우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 밑으로 있어야 할 팔이 없어 몸통은 왼쪽으로 기울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보배에게 다가왔다.
“어머나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