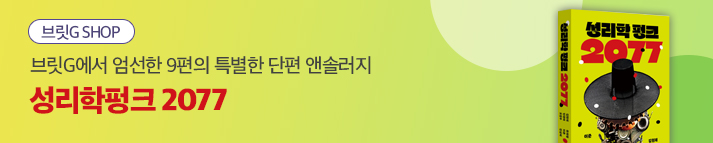검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정확히는 검으로 적을 타파하고 강산을 피로 물들이던 시대가 숨을 거뒀다.
십대 고수와 아홉 문파와 열두 방파간의 오랜 싸움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백년의 숙적이 서로 화해를 하고 영원한 적수가 당파를 넘어 손을 잡았다.
천하는 태평성대라는 꿀 항아리에 몸을 담그고, 강호는 유혈의 옷을 벗어버렸다.
그런 시대라, 나는 협탐이 되었다.
협탐(侠探)은 협을 찾는 사람, 즉 탐정이다.
기묘한 일의 진상을 밝혀내고, 억울한 일을 순리대로 풀어내며, 혼란스러운 일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꽤 큰 도성의 유흥가 뒷골목이 나의 점포로, ‘협탐’이라는 글자가 적힌 때 묻은 깃발 하나를 꽂아놓고 종일 손님을 기다린다.
벌이는 그리 좋지 못하다.
다소는 시절 탓이었다. 요새는 기묘한 일도 억울한 일도 혼란스러운 일도 흔치 않다.
하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다.
나이 들고 못생긴데다 내담자를 홀릴 만한 신묘한 지혜나 하다못해 싹싹한 접객 솜씨도 없으니 잘될 리 만무하다. 그게 이유의 전부도 아니다.
이런 사정이라 나는 일을 가릴 형편이 못 됐다. 그러니 그 일이 내게로 온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다.
*
“아줌마가 협탐인가요?”
한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입성은 나쁘지 않았고, 머리도 곱게 땋아 비단 댕기를 드리웠다. 좀 사는 집 애다.
“그래. 맞다.”
귀찮은 표정을 숨기지도 않고 대답했다. 몇 달째 손님은 없고, 딱 이런 꼬맹이들이 찾아와서 짓궂은 질문이나 하는 게 다였다.
“협탐도 무림인이죠? 아줌마도 무림인이에요?”
“아녀영웅전의 십삼매, 자객 섭은낭, 월녀검 이야기도 못 들어봤니? 원래 여자도 무술한다.”
“헤에, 그래도 아줌마는 너무 늙었는데.”
이게 확. 에효 참자.
한 대 쥐어박으려고 팔을 들어올리다 도로 내렸다. 솔직히 말하자면 배가 고파서 어린애 쫓을 힘도 없었다.
“아직 마흔 살밖에 안 먹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다. 됐지? 다 물어봤으면 가라.”
하지만 소녀의 용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협탐은 무슨 일을 해요?”
이번에야말로 내쫓으려다가 한 번 더 참기로 했다. 혹시 이 꼬맹이가 어른들한테 말이라도 잘해주면 일거리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돈만 주면 뭐든 한다.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주고, 사람도 찾아주고.”
“사람을 대신 해쳐주기도 하나요?”
소녀가 벽에 기대어둔 내 검을 힐끔 보며 물었다. 이 아이를 내쫓으려면 겁을 좀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부러 씩 웃으면서 검집을 툭툭 두드렸다.
“원래 그게 주업이지.”
소녀는 움찔했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당돌한 녀석.
“내가 사람 죽일 일이 있으면 좀 더 젊고 힘 잘 쓸 것 같은 자객을 고용할 거예요. 아줌마는 싸움을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자객 찾아 가든가.”
“무공으로 치면 저기 무당파 도사님들이 훨씬 뛰어날걸요. 그분들은 신선처럼 수행이 깊어서 더러운 일은 절대 안 한다니까 사람을 죽여주진 않겠지만.”
“아, 그러세요.”
나는 팔짱을 끼고 더러운 골목의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저 꼬맹이랑 입씨름을 하느니 낮잠이라도 자는 게 배가 덜 고플 것 같았다.
“근데 시간은 아줌마가 더 많을 것 같네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말인데, 아줌마한테 맡겨야겠어요.”
짤랑. 동전 소리가 들렸다. 내 눈이 저절로 번쩍 뜨였다. 소녀, 아니 손님께서 작은 염낭을 흔들며 말했다.
“내 고양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