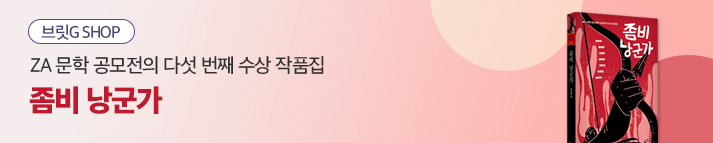모든 것이 시작된 혹은 모든 것이 끝장난 첫날, 김채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줄 알았다. 다행히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썩 다행이라 여길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날 아침 채하는 지독한 숙취에 눈까풀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에 겨워서 한쪽씩 차례로 눈을 떠야 할 정도였다. 두어 번 끔벅거린 뒤에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형체와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났다. 남자친구와 싸우고 과음을 한 탓이 아니라도 매사에 느리다는 핀잔을 자주 듣는 편이었다.
상체를 일으켜 침대 위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빤스 바람이다. 원룸 현관에서 침대까지 이동 경로를 따라 컨버스 운동화, 데님 셔츠, 블랙 진, 흰 면티, 줄무늬 양말이 띄엄띄엄 이어져 있었다. 브라는 반대편 벽 쪽으로 힘껏 집어 던진 모양이다. 집에 들어온 것도 옷을 벗은 것도 기억엔 없지만, 밖에서 벗은 것만 아니면 됐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냉장고엔 물도 탄산음료도 마실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헐렁한 검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며 복도로 나섰다. 그런 상태로 편의점에 가는 것은, 지나고 생각해 보면 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당시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