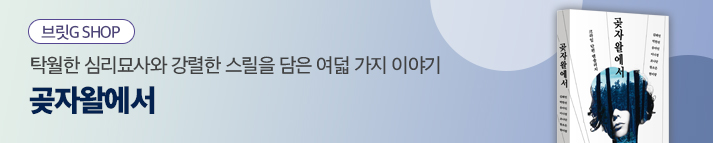어제 밤 EBS 세계의 명화로 <미스 리틀 선샤인>을 봤다. 각기 너무 개성이 다른 가족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다. 밥을 먹기 위해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도 서로 합이 맞지 않아 어긋나기 일쑤고,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않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린 딸아이 ‘올리브’만이 그나마 이 가족을 조금이나마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올리브가 먼 곳에 있는 ‘미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가족들이 차를 가지고 떠나는 영화였다.
먹는 것 하나도 다른 이 구성원이 과연 한 차를 타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시작도 끝도, 이야기도 다르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가족 구성원의 이질감이 현이랑 작가의 <독>에서 보여진다. 아이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정신없이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어른들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며 불협화음을 낸다.
항상 어른들의 대화는 첫째 삼촌의 불평으로 시작해 둘째 고모의 핀잔, 이어지는 그들의 싸움을 넷째인 우리 아빠가 말리고 셋째 삼촌이 어릴적 가난해서 설움을 당한 일화로 이어져 막내 고모의 침묵, 수녀님의 훈화말씀으로 끝나곤 했다. 그리고 아침엔 늘 새벽까지 술을 마신 고모와 삼촌들이 거실에 뻗어있었다.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해댔다.
이 글의 시작은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수면 위에 돌을 하나 던진 것 같았다. 할아버지 장례식에 모인 친척들이 함께 어울려 밥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나 독 안에 누군가의 머리가 보이면서 이야기는 ‘독’이 되어 점점 퍼져 나간다. 누가 사람을 죽이고 독 안에 사람을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가운데 이야기의 공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온다.
그들에게는 은밀하게 처리해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이곳 저곳 이야기들이 새어간 상태였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아래 잘 덮어두었던 공명의 시간들이 독에 들어있는 시체로 하여금 성큼성큼 다가왔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래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가족이 아닌 소리에 ‘나’는 어릴 때 부터 느끼고 있었다. 가까울 때는 덮을 수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송곳처럼 찔러오는 비수 같은 말들이 서로를 향해 몇 십번씩 찔러 대었다.
셀 수 없도록 빗방울이 내리는 날, 경찰은 오지 않고 가족들은 해묵은 시간을 헤집으며 자신들이 가졌던 독을 마음껏 풀어댄다. 독에서 찾은 것은 한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어쩌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은 아니었을까.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각자의 목소리로 외쳐댄 그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잦아들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패배자였지만 그것을 수용한 가족임을 인정하며 이야기는 끝이난다.
영화는 비로소 멈추어지지 않은 차에탑승해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다다랐지만 ‘독’은 더 깊은 틈 사이로 메우지 못한 상태로 와창창 부서져 버린다. 더 이상 독에 담지 못한 상태의 부서짐으로 이야기는 끝이난다. 완전하게 이야기를 묶기 보다는 열어놓은 상태의 이야기로 끝이난 것이 더 좋았던 작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