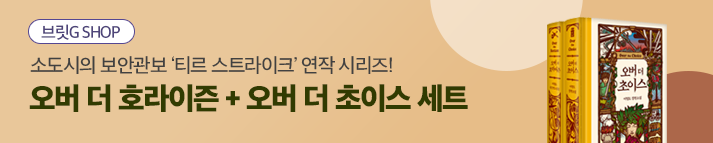‘10년을 기다렸다.’
흔한 문장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할지는 모르겠지만(사람마다 다를 터이니) 적어도 문학에서는 흔한 문장이다. 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자를 통한 접촉인 만큼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기 어렵기에 그 무게감을 실감하기 어려운 문장이기도 하다. 그래서랄까, 실제 시간으로 기다려야 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은 무언가를 기억에서 덜어내거나 혹은 기대감을 접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가을이면 떠오르는 작가와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단감으로 대신한 나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 감이라도 맛있으면 되었지 뭐. 그러던 어느 날, 감나무가 왕이 되어 돌아왔다.
오버 더 시리즈는 읽으면서 내심 시리즈화 되기를 바라던 작품이었다. 물론 이미 3편이 나와 있었지만 ‘취이익’하지 않는 보안관과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보안관 조수, 그리고 이 소박한 소도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작품은 이 오버 더 시리즈의 새로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저 ‘소박한’에 강세를 두었던 사람이 첫 장을 읽고 받은 충격은 아마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브릿G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이들’, ‘환경 파괴가 불러온 재앙’,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등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를 판타지 소설에 밀도 있게 담아낸 역작』이라고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한다. 사실 소박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버 더 시리즈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소박하지 만은 않다. 물론 무거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는, 작가의 기존 작에서 보였던 개념을 뒤집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 ‘오버 더 호라이즌’에서부터 작가의 기존 다른 장편에서 보였던 ‘죄’에 대한 니체스러운 관점과는 다르게 그것과 충돌하는 보편적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호라이즌이 할슈타일 후작이나 세리스마 같은 인물과 비슷한 ‘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호라이즌의 행동이 어떤 의미에선 피를 마시는 새가 말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비해 작가는 1인칭 주인공인 티르 스트라이크를 통해 죄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을 충돌시킨다. 그리고 이 작품은 1인칭이기에 이 일반적 관점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오버 더 초이스는 ‘서니 포인도트’라는 6세 소녀의 죽음에서 출발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죽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작가의 과거 장편에서 나왔던 죽음에 대한 유명한 대사를 두 가지 정도 언급해보자면 먼저는 할슈타일 후작의 ‘멸망은 완성의 귀결’이라는 것과 라이언 갑판장의 ‘죽음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기본적으로 둘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죽음 말 그대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죽음에 대해 의연할 수 있을까. 어떤 가수는 ‘사라져 가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사라질 뿐’이라고 노래하지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나는 이 소설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으로 이 덴워드와 지데의 견해 충돌이라고 본다. 물론, 이 둘은 칼잡이와 예술가라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가 견해 차이를 만든 것이긴 하다. 또한 한 쪽은 인류의 발전을 기술 측면에서 다른 쪽은 정신의 측면에서 살펴 본 것이기도 하고. 익숙한 대립 아닌가? 과거 드래곤 라자에서도 나타난 바 있던 칼잡이와 마법사의 세상을 보는 관점 차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물론 라자에서도 이 대목을 매우 유의 깊게 본 바 있다.
사실 오버 더 시리즈를 이끄는 두 주인공은 오크와 인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다. 후자가 신앙심이 돈독하지 않으며 전자는 유신론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만큼은 둘 다 적극적인 무신론자, 유신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상을 보는 둘의 관점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무신론자와 일반적인 유신론자를 대변하기도 한다. 기존 오버 더 시리즈의 단편에서도 조금씩 나타났던 둘의 관점 차이는 이번 장편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물론 작품 주제나 흐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이 관점의 충돌도 이영도 작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라자에서 세상을 보는 마법사와 칼잡이의 관점 차이,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신앙을 해석하는 추기경과 신부의 차이, 어느 실험실의 풍경 키메라 편에서 여성을 보는 남자와 여자의 시각 차이, 오버 더 호라이즌에서 ‘도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피를 마시는 새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종족의 차이 등등. 찬찬히 살펴보면 단순한 등장인물의 차이가 아니라 각 등장인물이 해당 관점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더 재밌는 부분이다. 또한 작가는 어느 한 쪽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충분한 양측의 견해를 보인 뒤 판단은 독자에게 넘기는 훌륭한 방식을 택한다.
이 작품에는 기존 작품에 대한 향수적 장치가 더러 있다. 앞서 말한 관점 차이나, 죽음 혹은 죄를 보는 기존과 상반된 시각 뿐 아니라 이영도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규정이 있다. 어느 실험실의 풍경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규정하는 것은 너’이다. 드래곤 라자라는 장대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밌는 점은 오버 더 초이스에서는 이 마저도 기존의 관점과는 다소 다른 관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 언급하면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지만 작품 말미에 이르러서 이영도 단편 중에 ‘행복의 근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외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영도의 팬이라면 익숙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관점이나 기존의 관점으로 한 두 차례 씩 언급된다.
결말에 이르러서는 다분히 오버 더 시리즈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영도 작가 답게 독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내가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독자가 직접 써 내려가면 되는 것이니까. 작가는 늘 그렇듯, 본인이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두 들려주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마무리는 독자의 몫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 이름 없는 식물의 돌연변이 후손은 매년 가을이면 주황색으로 잘 익은 과실을 맺는, 영어로는 ‘persimmon tree’라고 불리는 그것이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