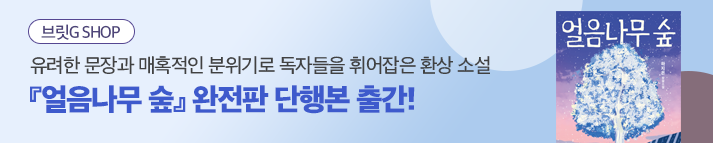연재되고 있는 작품에 대한 리뷰를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모른다는 사실에 의한 조심스러움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직은 부족한 분량에 의지해 확실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유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얼음나무 숲>은 그런 이유로 쓰기 어렵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계속되는 새로운 즐거움에 대한 표현의 부족 때문이랄까!?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그 순간순간이 모두 살아 숨 쉰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읽은 24회까지 그 어느 하나도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진다. 읽으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낡은 표현일까!? 그래도 사실이니까 뭐…. 사실 작품을 읽으면서 술술 읽혀내려 간다는 자체가 문체가 어떻고, 만들어낸 배경이 어떻고, 캐릭터가 어떻다는 생각 따위를 하지 않게 만든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훌륭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가볍다거나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칠 내용이라는 말은 결코 아님은 확실히 해야겠다.
고요와 바옐과 트리스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보통의 우리네 이야기 같으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은 그들의 삶은 우리와는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묘하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런 모습 속에 공감, 감동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훌륭함에 키세의 종말을 담은 예언이라든가, 얼음나무 숲이라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그리고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살인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거대한 숲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대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전에 그 결말이 벌써 아쉬워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내가 이 작품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전면 개정된 새로운 모습, 완전체의 모습으로 얼른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매력적인 모습의 작품을 야금야금 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까 말이다.
음악을 글로 읽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살면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다. 그런데 그 낯선 질문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대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말하자면, 음악을 글로, 글을 음악으로,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단지 지금까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얼음나무 숲>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문학이든 음악이든 모든 예술은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독자들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가 이미 그 깊숙한 곳으로 이끌렸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