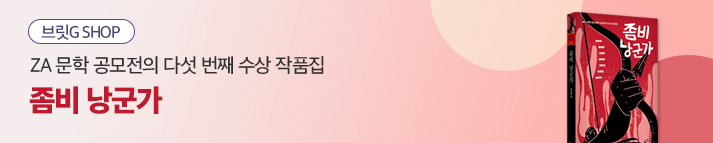냉장고 밖에선 사나운 들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미 주방까지 점령해 온 저 ‘들개’들은 인간의 성대를 가지고도 짐승소리밖에 낼 줄 몰랐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 못 해본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들숨과 날숨을 쉴 때마다 온갖 후회가 들어찼다 다시 빠져나갔다. 다진 마늘만 그득한 이 업소용 냉장고 대신 생수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숨었더라면. 저 인간 들개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미리 산으로 도망쳤더라면. 아니, 애초에 화촌이라는 불길한 이름을 가진 이 휴게소를 그냥 지나쳐 갔더라면.
화촌(火村)
이 어이없는 일의 시작은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감 상으로는 몇 달이나 지난 것 같지만. 7월 둘째 주 토요일. 입사 후 3년간 쓰지 못했던 연차를 몰아서 만든 첫 휴가 날이었다. 갓 배달 온 치킨군과 축구 결승을 볼 저녁 계획이 있었는데 입사 6개월 후배인 빌어먹을 장대리의 전화가 망쳐버렸다.
“구대리님, 화가산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보는데 무슨 구조물이 나왔다는데요?”
“구조물?”
“네 구조물이요.”
“구조물이 뭔데 대체?”
“뭐랄까 길다란 것이 가늘기도 하고. 아 몰라요. 작업반장이 낮에 가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래요 아무래도 가보셔야겠어요.”
장대리가 보내온 사진에는 엉뚱하게 생긴 물체가 찍혀 있었다. 무너져 내린 산비탈 토사 위로 20센티 가량 삐죽 솟아난 십여 개의 얇고 뾰족한 기둥들이었다. 못 보던 식물이라고 하기에는 이파리나 분지가 없이 곧기만 했고, 이전 작업팀이 박았다가 덮은 철근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달랐다. 혹시 유물일까. 그럼 골치 아픈 일이다. 문화재청 놈들이 조사한다고 몇 달이나 잡아먹을 것이 뻔했다. 보상 한 푼 없이 손가락 빨며 기다리는 상황이 온다면 발주처가 사장을 쪼아댈 테고 사장은 직원들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밤에 몰래 가서 죄다 뽑아버리는 편이 나았다.
이 작은 토목회사에 그런 궂은일을 할 사람은 나 밖에 없었다. 빌어먹을 장대리는 이런 일을 빠릿하게 처리하기엔 나태하고 입이 싼데다가 결정적으로는 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을 한 번만 더 응시해볼걸. 식상한 후회를 하며 오후 8시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인 화가산까지 가는 길은 무려 11개의 터널을 주파해야 하는 200킬로미터의 직선코스였다. 졸음운전을 피하라고 만든 터널의 기묘한 조명들과 음향장치는 밤에 마주치니 섬뜩하게만 느껴졌다. 터널을 9개쯤 지날 때였을까, 문득 오른쪽을 보니 터널 갓길의 대피로에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쓸쓸히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불쌍한 인간. 보나마나 무슨무슨 협력업체의 계약직이겠지. 순간 부아가 치밀어 올라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휴게소 쪽으로 차를 몰았다. ‘화촌 휴게소’라고 적힌 어두운 간판이 나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