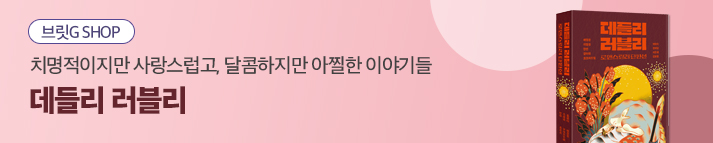처음 만났을 때 그는 스스로를 로흐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순간 그의 입 가장자리에 보일 듯 말 듯한 흰 문양 같은 것이 어리더니 얼굴 전체로 번져갔다. 어두운 보라색 눈동자가 무척 크고 아름다웠다.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찾지 못한 나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말았다.
진짜 이름은 그보다 길었다. 최대한 기지를 발휘해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어보자면 로흐브르 흐흐로브 르브로 정도일까. 하지만 그 같은 문자의 배열로는 그의 이름에 내재된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절반도 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그는 지구에서 일 여년을 보낸 후였다. 자신의 언어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지구인이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로흐는 메리흐 크롬르 출신의 외계인이었다. 메리흐 크롬르라는 이름 역시 그의 목소리로 실체를 얻었을 때 훨씬 운율적으로 들렸다. 그들의 언어에 따르면 축복받은 바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메리흐 크롬르는 금성보다는 작고 화성보다는 큰 행성이었다. 대기권 밖 적응 센터에서 오랜 기간 훈련을 거쳤다고는 해도 로흐에게 이곳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이었음은 분명하다.
그에게는 조금 버거운 중력 때문인지 로흐는 어깨를 움츠린 채로 느릿느릿 걸었다. 제비꽃을 닮은 눈동자는 투명한 막으로 덮여 있었다. 체모가 없는데다 미세하게 주름진 두껍고 견고한 피부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와 구분되는 특징이었다. 2m에 달하는 키 때문인지 체구가 무기력할 만큼 야위어 보였다.
정신적으로 고양돼 있을 때 그의 피부는 천사의 날개처럼 새하얬다. 반면 좌절해 있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거무스름하게 가라앉았다.
돌이켜보면 나와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일 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로흐의 얼굴은 대개 짙은 푸른빛에 가까웠다. 맨 처음 인사를 주고받았던 순간과 마지막 일주일을 제외하면. 당시에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깨닫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