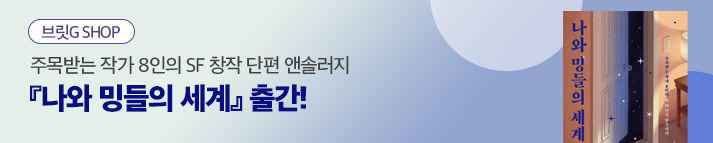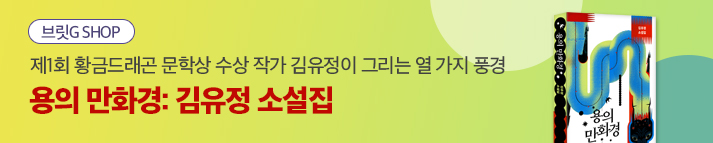나는 도랑 옆에 팽개쳐져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다. 앞다리는 바깥으로 꺾여 뼈가 튀어나오고, 몸 어디선가 역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배에서 흘러나온 뜨겁고 축축한 것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겨우 기억났다.
지긋지긋한 개구쟁이들…. 며칠 잘 피했는데 재수가 없었다. 피해서 도망치려는 내 꼬리를 확 낚아채이자마자 뾰족한 것이 배를 깊게 찔렀다. 한 놈이라도 눈을 후벼파 버렸으면 좋았을 걸. 분해서 이를 갈았지만 헤 벌어진 주둥이에선 거품 섞인 숨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들면 못 깨어날 것 같았다. 그러나 온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서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중략)
“너는 지금 무척 아파.”
장치에 연결하는 동안에도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연결이 성공하면 어느정도 치료와 생명유지 효과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했다. ‘죽어가는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을 연결해주는.’ 그녀는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느꼈던 통증, 소리 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쑤시고 타들어가는 것 같던 아픔이 기억난다.
나는 죽음도 알고 있다. 매일 인사하다가 하룻밤새 딱딱하게 굳어서 악취를 풍기는 작은 몸뚱이들은 많았다. 너무 많았다. 지금 나도 그들과 가까운 것이다.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것이다.
(중략)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어. 너 이름은 있어? 널 뭐라고 불러?”
이름이라. 나는 코끝을 찡그렸다. 내 동료들은 서로 부를때 짝눈이나 얼룩꼬리, 낙엽냄새라 하다가 때로는 바뀌어서 얼룩꼬리가 잘린꼬리가 되고 낙엽냄새가 은행냄새가 되기도 했다. 그들도 나를 내키는 대로 불렀다. 인간들은 꼭 이름이 필요한가? 나는 다 귀찮아서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나는 나야. 다른 이름 따위 없어. 나라고 불러.”
“나한테는 네가 되는데?”
“인간 사정 따위 알 게 뭐야. 나는 나라니까.”
“좋아, 그럼 ‘나’라고 하자. 그럼 넌 날 뭐라 부를래? 너도 ‘나’라고 불러줄래?”
“싫어, 나는 나 하난데 왜 널 나라고 해.”
“고집 부리긴. 알았어, 그럼 난 이름을 불러줘. 내겐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뭐라 하는데 내게는 인간 이름 따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들어도 ‘밍–이’인지 ‘이–밍’인지 그게 그거 같다. 그래서 나와 인간 노인은 손을 내저었다.
“몰라. 넌 ‘밍’이다. 이제부터 ‘밍’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대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