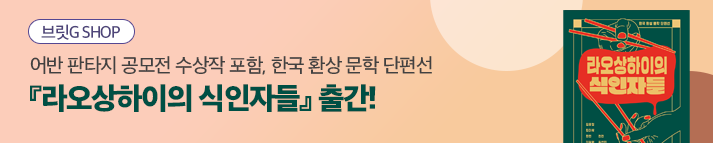강시(僵屍)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시는 달의 자식이었다.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한 자의 원기가 목구멍에 모여 달빛의 음기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강시가 생겨났다. 강시는 달빛의 음기를 먹으며 자라났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깨어났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시독에 감염되거나 묘자리를 잘못 쓰는 것이었다.
번쩍거리고 찌릿찌릿한 전기자극으로 되살아나는 인조양놈과는 다르게 강시는 느리고도 불쾌한 자극을 오랫동안 받아야만 되살아날 수 있었다. 묘자리를 잘못 쓴다함은, 땅에 음기가 너무 많거나, 물이 고여 있다든지. 뭐 이런 거다. 이럴 경우 강시가 된 조상은 제일 먼저 자신의 후손을 찾아가 해코지를 했다. 아마도 자신을 그런 곳에 팽개쳐 두었다는 생각에 괘씸하다고 여긴 것 같았다.
나는 샹시 지역에 강시 이야기가 유독 많이 퍼진 이유가 묘인이 치우를 조상으로 섬기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치우가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주술로 걷게 해 남쪽으로 돌려보낸 이야기는 신화에서도 나오니까.
사실, 이거든 저거든 모두 불안한 이야기뿐 이었다. 되살아난 강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강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시가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시 이야기는 결국 사람을 위한 이야기였다. 그 어디에도 강시의 입장이라는 것이 없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강시가 피를 빨아먹는다느니, 강시의 시커멓고 커다란 손톱이 사람의 목을 뚫는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생겨나고 있었다. 이건 양놈들의 소설이 원인이었다. 애란의 작가가 썼다는 이 괴기소설은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개화 좀 했다는 사람들 중에 이 소설을 모르는 자는 없었다. 제목이 더라쿠라, 아니 드라쿠라 백작이었던가? 나는 사람의 피를 먹는 흡혈귀가 나온다는 말에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다. 피를 빠는 자가 뭐 어쨌다는 것인가. 양놈들에게는 괴기할 수 있어도 나에게는 아니었다.
루쉰이 쓴 [광인일기]에도 나오지 않는가. 식인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다. 기근이 들었을 때도, 역병이 들었을 때도, 나라에 난이 생겼을 때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람들을 먹었다. 죽은 자를 먹을 때도 있었고 산 자를 먹을 때도 있었다. 먹물을 먹는 자들은 식인하는 세상을 만든 원흉이었지만 자식의 살을 먹어야만 하는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루쉰만 해도 모든 식인을 다 싸잡아 욕하지 않는가.
식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원래 식인은 죽은 조상을 먹는 풍습에서 기인한 거였다. 충과 효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저미는 것만 식인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다. 옛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살을 씹고 그 피를 마시며 조상을 기렸고 살아남은 다른 부족 구성원들과 하나 됨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였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사실 그들은 시신을 땅에 묻어 구더기들에게 먹이로 주는 우리의 방식이 더 미개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양놈들이 십자가에 허리를 숙이며 밀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도미누스보비스쿰(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이라고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들은 밀떡이 예수의 살이라 하고 포도주는 그의 피라고 하지 않는가.
각설하고, 강시가 흡혈귀처럼 피를 빤다는 말은 확실히 낭설이다. 나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는다.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검붉은 피를 생각하면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 나는 랑인(狼人)의 손톱 같은 커다란 손톱도 없다. 손톱을 하도 짧게 잘라 손톱 밑이 따가울 지경이니까.
나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곳 프랑스 조계지에서 눈을 뜬 뒤로, 내가 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해보았다. 몇 년에 걸친 고민과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굶주림 끝에 나는 드디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나를 강시로 만든 것은 지나친 음기가 아닌 지나친 양기 때문이었다. 음양의 양(陽)이 아닌 양(洋),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양놈들의 양기(洋氣)가 나를 되살린 것이다. 양기는 부활의 원동력이었고 내 굶주림의 원천이었다. 강시가 고향에 돌아가 안식을 취한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내 불안감과 불쾌감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나는 또 다른 죽음이 될지도 모르는 귀향을 선택하는 대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동방의 파리라는 이곳 상하이는 전 세계 양놈들이 몰려드는 항구였고, 수많은 외지인이 몰려드는 도시였다. 이곳은 양기에 굶주린 강시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냥터이자 훌륭한 삶의 터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