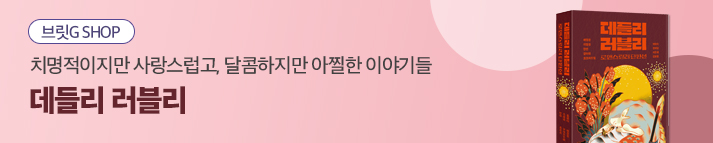단 한 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받은 적이 있다.
나의 두 눈이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달을 기다리는 달맞이꽃처럼 그 별을 좇게 된 것도 그 때부터다.
햇수로 세자면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당시 나이 열여덟, 연이은 낙방에 낙심하여 도피를 위해 기루를 찾던 시기였다. 오래 전의 일이라 정확한 시일은 가늠할 수 없으나 한들거리는 느티나무 위로 교교하게 빛나던 그믐달을 기억한다.
우연의 일치였던가. 아니면 운명의 발로였던가. 새벽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에 문득 고개를 젖힌 나는 가지 사이로 너울거리는 하얀 치맛자락을 보았다.
어둠에 물든 나뭇잎 사이에 덩그러니 걸려 있는 하얀 치마는 커다란 목련처럼 보였다. 처음엔 술이 깨지 않아 헛것이 보이는구나 싶었다.
그러나 눈을 깜빡이고 난 뒤에도, 두어 차례 도리질을 치고 난 뒤에도 나무 위의 허깨비는 사라지지 않았다. 못 본 척 지나갈까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고개를 든 호기심이 발길을 잡았을 뿐이다.
나무 밑으로 다가가 올려다보니 제 팔뚝만한 나뭇가지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는 계집아이가 보였다. 아이가 입은 것이 소복이 아닌 속치마였으므로 귀신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게서 뭘 하는 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