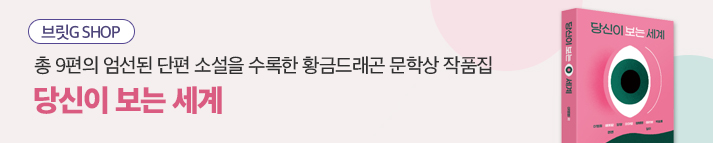사방에 일이 없고 도적이 없으며 시화연풍하여 나라가 태평하더라.
『홍길동전』, 허균 作
一
조선국 후기의 일이다. 군주는 더할 나위 없는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여 두루 마땅한 존경을 받았으매 국력은 안온하고 백성은 배부르니 그야말로 천하태평의 시대 아닐 리 없었다.
이토록 강건한 안녕 아래, 하물며 양반이라 치면 더할 나위 없이 배부른 것이 당연지사. 고을에서 가진 것 많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 양반댁 대감마님은 흥에 겨운 탓에 술을 마다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영감, 술독에 재워도 모르고 퍼 잘 만큼 술병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더랬다. 개중에서도 대감이 죽고 못 사는 술은 육류로 담근 것이었다. 보름에 한 번은 사냥꾼을 시켜 뒷산에 노니는 들짐승을 잡고 백정을 시켜 그 목을 친 다음 술을 담그고는 했다. 그렇게 담근 술을 일자순대로 정리하여, 그 집 뒷마당을 가득 차지하는 곳간에 넣어 재운 게 어언 스무 해가 넘었더랬다. 쌓아둔 재물이 욕심만큼 철철 넘치는 마당에 베풀기에는 뭐 그리 인색한지. 대감은 누구 하나 제 것을 함부로 건드릴까 늘 눈총을 겨누며 주변을 살피었다. 그 양반댁에서 나고 자란 이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대감 앞에서 설설 길 수밖에 없었다. 대감은 제 물건에 다른 이의 옷자락이라도 스쳤다 하면 부리나케 경기를 일으키며 바락바락 화를 내기 일쑤였으니 이 성질에 못 이겨, 대감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곳간을 드나들 생각일랑 품을 수가 없었다.
대감에게는 고명딸이 하나 있었다. 늦둥이로 태어난 그 아씨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글쎄, 무명(無名)이라 하더라. 듣기로는, 대감의 첩이었던 제 어미가 산통에 못 이겨 명을 다하는 바람에 일찍이 그 집 여종이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한다. 명의가 일러준 날보다 조산하는 터에 아이 역시 몸이 성치 않았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언제 운을 달리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제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무명아, 무명아 하고 부르던 게 아명으로 굳혀진 것이었다. 하여, 무명은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없었다.
무명이 나고 자란 곳은 산이 빼곡하게 둘러앉은 모습으로, 외지인의 출입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고을 밖으로 가려거든 그 산을 굽이굽이 넘어야만 했다. 때문에, 무명은 생전 고향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었다. 날이 좋을 때면 여종을 조르고 졸라 뒷산 근처로 나들이를 나선 게 고작이었다. 무명에게 허락된 공간은 가장 낮은 산턱까지가 다였다. 집안 어른들은 무명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다. 여자아이가 거닐기에 산길은 위험한 게 많다는 연유였다.
“산신이며 멧돼지며 구렁이며……. 한갓 계집애는 그런 짐승들에게 한 입짜리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무명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른들이 늘 조심하라고 이르는 짐승들이라 하면, 하나같이 제 아비가 사냥꾼을 시켜 죽여서는 술독에 채우는 것들 아니던가. 겨울마다 대감은 사랑채 아랫목에 호랑이 거죽을 깔고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고 피워댔다. 멧돼지 고기는 무명의 큰 오라비가 가장 환장하여 나흘에 한 번꼴로 찾는 음식이었다. 벗겨낸 구렁이 비늘은 작은 오라비가 가져다가 그 안에 진흙을 채워 무명의 방 앞에 부러 두고 가는 장난감이었다. 물론 무명은 그 장난이라는 짓거리가 재미라곤 하나 없었다.
“잡아먹혀야 할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렇지?”
비늘이나마 흙에 제대로 묻어주며 무명은 중얼거렸다.
무명이 제 방에서 자수를 놓고 있노라면 대감과 그의 오라비 둘은 뒷산에 나가, 일전에 놓아둔 덫에 걸린 짐승들을 잡아 오기 일쑤였다. 철망에 얽혀 다리 거죽이 벗겨진 산짐승들의 반쯤 죽어가는 몰골을 볼 때마다 무명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절간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에 퍼지는 날마다 무명은 그리 말했다. 진심이었다.
“아씨, 아씨.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이까?”
또 시작이구나. 무명은 생각했다. 어렸을 적부터 종종 환청에 시달려 온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대감에게 고했을 적에는 코흘리개가 잡귀에라도 씐 게 아니냐며 온갖 눈총을 받은지라. 무명은 그 성질에 못 이겨, 그저 몸이 상해 그런 듯하다고 어물쩍 말을 돌린 후 여태 숨겨온 것이다. 몇 해를 넘겨도 이놈의 증상은 여전하다만 여타 악재는 없는지라,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도리어 그 말에 답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야, 나는 이 집에 있어봤자 객식구이기 때문이지.”
“어째서 그렇답니까?”
그 목소리가 대꾸했다. 무명은 근래 읽었던 서책의 내용을 떠올렸다.
“나는 얼녀라 태초에 그렇단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 유명한 서자 도령의 이야기처럼.”
잠시 침묵하고는, 이어 말했다.
“더군다나 계집아이는 그렇단다. 이 나라 모든 어머니의 딸들은 그렇지.”
“어째서 그렇답니까?”
목소리가 다시 대꾸했다.
“대감이 말씀하시기를, 딸년이 자식이라 하면 어릴 적에 재롱 좀 보다가 제때 좋은 집에 시집이나 보내면 그만. 혼례를 치르면 내가 태어난 이곳은 ‘바깥 외’자를 쓴 외가(外家)가 된단다.”
“아씨, 아씨. 그렇담 우리와 같이 살려오? 우리는 계집이건 사내건 달리 중요하지 않다오. 우리가 아씨가 원하는 것을 모조리 찾을 수 있게 해드리오리다. 우리가 아씨의 가족이 되어드리리다.”
그에 무명이 곧장 묻기를.
“그럼 나는 무엇을 주면 되지?”
대답이 없었다.
이때, 마당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명은 벌컥 문을 열어 밖을 살폈다.
“아이고! 내 뱀 달아난다! 저놈 잡아라!”
막 잡아 온 듯한 새하얀 뱀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급히 도망치고 있지 않은가. 주변에는 깨진 술독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무명은 소리치는 대감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체하며 조용히 도로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