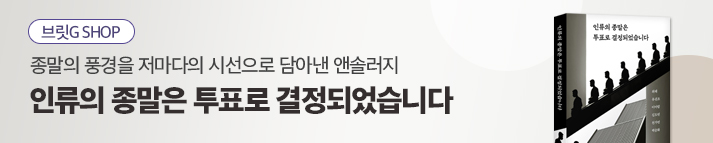“저는. 시네필이. 아닙니다.”
현이 말문을 열자마자 승필은 ‘이 인간 또 시작이구나.’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시네필이 아니야.”
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시네필을 광의의 시네필로 정의하자면, 나도 시네필이긴 하지. 그건 인정하는데… 어쨌든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시네필이라고 말하는 개념에, 나는 부합하질 않거든. 예를 들어 하워드 혹스나 멜빌한테 관심없는 시네필이라는 게 말이 돼? 게다가 나는 라브 디아즈 영화도 한 편도 안봤고, 페드로 코스타도 별로 안좋아해. 사실 이 정도조차도 요즘 어린 시네필애들한테는…”
현은 줄줄 흘러나오던 말을 멈추더니 이마를 찌푸렸다. 아 나도 어느새 꼰대가 다 되었구만.
“요즘 그… 분들…한테는, 되게 대중적이고 이미 유행이 지난 취향이라고. 난 요 몇년간 전주나 칸 영화제 감독들 이름을 봐도 하나도 못알아본다니까?”
현은 의기양양하게 승필을 보았지만, 승필은 창 밖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현도 덩달아 창 밖을 보았다. 하늘은 지금 노란빛이 감돌았다. 초록색이 될 차례 아니었던가? 뉴스에서 오늘 하늘색의 변화와 시간대에 관하여 몇번이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현은 그 순서가 언제나 헷갈렸다. 알게 뭐람. 알람이 몇시간 남았는지 일일이 확인해봤자, 불안하기만 할 뿐이다.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잊고 있는 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