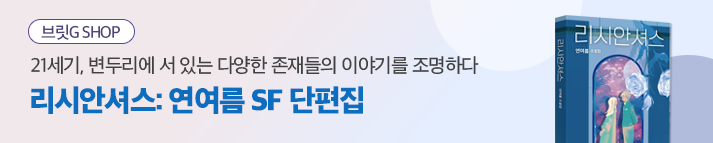이 글은 당신만 읽게 될 것입니다. 고해 성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종교를 가져 본 적은 없지만 가장 비슷한 경우가 뭘까 고민하다가 고른 단어입니다.
이 네모난 종이를 고해소 삼아 나의 기이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묵묵히 들은 당신은 다른 곳으로 말을 옮기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까지 포함된 행위로서의 고해 성사 말입니다. 물론 이미 당신은 고해 성사의 뜻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닌 타인의 고해 성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오프 더 레코드라고 표현했어요. 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이라니 그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면서요. 엄밀하게는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원했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워지고, 또 지워지는 삶이.
이름 없는 삶이.
*
“간단해요. 메신저 채널에서 플랜B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만 부탁 드려요. 그럼 오늘 사용 가능한 원 플러스 원 쿠폰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바 플랜B는 오픈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바텐더예요.
비록 내 가게는 아니지만 10여 년의 런던 생활을 접고 귀국하자마자 서둘러 얻은 직장입니다. 그때 나에겐 단 하나의 의지만이 오롯했거든요.
잡념이 내려앉을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싶다.
런던에서 6년을 함께 지낸 연인 이즈미를 사고로 떠나보낸 후, 나의 시간은 지나치게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얼 해도 시간은 더디게만 흐르고 잠도 오지 않고, 마치 하루가 72시간은 되는 것 같았죠.
이즈미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쓸모없이 좋은 기억력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즈미를 알고 사랑했던 런던에서는 도무지 잊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즈미의 유해를 나는 만난 적 없는 일본 가족들에게 돌려보낸 후, 비자 연장을 포기하고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즈미가 없는 시공간이 아주 당연한 이곳으로요. 그래야 시간을 원래의 흐름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급작스레 잡힌 면접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도록.
마침 전임자가 예고도 없이 그만둬 버린 터라 일손이 급했던 사장은 반신반의하며 나를 채용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도 꽤 드나드는 가게라서 해외에서 일한 경력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괜찮고 가급적 많이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가장 먼저 사장의 귀를 솔깃하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급여 흥정도 하지 않았고요.
당신은 좀 불온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사장에게도 형식적이나마 칵테일에 대한 애정이라 부를 만한 것 하나 없이 이루어진 채용 과정이요. 최선이 아닌 차선, 그러니까 플랜B라는 옥호와 더없이 어울리는 상황들이요.
하지만 적어도 사장만은 내게 만족했습니다. 주 3회만 근무하면서도 근무표를 까탈스럽게 짜는 다른 직원과 달리, 토 하나 달지 않고 일하라고 하는 날 일하고, 쉬라고 하는 날에 쉬는 나 같은 직원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손님들에게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 특성상 경찰을 부를 일도 간혹 생기는데 얼마나 대단한 운이 도와주었는지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게 주문받은 칵테일을 제조하고 리큐어와 와인을 정량대로 따르면서, 손님들이 내어놓는 이야기를 듣고 컵의 물기를 닦으며, 나에겐 과분하게 주어진 시간을 소진하고 소진했습니다. 그게 플랜B에서의 제 삶이었어요.
10주년 이벤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사실 주말이나 많이 바쁜 날에는 손님들에게 메신저 채널 추가 부탁은 부러 하지 않습니다. 가게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해 두어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손님도 어느 정도 있었고, 사장도 직원들에게 영업을 강요하는 성품은 아니었으니까요.
플랜B를 찾는 손님은 대체로 같은 빌딩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이들로 단골이 많습니다. 굳이 쿠폰으로 유혹하지 않아도 꾸준히 찾아올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날은 목요일 평일이었고, 다른 목요일들에 비해서도 유난히 손님이 적은 날이었어요. 덕분에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기울일 수 있는 귀와 관심이 넉넉했고, 말소리보다는 음악과 침묵이 더 큰 부피로 매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눈여겨 봐 두었던 손님을 기억해 낸 나의 눈썰미도 영업을 부추기는 데 한몫 거들었고요.
“작년에도 이맘때쯤 찾아 주셨죠?”
드라이 마티니를 앞에 내려놓으며 묻자 손님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얼굴에 쓰여 있었죠.
앞서 말했지만, 플랜B의 손님 대부분은 단골인 탓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손님이 더 눈에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손님의 경우 주문이 약간 독특했거든요.
올리브를 칵테일 픽에 꽂아 마티니에 넣지 말고 다른 그릇에 따로 담아 줄 것. 올리브는 두 개.
그 요청을 건네는 손님의 목에 감긴 스카프도 하필 올리브색이었다면, 이번에도 그 중년의 우아한 부인이 같은 스카프로 멋을 내고 왔다면, 아마도 기억해 내지 못하는 편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