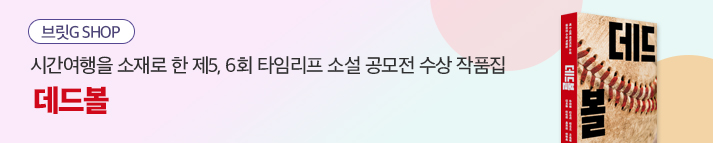“동그라미가 시작이 워딨고 끝이 워딨어!”
(서사가 순환 구조를 띨 때는 사건의 시초와 결말이 따로 없다)
– <김지환 회고록> 중 별빛마을 2단지 부녀회장 남춘순의 말-
1.
한은세가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은 1997년 넥스트의 고별 콘서트장에서였다.
‘라젠카, 세이브 어스’의 전주 오페라가 울려 퍼질 즈음, 검은 후드를 뒤집어쓴 여자가 돌연 한은세 곁에 등장했다. 관중에 떠밀리거나 스스로 사람들을 비집고 그 자리로 온 게 아니었다. 여자는 CG 합성처럼 갑자기 그 자리에 존재했다. 은세는 자기 말고도 이 수상쩍은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있을까 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강렬한 드럼 사운드와 아포칼립스의 광기에 취한 관중들은 검은 후드차림의 여자가 아니라 초록색 살갗의 외계인이 나타나도 신경 안 쓸 분위기였다. 오직 은세와 여자만이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은세는 여자가 콘서트를 즐기러 온 게 아니라는 데 손목을 걸 수도 있었다.
여자는 은세가 안고 있던 피켓을 낚아채더니 뭘 맡겨 둔 사람처럼 손을 내밀었다.
“마커도 얼른!”
은세가 뭘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거리자 여자는 은세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유성매직을 빼갔다.
원래 은세의 피켓에는 ‘신해철 미래 부인 최미라!’라는 문구가 있었다. 최미라는 신해철의 광팬이자 고별 콘서트 티켓의 본래 주인인 막내고모였다. 콘서트를 앞두고 갑자기 회사 출장을 가게 된 막내고모가 당시 중학생이던 한은세를 대타로 보낸 것이었다. 응원 피켓에 쓸 문구까지 정해 주면서 말이다. 은세는 고모가 일러 준 대로 하드보드지를 사서 피켓을 만들었지만 정작 콘서트장에서는 내내 품에 안고만 있던 터였다. 누구의 미래 부인이라니. 그 망측하고 오글거리는 문구를 차마 남들 앞에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자는 은세를 돌려세우더니 은세의 등을 탁자 삼아 피켓 뒤쪽에다 급히 뭔가를 끼적였다. 전주의 웅장한 오페라가 끝나고 신해철의 노래가 시작되자 일찍이 은세가 겪어보지 못한 데시벨의 함성이 콘서트장을 뒤흔들었다. 응원문구를 다 썼는지 여자는 피켓을 힘껏 치켜들었다. 하지만 노래가 중반부를 지나가도록 여자의 피켓은 넥스트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객석은 어둑어둑했고 기껏 50센티미터가 될까 말까 한 하드보드 띠지는 야광 막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 파묻혀 버렸다.
관객들의 떼창 속에서 노래는 결말로 치달았고 여자는 스스로 피켓을 접었다.
“저기…… 그거…….”
은세는 피켓을 가리켜 보였다. 꼭 돌려받아야 했다. 미션을 수행했다는 증거로 고모에게 가져가야 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피켓을 돌려주며 은세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너, 오십 원 아끼느라 인생 조지지 마라. 알배기 세 통을 품에 안고 가는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암만 해도 미친년이 분명했다.
그제야 은세도 눈을 반짝거리며 여자를 찬찬히 살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뿜어 대던 강한 이물감의 정체가 궁금해진 것이었다. 은세보다 조금 큰 키에 보통 체격. 어느 거리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신체조건인데도 여자는 도드라졌다.
그림으로 치자면 화풍이 달랐다. A 화가가 그린 콘서트장 정경에 다른 화풍을 지닌 B 화가가 인물 하나를 덧그린 모양새였다. 여자에겐 이 세계에 녹아들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은세의 빤한 눈길에 응수하듯 여자가 후드를 벗었다. 여자의 왼쪽 뺨은 벌집 모양의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래된 흉터 같진 않았고 콘서트장에 오기 전에 뭔가에 짓눌린 듯했다. 왼쪽 귓불은 외과수술이 시급해 보일 정도로 찢어져 있었고 입술도 군데군데 터져서 핏물이 맺혀 있었다.
은세가 입을 가리며 물러섰지만 여자는 더 바특이 다가섰다.
“알배기 배추는 꼭 봉투에 담아 다녀. 내 말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사라졌다. 다른 사람들 틈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순간 증발해 버렸다. 그날 여자가 피켓 뒷면에 남긴 문구는 이것이었다.
마왕, 정말로 라젠카가 우릴 구원해 줄까요?
노랫말의 진의를 되묻는 듯한 문장이었다.
실로 괴이한 조우였으나 두어 해가 지나자 은세는 검은 후드 티셔츠를 잊었다. 때는 그 여자를 능가하는 미친 자들이 도처에 출몰하던 세기말이었고, 한은세 또한 똑단발 뿔테안경의 고등학생이 되어 집 학교 학원의 쳇바퀴에 갇혀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어느 날…….
“알배추 세 통 해서 팔천칠백 원입니다. 봉투 오십 원인데 드릴까요?”
동네 슈퍼 계산대에서 알배기 배추 값을 치르던 한은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그날의 일이 스쳐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때 분명 50원이 어쩌고 봉투가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동네 슈퍼 계산대는 옛 기억을 되짚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다. 거긴 빨리빨리의 등속 운동이 지배하는 곳으로 물체도 사람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잠시만 멈칫거려도 떠밀리게 마련이었다.
“손님? 봉투 드려요?”
“아, 아뇨. 괜찮습니다.”
어린애 머리통만 한 알배추 세 통을 품에 안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계산대에서 한참 멀어진 뒤였다. 은세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부부의 아이들이 계산을 마친 과자들을 집어 드느라 법석을 떨었고, 은세는 순식간에 슈퍼 문간까지 밀려나 있었다.
결국 은세는 알배추 세 통을 품에 안고 슈퍼를 나섰다.
격동의 회오리가, 정확히 24년 전에 검은 후드티 차림의 여자가 예언한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