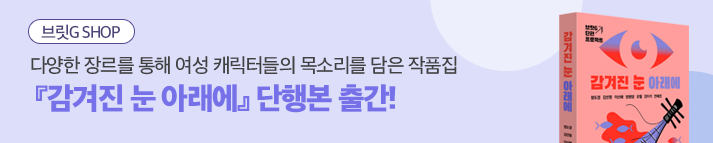과학잡지의 기자 일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대학원 입학식 때 상상했던 미래 모습과는 분명 달랐지만, 흰 가운이나 라텍스 장갑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게 그다지 아쉽지는 않았다. 전공을 살린 직장이었고, 적성에도 꽤 맞았고, 학술적으로 거의 완전히 무가치한 누더기였던 내 졸업논문에 비하면 기사는 훨씬 보람차게 쓸 수 있었다.
의외의 즐거움도 있었다. 기사를 쓰기 위해 과학계 종사자들과 인터뷰를 할 일이 많았는데, 피곤에 찌든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떤 사악한 우월감이 피어올라 나를 고양시키곤 했다. “나는 그만뒀는데, 너희도 그만두지 그래?” 같은 종류의. 분명 유별나게 고통스러웠던 내 대학원 생활이 내 영혼을 뒤틀어 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인터뷰는 그렇게 내 뒤틀린 정신에 단물을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흥미로운 깨달음을 하나 던져 주기까지 했다. 매일 같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과학계의 지성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좁은 실험실에 갇혀 매일 똑같은 사람만 만날 땐 알 길이 없었던 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바로 그 대단한 지성들,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는 과학적 방법론의 사도들조차도 종종 터무니없이 이상한 믿음에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이었다.
이를테면 최근의 상가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기 위해 건축공학 전문가인 모 교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그의 책장에 줄지어 꽂힌 창조과학 관련 서적을 힐끔힐끔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했다. 교수가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었다. 건물 붕괴에 대한 그의 설명은 역학적으로 더없이 정확했으니까. 다만 그는 지구가 1만 년 전쯤(플라이스토세 말기, 털매머드가 멸종하기 시작할 즈음)에 창조되었다고 굳게 믿을 뿐이었다.
또 한 번은 비타민 음료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생성된다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책을 여러 권 쓴 유명한 화학자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정작 들은 얘기는 30%가 화학이었고 나머지 70%는 세계를 뒤에서 주무르는 사회주의자 파시스트 악마 부자들에 대한 일장연설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한테까지 이렇게나 열렬히 떠들어 대야 하는 이야기를 베스트셀러가 된 청소년용 과학책에는 어떻게 안 쓰고 참았을지, 그 점이 특히 마음을 울렸다.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 않나?” 그래, 그걸 누가 모르겠나. 하지만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분야에서는 그 누구보다 이성적인 인물들이었고, 정신은 명료하다 못해서 항성처럼 이글이글 타올랐으며, 망상증이나 여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하면 흔히 생각날 만한 정신질환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팽팽 돌아가는 두뇌 한쪽으로는 이론과 실험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가다듬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과학계에 이상한 놈은 내 예전 지도교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 새로운 발견에 열광했다. 곧 이성적인 과학자들의 이상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은 내 작은 취미가 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사담을 웬만하면 막지 않았고, 때로는 일과 무관하게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자 개인 시간을 쪼개기도 했다. 아예 칼럼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은 ‘잡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편집장이 바뀌면 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렇게 모인 이상한 이야기가 지금은 수십 편이 되었다. 대부분은 창조과학, 다국적기업 음모론, 혹은 정치적인 횡설수설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머리 좋은 과학자가 논리적으로 말해도 도무지 믿을 생각이 안 든다. 하지만 가끔씩은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그래서 ‘이건 진짜가 아닐까?’ 싶은 이야기가 등장해 가슴을 뛰게 한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수학 교수의 정교한 이론을 들은 뒤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노선도에 신경이 쓰이고, 몽골에서 공룡 화석을 캐내는 발굴팀의 연구원이 들려준 경험담에는 알려진 인류 문명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진실이 감추어져 있을지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작년 겨울에 한 생명공학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