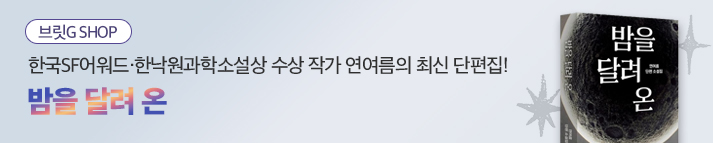밤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 밤이 오면 말이야.
요사이 하인들 사이에서 자주 들려오는 말이었다. 다들 틈만 나면 밤 이야기로 바빴다. 하지만 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밤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인 듯하다고 온은 생각했다. 끊임없이 상기해서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곧 찾아올 밤의 주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공포심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온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몇 분 주방을 비웠던 조리장 린그가 돌아오자마자 화덕 앞에 모여 있던 하인들은 잡담을 멈추고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온도 잠깐 멈췄던 설거지를 서둘러 시작했다. 다른 하인들은 어린 온을 따돌리며 대화에 끼워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온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죽여 귀 기울여야만 했다. 그 탓에 씻어야 할 그릇이 줄어들지 않고 아직 산더미였다. 린그가 결국 호통을 쳤다.
“그렇게 굼떠서 어떡할 거니! 그러다가 누군가 한밤중에 널 해치기라도 하면 도망은커녕 뼈도 못 추릴 거다.”
린그의 말에도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며칠 전만 해도 린그는 ‘느려 터졌구나! 온, 너 때문에 이 저택 사람들 모두 굶어 죽겠어. 당장 그 게으른 팔다리에 날개를 달지 못해.’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린그의 이번 겁박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아직 열 살인 온은 밤의 주기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게 어떤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누군가 일부러 해칠 만큼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다. 차라리 쓸모없다는 이유로 저택에서 쫓겨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다면 더 그럴듯할까. 온은 그저 이 많은 주방 하인 중 가장 존재감 없는 말단에 불과했다.
“참, 설거지를 끝내면 루펜 씨에게 가라. 널 찾으시니까.”
“……저를요?”
이어진 린그의 지시에 온은 조심스레 되물었다. 평소 입을 열어 말하는 일이 거의 없는 온이었지만, 이번에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여기 설거지하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니?”
린그는 톡 쏘아 대꾸하고 다른 하인에게 잔소리를 하러 떠났다.
루펜은 이 저택 주인의 오랜 친구이자 비서장이었다. 온이 알고 있기로 비서장은 저택의 행정을 돌보는 집사장만큼 높은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이 저택의 주인처럼 연방 경비대의 높은 직책에 있었고, 은퇴한 지금은 현역 경비대장인 주인을 위해 다양한 조언을 해 주는 역할로 여기에 머무는 것이라고 들었다.
온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루펜처럼 높은 사람이 자기 같은 하인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 온은 그를 창문 너머 멀리서 보기만 했을 뿐이라 분명한 생김새조차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