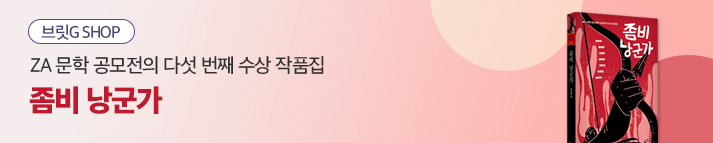파도가 들이닥쳤다. 서쪽 숲에서부터 기다랗게 이어진 발자국이 물결에 지워졌다. 그 끝에 진홍이 서 있었다. 하얗게 인 물거품이 미투리를 적셨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해풍에 맞서다시피 한 채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굳은 다짐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잔뜩 긴장한 어깨에서 조금씩 기운이 빠졌다. 진홍이 입가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냈다. 그러나 저물녘의 볕이 비쳐 붉은 기운을 띤 눈동자에 어린 분노는 지워지지 않았다.
파도가 쓸려 나갔다.
진홍은 이 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것이 진홍이 원하는 단 한 가지였다.
진홍은 섬 생활이 끔찍했다. 매일 보는 동무들은 지긋지긋했고 갯냄새는 역겨웠다. 마당마다 줄줄이 매달아놓은 생선이 진절머리 났다. 하얗게 반짝이는 소금밭은 비위에 거슬렸다. 비좁은 땅에 어떻게든 발붙인 채로 새끼를 낳고 뒤엉켜 사는 어른들이 짐승 같았다.
이 섬에서 삶은 대체로 무사태평했다. 어획량은 풍부했고 돌림병은 잇닿지 못했으며 매해 여름 느지막이 사나운 기세로 다가들곤 하던 태풍은 섬 가까이에 이를라 치면 지레 겁먹은 것처럼 슬그머니 행로를 바꾸었다.
섬은 풍해를 입지 않았고 부락민들은 사시사철 배를 곯지 않았다. 보릿고개조차 남의 일이었다. 봄은 쑥과 가자미의 철이었으니까.
이 모두가 섬을 다스리는 용왕님의 자비 덕분이었다.
용왕님이라니! 하, 그 빌어먹을 것한테. 욕지기가 치민 진홍이 탁 침을 뱉었다.
진홍은 바닷바람에 침음하지 않는 잠을 바랐다. 소금기에 절어 뻣뻣해진 저고리의 동정일랑 뜯어버리고 싶었다. 취객이 늘어놓는 하염없는 술주정 같은 파도 소리가 징그러웠다. 새끼를 두르고 잔돌을 얹어 납작하게 누른 지붕들이 미련하게 느껴졌다.
진홍은 안개 낀 아침을 맞고 싶지 않았다. 일찍이 주름이 지고 살결이 거칠어지는 여자들처럼 늙고 싶지 않았다. 한밤중 숲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에 더는 겁먹고 싶지 않았다.
남쪽 포구와 이 섬을 오가는 유일한 뱃사공인 백은 진홍에게 이렇게 귀띔했다.
“뭍에서는 못 구하는 게 없거든. 각시들은 얼마나 편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지. 이것 봐, 예쁘지 않아? 네게 주려고 챙겨온 물건이야.”
그 밤, 진홍은 간만에 섬에 들른 백과 함께 해송 숲을 거닐었다. 진홍은 백이 건네준 노리개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국화매듭의 그 노리개에는 비취옥이 달려 있었다. 그렇다고 은근슬쩍 어깨를 주무르려는 손길까지 용납한 건 아니었다.
진홍은 자신만만했다. 어차피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으니까. 섬에는 진홍 또래가 유난히 드물었고 개중에는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소녀들도 더러 있었다. 달이, 그 계집애만 처리할 수 있다면. 하지만 진홍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섬에서는 일 년에 한 번 의식이 치러졌다. 언제부터 전해 내려왔는지 모를 전통이었다. 이 섬을 지키는 용왕님은 매해 봄 화관을 쓰고 활옷을 차려입은 채로 부락민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리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인간 각시가 섬의 역할을 맡아 그의 뜻을 받들어 선택한 인간 신랑과 예식을 치렀다. 그들 새각시 새신랑은 이튿날 동이 트기 전 돛단배를 타고 뭍으로 건너갔다.
이 봄, 달이는 진홍만큼 간절하게 이 섬을 떠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해풍에 실려 숲 저편에서 전해지는 비명을 감지한 진홍이 눈썹을 치켜들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필시 바람의 수작질이라고 흘려 넘겼을 그 소리는 진홍의 귀에 분명한 고통의 신음처럼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