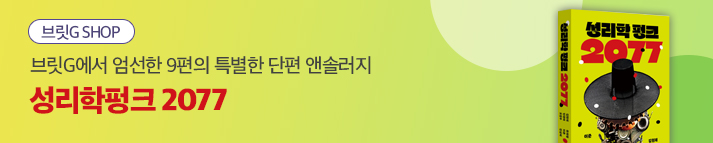나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사방 한 뼘, 두께 한 치의 네모난 상자. 세상을 물들인 어둠 속에서도,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이 오방색 조각보라는 걸 나는 한눈에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 키 정도 깊이로 묻혀 있었다. 집이 헐린 구덩이 한 면에 튀어나온 그 상자를,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교훈동 방울상자 집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
[서울특별시 강상구 교훈동에 조선시대 큰 부자가 살았던 한옥집이 있다. 그 집 어딘가에 방울이 들어 있는 상자가 있는데, 상자 뚜껑 안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다.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상자를 열면 큰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이름이 다른 사람이 열면 큰 화를 입고 온 집안이 불행해진다.]
교훈국민학교 학교신문 우리동네 전설 난에 실린 이야기를 보자마자 내가 소리를 질렀었다.
“이거 우리 집이 틀림없어!”
“흥, 그런 거짓부렁에 홀라당 넘어가다니 코흘리개들은 어쩔 수 없어.”
기사를 거짓부렁이라고 무시한 삼촌은 웬걸, 내가 들고 있는 신문을 빼앗으려 했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뺏으려고 해!”
내가 반항하자 때리려들었고, 뒤돌아서 도망치자 머리꽁지를 잡아당겼다. 결국 나는 신문을 넘겨주어야 했다. 고등학생 삼촌이 국민학생 조카의 학교신문을 빼앗아도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 옛날에 여학교를 나온 신여성으로 누구에게도 꿀리는 일이 없이 당당하고 대찬 할머니셨지만 삼촌에게만은 예외이다. 할머니는 삼촌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다. 나이는 나보다 네 살 많고 철딱서니는 나보다 다섯 배 더 적은 참 한심한 삼촌이었다. 그랬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철딱서니 없고 참 한심한, 그런 삼촌이었다. 정확히는 엄마의 이복동생이니 외삼촌이다. 할머니 역시 엄마의 어머니이니 외할머니셨지만 내게 친가 쪽 친척은 아무도 없었으니 굳이 ‘외’자를 붙일 의미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