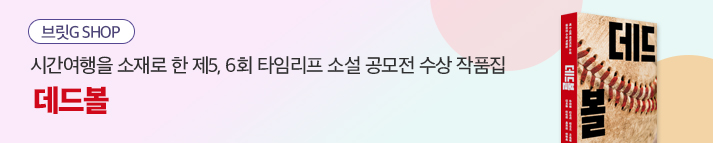글라우케는 쫓기고 있었다.
벌써 사흘째, 얼굴이 검은 노예장과 그 수하들이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먼 바다를 건너왔다는 노예장은 삼단 노선을 타고 전장을 누빈 군인 출신이라 칼끝이 무자비하다 했다. 하지만 글라우케가 두려워하는 건 칼이 아니었다. 저들에게 잡혀서 그 귀족의 집으로 도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칼에 심장을 찔려 하데스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글라우케는 제 스스로 그 칼에 뛰어들 수도 있었다. 열세 살은 그럴 수 있는 나이였으며, 때로는 죽음보다 삶이 섬뜩하다는 걸 이해하는 나이였다.
혼백이 지하로 내려가던 날, 아버지는 가느다란 숨결로 일렀다.
아비 없이도 살아다오. 참나무처럼 레아 여신의 품에 뿌리를 내리고서 열두 살까지 살아다오. 열두 살이 되거든 또 그 곱절로 살아다오. 데메테르 여신이 돌아오는 계절에는 싹을 틔우는 것들을 보며 웃고, 세이리오스 별이 작열하여 대지가 검게 타들어가는 계절에는 그늘과 물을 가진 자에게 의탁하고, 보리와 밀의 수확기에는 잘 고른 타작마당의 날품팔이꾼이 되어 데메테르 여신의 신성한 곡식을 항아리에 퍼 담고, 보레아스 신의 북풍에 털짐승도 울며 떨어대는 겨울이 되면 말린 만새기와 보릿가루를 나누며 살아라. 그리 살다보면 살아진단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그러구러 버티었다.
레아 여신을 섬기는 티린스 사람들이 글라우케를 거두어 아욱과 둥굴레를 캐게 하고 검은지빠귀와 큰까마귀로부터 사과나무를 지키도록 하였다. 하지만 열두 살이 되고 아이의 뺨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날품팔이 일이 끊겼다. 아낙들은 글라우케에게 떠나라 했다.
모진 마음은 아니었다. 복사뼈가 어여쁜 소녀를 노리는 무뢰배들이 마을에 있어서라 했다. 그들 중 누구는 아낙들의 아들이고 또 누구는 아낙들의 남편이라는 걸 글라우케도 알고 있었다. 클라우케는 레아 여신의 땅에 입을 맞추고 이태 동안 자신을 품어준 아낙들을 축복하고 그 땅을 떠났다.
처음에는 나고 자란 바닷가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아버지처럼 만새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도 좋을 듯했다. 하지만 고향 마을을 앞두고 억센 소나무와 잎이 무성한 참나무들이 들어찬 언덕을 넘어가는데 샤프란색 키톤 차림의 여인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바닷가에는 복사뼈가 예쁜 소녀를 멀고 먼 트라키아의 외딴 섬으로 팔아넘기는 노예상이 와 있으니 걸음을 돌리라 했다. 여인은 키톤 자락에서 짤막한 칼을 꺼내어 글라우케의 머리를 잘라주었다.
한결 낫구나.
제 머리를 잘라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글라우케가 묻자 여인은 애매한 답을 돌려주었다.
먼 데서 네가 만든 길을 따라 왔단다.
여인이 참나무 숲으로 녹아들고 나서야 글라우케는 그가 신임을 알았다. 아버지가 섬기던 티탄신인지 올림포스의 신인지 아니면 참나무 숲을 다스리는 요정인지 그도 아니면 어부였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바다의 님프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만든 길이라니……. 지금껏 글라우케는 길을 만든 적이 없었다. 어쩌면 여신이 사람을 잘못 보았을 수도 있었다. 글라우케는 여신이 사라진 숲의 땅에 입을 맞추고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남쪽 땅…….
티린스의 숯 굽는 마을 출신 어머니와 티린스 바닷가의 아버지 사이에서 난 탓에 이 도시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 유언대로 열두 살의 곱절만큼 또 살아가려면 타지로 가야 했다. 그리하여 글라우케는 티린스 남쪽의 레르나 땅으로 갔다. 짧게 자른 머리 덕을 보았다. 열두 살 남자아이는 일을 구하기 쉬웠다. 다행히 날품팔이 아이의 이름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그저 아고리(소년)라 불렀으니까.
돼지먹이로 쓸 상수리 열매를 모으는 일을 했다. 돼지치기들의 오두막 앞에는 사과나무와 여인이 그려진 항아리가 있었다. 귀족들은 석양의 낙원에서 황금사과를 지키는 에스페리데스 여신이 그려진 항아리를 썼지만 평민들은 그 모조품을 쓰는 것이었다. 에스페리데스 여신이 그려진 항아리는 ‘낮에 자는 자들’(도둑)(도둑을 ‘낮에 자는 자’라 표현한 것은 헤시오도스 <일과 날> 605, “낮에 자는 자가 그대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에서 따온 것이다.)이 손을 대지 못한다 했다. 항아리를 다 채우고 남는 상수리 열매는 글라우케의 몫이었다. 가난한 농부들과 뜨내기 품팔이꾼은 구운 상수리 열매로도 배를 채웠다.
가끔 손에 물집이 잡혀서 항아리가 채워지는 속도가 굼떠지면 돼지치기가 불호령을 했다.
어디서 엄살이냐? 아르고스 평원 건너 네메아 골짜기로 보내 버릴까 보다! 거기 열매줍는 아고리들이 헤라 여신의 사자에게 물려죽었다는 소문 못 들었느냐?
네메아 계곡의 사자 이야기라면 글라우케도 수차례 소문으로 접한 터였다. 헤라 여신이 풀어놓은 사자가 가축과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먹이로 삼는다면 다른 것을 배불리 먹여 성질을 잠재울 텐데, 여신의 사자는 산 것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 자체를 즐긴다 했다.
사자 이야기만으로는 못 미더웠는지 돼지치기는 으름장을 이어갔다.
아니지, 네메아 골짜기까지 갈 것도 없지. 또 게으름을 피우면 바닥없는 샘이 있는 숲에 가서 상수리를 주워 오라 시킬 게다.
바닥없는 샘은 머리가 아홉 개 달린 뱀이 지키고 있는 곳이었다. 레르나 땅이 가물 때 물길을 끌어오려고 샘에 갔던 농부들 중에 살아 돌아온 자는 없었다. 누구는 산 채로 잡아먹혔다 했고 또 누구는 뱀이 내뿜는 독에 살갗이 삭아서 죽었다고 했다. 네메아의 사자나 머리 아홉 개 달린 뱀과 맞닥뜨리는 것보다야 손이 물러터지는 편이 나았다.
손에 굳은살이 박인 뒤에는 항아리를 채우고도 하늘에는 아폴론의 태양마차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 글라우케는 쟁기를 만들 만한 굽은 나무를 찾아다녔다. 굽은 너도밤나무를 찾아내어 농부에게 위치를 알려주면 보릿가루와 아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열두 살 아고리의 날은 열세 살이 될 무렵에 막을 내렸다. 짧은 머리로도 막아낼 수 없는 일이 닥친 것이었다.
레르나의 귀족 하나가 사냥을 다녀오던 길에 글라우케를 보았다. 그는 돼지에게 먹일 물을 나르는 글라우케를 지목하며 얼굴이 검은 노예장에게 일렀다.
저 아고리를 내게 데려오너라.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히 다루어라.
글라우케는 뭣 모르고 끌려갔다. 돼지치기의 말을 믿은 탓이었다.
언제까지 날품팔이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귀한 분 집에 머물면서 새 일을 배우도록 해.
돼지치기가 노예장에게 올리브 기름단지를 받았다는 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귀족의 집에 도착하고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침실 수발이라는 걸 알았다.
귀족은 울음을 터뜨리는 글라우케를 달랬다.
아고리, 나 같은 귀족이 어여쁜 아고리를 곁에 두는 건 흠이 아니란다. 제우스신께서도 트로이의 아름다운 왕자 가니메데스를 올림포스로 데려가 술을 따르게 하지 않았더냐. 아고리, 너는 내 술잔을 채우고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는 너의 후견인이 되어 시를 가르칠 것이다. 내 곁에서 나를 칭송하는 시를 짓다가 성인이 되어 나의 침실을 떠나야 할 즈음에는 무사 여신들의 총애를 받는 시인이 되어 있을 게다. 여태 본 아고리들 중에 가장 어깨가 작고 어여쁘구나. 가서 몸을 씻고 향유를 바른 뒤에 다시 오라.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할까도 했으나 그랬다간 귀족과 노예들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질 게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