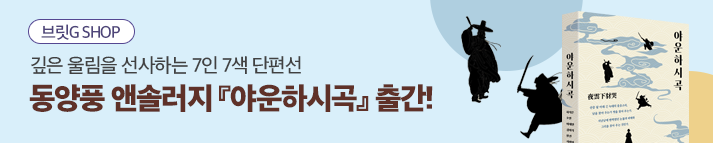산은 험했다. 울창한 숲길이 끝없이 계속되더니, 가파른 능선을 따라 길이 이어졌다. 그 길마저 점차 좁아지면서 왼쪽으로는 천 길 낭떠러지가 아찔하고 오른쪽으로는 높은 절벽에 기대다시피 위태로운 걸음을 옮겨야했다. 산 아래 주막의 주모가 아차 한발 헛디뎌 산은 못 넘고 황천 건너간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겁을 주던 것이 허풍만은 아니었다.
수찬은 앞서 가는 총각을 흘긋 바라보았다. 숱 많고 거친 머리털을 대충 땋아 늘인 것이 절벽 바람에 푸슬푸슬 날리고 있었다. 이 험한 길에 저 여유만만 걸음새라니. 산적질을 해먹으며 산에 사는 인간 아닌가 걱정도 된다.
주모가 험한 산세와 함께 들먹이던 것 중 하나가 산적 아니었던가.
“산길 험한 데에 산적 들끓는 거야 당연한 이치지. 까놓고 말해서 임자처럼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중늙은이는, 산적들에게는 아주 봉이겠네, 봉.”
‘빌어먹을 여편네 같으니. 중늙은이라니. 내가 나 늙은 걸 모른다고 했나.’
주모가 험한 산세와 도적만 들먹인 것은 아니었다. 하늘 아래 험한 곳, 험한 인간 다 겪어보았다며 웃는 그를 향해 주모는 혀를 쯧쯧 찼다.
“내가 뭐 하룻밤 방값 벌려고 이러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오랑캐 땅 다니면서 속아만 봤나. 산길 험하고 산적 끓는 것만 문젠 줄 아오?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저 산에는 세마골 터줏대감인 늙은 호랑이가 있는데, 거느리고 있는 창귀가 수십이라 혼자 길 떠난 사람 있는 거 알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다고. 귀신같이가 아니라 바로 귀신이지 뭐.”
“세마골 터줏대감이라. 늙은 호랑이는 알겠는데, 창귀라니 그게 무엇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