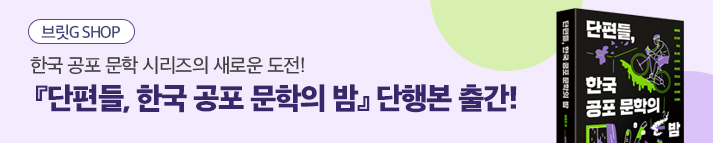새벽 2시 40분.
아기가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더니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곧 고막을 찢을 것 같은 울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메웠다. 오늘도 어김없이 2시 40분에 아기가 깼다. 아기 손목에 투명한 시계라도 있는 걸까. 내가 침대에 누운 자세로 고개를 들어 옆에 있던 아기침대를 내려다보자 아기가 나를 보고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다행히 울음소리가 옆에서 자는 아내까지 깨우지는 못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걸까? 부족한 잠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눈구멍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누가 이마에 송곳을 찌른다면 피 대신 잠이 쏟아질 거야. 나는 힘겹게 침대에서 내려와 아기를 끌어안았다.
“우리 수미, 일어났구나.”
내 품에 안겨 어깨에 머리를 기댄 아기는 잠시 잠잠하더니 곧 내 귀 바로 옆에서 더 큰 소리로 앵앵거리며 울었다. 고막이 얼얼해진다는 게 아마 이런 느낌일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도 여기 있고, 엄마도 여기 있어. 괜찮아, 수미야.”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위아래로 흔들어주자 울음소리가 조금 잠잠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잠들지는 않았다. 아기를 들고 정면으로 바라보자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보였다.
“우리 수미,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거짓말. 새벽에 보는 아기의 맑은 눈동자는 무섭다. 창밖의 가로등 빛이 새어 들어와 아기 눈망울에서 반짝하고 깨질 때는 악마의 미소가 떠오른다. 그럴 때마다 잇몸밖에 없는 저 입속에 보이지 않는 송곳니가 잔뜩 줄지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작은 입술 사이로 이빨을 드러내며 넌 이제 잠들 수 없어, 라고 말하겠지.
“큰 눈은 엄마 닮았고 큰 코는 아빠 닮았네.”
“아… 진짜.”
아내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몸을 비틀며 일어났다. 큰일이다. 아내를 깨워버렸다.
“새벽에 이게 뭐 하는 거야? 냉장고에 모유 얼린 거 있잖아. 빨리 그거나 먹이고 재워.”
“알았어. 미안해. 얼른 다시 자.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
아내는 나를 잠시 노려보더니 다시 몸을 돌리고 잠을 청했다. 그러는 도중에도 아내의 입에선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다.
아기를 안은 채 부엌으로 나가자 냉장고 온도알림판 새파란 빛만이 아기 얼굴에 쏟아졌다. 1그램의 미소도 없는 아기의 표정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냉장고에서 모유를 꺼내 중탕으로 적당히 데우는데 15분 정도가 걸렸다. 새벽 3시 5분이다. 아기는 한사코 모유 먹기를 거절했다. 투명한 젖꼭지가 입술에 부딪히기 무섭게 고개를 돌렸다. 예전엔 그렇게 잘 먹더니.
…날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