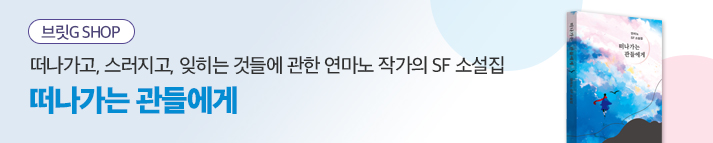유련씨가 나를 집에 데려온 건 어느 여름밤의 퇴근길에서였다.
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고전적인 장소에 놓여있었다. 어두운 골목의 가로등 아래. 쓰레기봉투 사이 버려진 서랍장 위에 말이다.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릇의 좌표 하나를 잘못 찍어 불시착한 죄였다.
골목에는 한여름 밤의 눅눅한 공기에 온갖 생활 쓰레기가 내는 시큼한 냄새가 깃들어 흐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절묘하고 역한 냄새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지나갔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유련씨는 이 길을 택했다.
회식을 끝내고 돌아가는 늦은 밤의 귀갓길. 혹여 나쁜 마음을 품고 위협할만한 사람이 숨어있지 않을 만한 곳은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이 골목뿐이었다. 유련씨는 얼른 집에 가서 은아가 잘 있나 봐야겠다는 생각에 미간을 찌푸린 채 골목으로 후닥 뛰어 들어왔다.
그러고선 나를 발견했다.
내가 든 그릇은 노란색 곰 인형이었다.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것처럼 깨끗하고 보드랍게 보이는. 위생과 청결을 위해 그릇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우리 종족의 화학 반응이 빛을 발해준 덕분이었다.
까만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 깔끔하고 뽀송뽀송한 털,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구석이 있는 얼굴.
장마철에 밖에 나앉아 볼썽사납게 젖은 채 다음에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그 얼굴은 나의 진심이 빚어낸 작품이었다.
유련씨는 그런 나의 외형과 내가 정신체 타래 뭉치를 가련하게 떨어 발생시킨 외침에 홀린 듯 내게로 다가왔다.
우리 종족의 외침이란 실처럼 뭉친 자신의 정신체 타래를 전율시켜 타인에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전이(轉移)시키고 공감을 끌어내는 외침이었다. 이게 통하려면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했다. 나는 유련씨가 외톨이 인형을 가엾게 여겨줄 만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길 빌어야 했다.
유련씨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내가 새것처럼 깨끗하다는 점을 인지하자 천천히 손을 뻗었다. 지금에야 알았지만, 당시 유련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은아의 생일선물을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본의 아니게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물론 유련씨가 회식 덕에 약간 취해 있었던 것도 보탬이 되었다.
유련씨가 나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잡고서 발걸음을 떼는 순간, 나는 환호했다. 다짜고짜 세탁기에 넣어져 세제와 섬유유연제 속에서 울·실크 터보 3단 세탁에 두들겨 맞고 햇빛에 살균 당하기 전,
그리고 은아를 만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