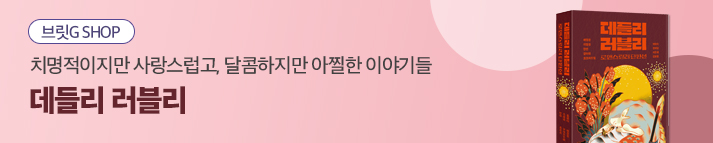후루룩 몰입해서 읽었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않았다. 한데 글을 읽은 날 밤 자려고 누우니, 문득 어둠이 낯설었다. 평소 빛도 소리도 없어야 푹 자는 편이라 암막 커튼으로 창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잠들지를 못하는데, 그날만큼은 TV든 라디오든 스탠드든 뭐라도 하나 켜 놔야 할 것만 같았다. 평상시 익숙하던 아파트의 문,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무언가 흔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건 무언가가 악의로 가득 찬 말들을 흩어낼 것만 같아서.
소영은 태풍이 닥치는 한여름이면,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저택을 찾아 제사를 지낸다. 죽은 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은 끔찍한 집구석을 찾아와서는 굳이 제를 올리는 소영의 의도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다. 하지만 곧 소영이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한 사람, 도진의 존재가 그녀의 삶의 버팀목임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트러진 이 저택에 끌리듯 나타난 이들은 산 사람일까? 죽은 사람일까?
실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야기는 점차 지독해진다. 겹겹이 숨겨진 악의가 점차 고개를 들면 이곳에 누구 하나 선인이 없다는 사실만이 분명해진다. 끔찍하지 않은 사연이 없고 괴롭지 않은 죽음도 없다. 그 와중에 맹목적인 욕망을 숨기지 못하는 이들의 행각은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말을 보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지 마, 죽음을 재촉하지 마. 애초에 소영이 매단 근조등(謹弔燈)을 보고 이 저택의 어둠 속으로 발을 디딘 순간, 그들은 이미 산 자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지,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지 그런 문제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애정이라고 부르기도 숨 막힐 짙은 감정 속에서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한 가족의 비극을 끝까지 읽고 나면, 잘 빠진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붕 뜬 감각만이 남는다. 그래도 이 한 마디는 해야 하겠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었노라고. 작가가 장르 설정에 ‘로맨스’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가 최후의 최후에 이르면 독자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지독한 감정을 결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