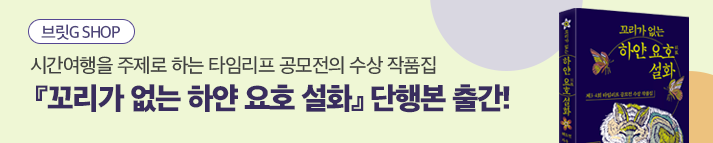“그거 맨 밑에 보시면 이름 쓰고 서명하는 곳 있으니까 다 적으세요.”
그제야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종이 위에는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말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이게 뭐죠?”
태준이 질문하자, 남자는 별 것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보안서약서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일하려면 다 써야 해요.”
태준은 서류를 더 꼼꼼하게 읽어 볼까 했지만, 앞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눈길에 빠르게 서명란을 채워 넣었다. 남자는 태준이 서명한 서류를 가져다 정리하고는, 책상 위에 작은 박스를 내려놓았다.
“핸드폰 있으면 여기 박스에 넣어요. 그리고 이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차세요.”
“네? 오른손에요?”
“혹시 왼손잡이예요?”
“아닙니다.”
“그럼 오른손에 차세요.”
태준은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 오른 손목에서 느껴지는 시계의 감촉이 낯설었다. 시계를 슬쩍 보자, 액정화면에 현재 시각뿐만 아니라 연도와 월, 일까지 나타나 있었다.
“아직 몇 분 정도 남았네요. 잠깐 기다려요.”
도대체 뭐가 몇 분 남았는지, 왜 오른손인지 알 수 없었지만,태준은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차피 파견직인 태준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다.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시간 보험사’라는 이름이 특이했을 뿐이다. 주인 의식 같은 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가끔 운이 좋거나, 관리자의 눈에 띄어서 원청과의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지만, 적어도 파견회사가 중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가져가는 30만 원 정도의 돈은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태준은 그런 행운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다. 지금까지 파견회사를 끼고 수많은 원청을 전전했지만, 비정규직으로라도 태준을 고용하는 곳은 없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파견회사를 통해 인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소모품으로 사용할 인간을 찾는 것이었다. 누구도 소모품을 오래 사용하려고 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