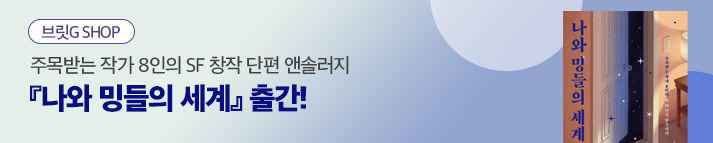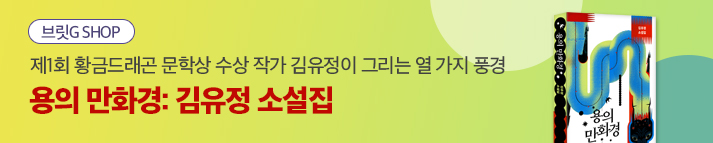어쩌면 정말로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개들이 가는 천국은 아니어도 적어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곳이. 양지바른 담벼락에는 게으른 생명체들이 해바라기를 하며 졸고, 어린것들이 뛰어다니고, 인간들도 쫓기지 않고 느긋이 어슬렁거리는 곳. 만나기로 한 이를 찾거나 이야기가 하고 싶으면 들어갈 작고 아담한 찻집이 있는 곳. 그곳에선 우리도 평화롭게 할머니와 새끼고양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곳으로 떠나자고 위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까지는 너무 많은 뺑소니 타이어 자국이 난 길이 있다. 살아있는것들이 버려지는 도랑과 피묻은 유리병이 구르는 골목과 발길질 당한 문이 늘어선 집들을 지나가야 한다. 넘어져서 다친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또 달려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곳은 됐다. 나와 밍은 여기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