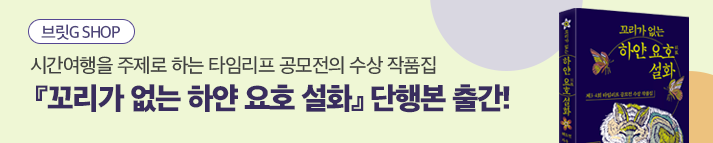내가 처음 옴니션트에 관해 들은 것은 연초의 술자리에서였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매년 초에-정확히는 1월의 두 번째 주말에-선배고 후배고 할 것 없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 누구든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만나서 축하하자는 것이 최초의 취지였다고 하나 그것은 내가 입학하기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당선작과 심사평을 헐뜯고 조롱할 뿐인 볼썽사나운 모임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어차피 술을 마시기 위한 구실이니 아무려면 어떻겠냐만.
하여간 그런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정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소개한 사람은 2년 후배인 윤이었다. 녀석은 도무지 글을 쓸 것처럼은 안 생겼고 실제로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아리 활동은 누구 못지않게 열성적이었으므로 나는 녀석이 우리 중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윤이 누굴 좋아하든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멍청히 앉아서 게임 얘기나 들을 바에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난 게임은 별로 흥미 없어서.”
“하지만 이게요, 단순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등단 작가 중에 옴니션트로 소설 쓴다는 사람이 제가 아는 것만 다섯이에요. 이쯤 되면 이건 동아리 차원에서 구입해줘야 마땅하다는 거죠.”
“소설을 쓰다니?”
“제 얘기 하나도 안 들었죠?”
“들었어. 그러니까 나사 출신 아무개가 개발한 앰비셔스라는 게임이 불세출의 걸작인데….”
“옴니션트.”
“그래, 그거. 근데 그게 소설을 써준다고?”
“엄밀히 말하면 소설로 옮겨 쓰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니 그냥 사서 해봐요. 3만원도 안 하는데.”
“나 원, 그렇게 안일하게들 하니까 신춘문예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냐.”
“와, 내가 진짜 3만원 때문에 신춘문예가 욕먹을 줄은 몰랐다.”
“얼마인지가 문제가 아니야. 소싯적에 오규원 시인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에서 말하기를….”
그 순간 윤이 세라를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찰나의 우연이라기에는 충분히 노골적이고 음흉하며 질척거리기까지 한 시선을.
“아하.”
“뭐가요?”
“뭐가?”
“아하, 라면서요.”
“아, 그게… 지금 막 뭔가 알았거든.”
“그러니까 뭐를요?”
“넌 몰라도 돼.”
“말 안 해줄 거면 게임이나 사요.”
“알았어, 알았어. 앰비언트라고 했지?”
“옴니션트!”
윤은 과장된 몸짓으로 가방을 뒤지더니 내 손바닥에 유성 펜으로 ‘옴니션트’라고 적어주었다. 나는 간지럼을 못 참고 그만 폭소했다.
뭐- 그렇게 호언장담했건만 나는 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지냈다. 계절이 바뀌고 바뀌어 마지막 학기가 시작됐을 때 나는 동아리방에 거의 올라가지 않게 되었다. 딱히 바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좀 시들해졌달까, 취업의 벽을 실감하느라 주눅이 들었달까.
그런 시기에 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 오랜만이다.”
“누나! 누나!”
“살살 말해도 들려. 웬일이야?”
“옴니션트 안 샀죠?”
“옴니… 으응, 아직.”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추석 마지막 날까지만 무료니까 당장 사서 해봐요. 전화 끊자마자 링크 보낼 테니까. 알았죠?”
“야, 이게 그렇게까지 권할 일인가 싶다.”
“우리 동아리에서 안 산 사람은 이제 누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 너 회장 됐다며! 회장이랍시고 회원들한테 게임이나 강매하고 다니는 거야?”
“무료라니깐, 무료.”
“너도 참 징하다 징해.”
“누가 징하다고요?”
풍문에 따르면 윤과 세라는 교제 두 달여 만에 깔끔하게 결별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탈퇴한 건 세라였다. 나는 윤이 왜 동아리에 남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