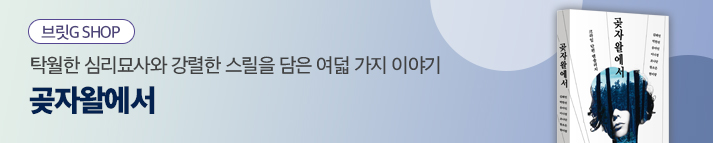그 치마는 1층 출입구 손잡이에 걸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보이는, 계단을 내려가기 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울긋불긋한 할인마트 전단과 광고지로 폭격당한 철제 우편함 옆에서, 치마는 우연히 포획된 심해생물의 매끈한 표피처럼 신비로운 윤기와 우아함을 뽐냈다. 바지걸이에 치마 양쪽이 집게로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고, 벌어진 안감으로 유혹하듯 상표 딱지가 내보였다. MADE IN ITALY.
희정의 눈길이 다시 한번 치마를 훑었다. 어둔 회색과 분홍색 스프레이로 그린 듯한 무늬가 활짝 핀 작약꽃 같기도, 먹구름 같기도 했다. 어쩐지, 좋아 보이더라니. 출근하면서 세탁소에 맡기려던 걸 허둥대다 그냥 걸어 놓고 간 것 같았다. 오전 아홉 시. 어둡고 무겁게 쳐진 대기를 뚫고 힘겹게 가랑비가 내린다. 차라리 속 시원히 퍼부어주면 좋으련만.
“와, 이 치마 정말 예쁘다.”
딸이 조그만 손으로 치마 귀퉁이를 쥐고 만지작거렸다.
응, 남의 거야, 만지면 안 돼, 하며 딸의 노란색 우산을 펼쳤다. 윤솔이가 우산을 건네받더니 조르르 계단을 앞서 내려가고 희정은 안도한다. 한 달 전까지 계단 앞에서 매일같이 벌였던 실랑이가 떠오른다. 버스 시간 늦어, 얼른 가자, 하면 어김없이 윤솔이는 싫어, 놀이터 먼저 갈 거야, 하며 버텼다. 유치원 갔다 와서 가면 되잖아, 하면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영어만 해, 가기 싫어, 하며 엉엉 울었다. 놀이터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얘기였다. 윤솔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했고, 위태롭게 가늘어지던 희정의 인내심은 이따금 뚝 끊어지곤 했다. 고함을 지르고 나면 속은 후련했지만 움츠린 아이를 보고 있자면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유치원을 옮길 마음을 굳힌 건 석 달 전 우연히 재희 엄마를 만나고 나서였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필라테스 광고지를 보고 서로 말을 튼 게 인연이었다. ‘다이어트의 계절’이라네요. 서먹한 분위기를 깨려 희정이 먼저 말을 건네자, 그녀가 전 이십 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하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까르르 웃었다. 서글서글한 얼굴에 말투가 조근조근하니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도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었다. 희정의 푸념을 듣던 그녀가 코끝을 찡긋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새 그런 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희정이 딸과 벌이는 실랑이를 목격했다고 했다.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다. 재희 엄마에게는 상대방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학에서 아동심리학을 가르쳤고, 요새 주목받는 숲 교육 분야 전문가였다. 또 아동 심리치료센터도 운영 중이라 했다. 첫 만남인데도 왠지 고민거리를 낱낱이 털어놓고 위안받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인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