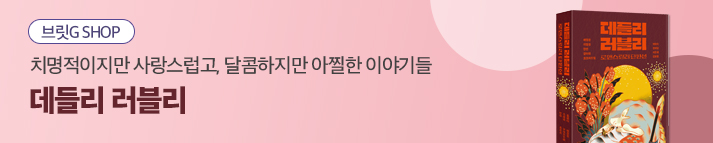“딱 1년. 그 후에, 나는 당신을 죽일 거야.”
그날을 생각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황혼이 지던 창가, 그 앞에 서 창밖을 내다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던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짧은 은발 아래 드러난 목덜미의 색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남자는 온통 흰 빛을 띠고 있었다. 빛 아래 찬란하게 부서지던 머리카락도 희었고, 검은 옷 아래 감춘 피부도 희었다. 오로지 눈동자가.
나를 돌아보며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인 듯 찬연하게 웃던 눈동자만이 붉었다.
“자.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그래.
마치 저 동화 속 천년 공작처럼.
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으나, 나는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는 제국의 공작이었다. 이 나라를 제국으로 만든 이의 머나먼 후손이며, 그 영광된 이름을 따 귄터 공작이라 불렸다.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선망하는 결혼 상대였으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몰락한 남작 가문의 외동딸과 1년 전,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이 나였다.
그는 나의 남편이었다. 비록, 1년 뒤에 나를 죽이겠다 말하며 청한 결혼이었어도. 그날을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마주한 적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고 해도.
공작가의 드넓은 저택 안 어지간한 하인들은 위치조차 모르는 다락방이 나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주어졌다. 그 안에 불안이 있었다. 내가 있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기나 했을까. 불안과 공포로 빚어진 여자가 그 안에서 1년을 살았다.
독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물 한 잔 마음 놓고 마셔본 적이 없었다.
잠든 사이에 내 목을 조르러 오지는 않을까.
편히 누워 잠들어본 기억 역시 없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자의 손에 들린 것은 나를 죽일 칼이 아닐까.
노크 소리가 나면 침대 밑에 기어들어 가 숨을 죽이고 떨었다.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 누군가 뒤에서 떠밀어 버리지는 않을까.
창을 가린 커튼 한 번 열어본 일이 없었다.
그 모든 불안 뒤에 남자가 있었다. 웃으며 나를 죽이겠다고 말하던 남자가.
약속한 1년.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날짜를 헤아리고 또 헤아려 마침내 왔던 그 날에. 죽음은 운명처럼 다가와 나를 덮쳤다. 허물어지는 의식 사이로 스치던 붉은 눈동자에, 나는 알았다.
아.
오늘이구나. 내가 죽는 날이.
죽음이 이토록 편안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무서워 떨지 않았을 텐데. 원망은 없었다. 황혼 지던 그 창가에 기대선 남자의 뒷모습을 눈 안 가득 담은 뒤로, 두려움 외에 다른 감정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오직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그렇기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바삐 움직이는 세상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승도 사람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나를 지나쳐 어디론가 움직인다. 언 숨이 찬 공기 사이로 번졌다. 코끝이 시렸다. 겨울이었다. 죽은 자에게도 계절의 온도는 닿는가.
“아가씨, 이런 데서 잠들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내 죽은 의식에게서 현실을 일깨웠다. 비로소 알았다. 산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다. 푸근한 인상의 중년 여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모두 상복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귄터 공작 각하께서…….”
“공작가의 장례식에 조문을 가는 길입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쩜, 귀한 집안 아가씨인 것 같은데.”
모든 제국민의 선망을 받던 귄터 공작이 죽었다.
침통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대로를 걸었다. 그 손마다 희고 큰 꽃이 한 송이씩 들려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주저앉은 채였다.
발갛게 얼어붙은 손이 보였다. 무어라 더 말을 걸던 여자가 이내 고개를 젓더니, 자신의 숄을 둘러주고는 바삐 걸음을 옮겼다. 그 끝엔 무엇이 있던가.
공작가의, 크고 검은 철문이.
나는 홀린 사람처럼 일어나 걸었다. 웅성대는 사람 한 무리를 헤치고, 붙잡는 손을 떨쳐내고, 맨발이 온통 쓸리도록 걷고 또 걸어.
차디찬 석관 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왜, 제가 살아 있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가씨. 어느 가문의 영애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무례는 곤란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베네어 씨.”
“돌아가 주십시오.”
집사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나를 막아섰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여기가 내 집인데. 질문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곤란한 듯 나를 몰아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는 얼굴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말려주는 이 역시 없었다. 집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나를 끌어냈다. 누군가 속닥거렸다. 공작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미친 여자들이 더러 있다더니.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지난 1년간 이 저택의 다락방에서 살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