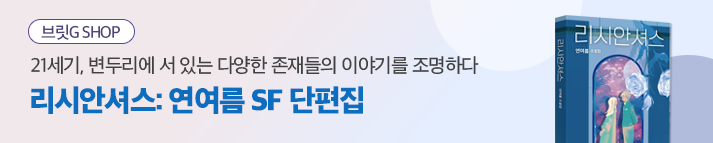“실장님.”
세 번째 불렀을 때야 근아는 모래를 돌아보았다. 병원 지하 세탁실의 삼면을 둘러 채운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토해내는 낮고 거친 회전음에 모래의 목소리도 말려 들어 가 잘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목소리 볼륨을 30퍼센트 정도 높여 부른 세 번째에야 근아는 모래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아, 네, 모래 씨.”
근아는 남은 세탁시간이 가장 적은 세탁기를 향해 다음으로 넣을 세탁물이 가득 담긴 햄퍼 두 개를 낑낑 끌고 오던 도중이었다. 바퀴가 달렸어도 무거운 햄퍼의 방향 조절은 처음엔 수월하지 않다. 근아의 이마에 땀이 맺혀있다. 애쓰는 것이다.
전임 주간 실장에 이어 새로 들어온 지 이제 겨우 두 주를 넘긴 근아는 오래 근무한 평사원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세탁실에 적응해가는 중이었다.
근아는 자기가 뭔가 실수한 거라도 있나 살짝 움츠러들었다. 마스크 위에서 두 눈이 깜빡인다. 실장이라고 해도 근무 일수로는 이 세탁실에서 가장 막내니까 아직 날마다 긴장 속에서 보낸다. 신임 실장은 변함없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다. 직급만 상사인 경험 적은 신입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은 모래에게 낯설지 않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면 근아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익혀서 모래와 다른 평사원들, 즉 휴머노이드들에게 스스럼없이 실무 지시를 내리는 실장이 될 것이다. 세탁실 3년 근무 후 행정실로 발령 받은 전임 주간 실장도 그랬고, 지금의 야간 실장도 그렇다. 세탁실은 낮과 밤 교대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실장도 두 명이다.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모래 같은 휴머노이드다.
모래는 제 표정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가 싶어 페이스 모듈에서 신중함의 수치를 15퍼센트 낮췄다. 이어 본격적인 용건을 말하기 전 안부나 상태를 묻는 가벼운 말로 상대의 긴장을 누그러뜨린다.
“소음,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며 근아는 제 목덜미에 걸쳐진 청력보호구를 톡톡 두들겨 보였다.
“많이 거슬릴 땐 이거 쓰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근아가 저걸 쓰는 걸 모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휴머노이드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듯, 이 세탁실에서 일하는 한 자신도 무뎌지고자 견디는 것 같았다.
“무거운 건 저희에게 맡기세요 실장님. 특히 오염 세탁물은요.”
“괜찮아요. 지금은 저도 배워야 하니까요.”
근아의 얼굴에서 긴장이 빠져나가자 모래는 전해야 했던 용건을 앞으로 내밀었다. 구겨져 뭉쳐진 환자복이었다. 빨아서 단정하게 개켜진 환자복이 아니라 병동에서 수거해 온 아직 세탁 전 그대로인 것이다.
“환자복이…… 왜요?”
의아하게 바라보는 근아에게 모래는 환자복의 접힌 면을 한 번, 두 번에 걸쳐 열었다.
“윽.”
근아는 마스크 위로 코를 한 번 더 막았다. 옷 속에는 쌀밥 한 뭉치와 연근조림 몇 개, 시금치나물, 동그랑땡 몇 개와 원래는 잘 말라 있었을 김이 한데 뒤섞여 음식물 쓰레기처럼 엉겨있었다. 한 끼는 거뜬히 될 양이었고 환자복은 당연히 각종 양념의 얼룩으로 엉망이었다.
“누가 음식을 이렇게. 이거 지워지는 거죠?”
세탁실 업무를 하면서 이미 혈액을 비롯한 다양한 체액과 토사물, 오염물질을 보아온 근아였다. 그에 비하면 음식물은 귀여운 수준이다. 주사침 같은 위험 물질이 딸려 나온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나 귀금속 같은 귀중품도 아니다. 그저 매일 맞아들이는 12톤의 세탁물 중에서 식판을 그대로 쏟아 놓은 듯한 음식물 더미는 처음 맞닥뜨리는 물질이라 조금 당황했을 뿐이다.
“그럼요. 표백할 수 있습니다.”
효소 세제를 사용하면 문제없다.
“혹시 오염 세탁물로…… 분류되었어야 하는 건가요?”
근아가 확인하듯 물었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과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한다. 일반적인 침구나 의류는 오염 세탁물이 아니지만, 환자의 혈액이나 고름, 분비물 또는 전염성 물질이 있는 경우는 오염 세탁물로 분류해 별도의 소독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니요. 일반 세탁물 맞습니다.”
“그럼 음식물은 버리고 절차대로 세탁하면 되지 않나요?”
근아는 그렇다면 뭘 굳이 내게 그걸 보여주기까지 했느냐는 질문을 그렇게 돌려 물었다.
“병동에 고지해야 하거든요.”
“음식을요?”
아직 세탁실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마다 근아의 고개는 살짝 비스듬해지고 왼손은 작업용 가운에 딸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아까 살펴보다가 그대로 넣어두었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스포트라이트’ 페이지를 닫고 근아는 업무용 메모장을 실행시켰다.
실장의 낙은 업무 틈틈이 스포트라이트를 살피며 코멘트를 쓰는 일이었다. 교대 시간을 제외하면 세탁실에 인간은 근아 혼자이므로 대화랄 것을 나눌 상대가 전무하다. 그래서 거기에 잡담을 늘어놓는다.
“수거한 린넨에서 버려진 음식물이 다량 발견되면 간호사 데스크에 고지해야 해요. 이건 정신과 병동 햄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 근아는 제 나름의 이유를 추론했다.
“단식투쟁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맞아요.”
환자복에 이름표가 달린 것도 아니니 누가 입던 것인지 바로 특정은 못 하지만, 린넨에서 음식물이 발견되었다 알리면 간호사들은 대체로 어떤 환자인지 어림짐작한다. 당장은 몰라도 자연히 드러난다. 먹기를 거부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한 끼만 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감시가 시작되면 계속 숨기기는 무리수다.
모래는 근아와 세탁실 한 편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엔 다소 초라한 면적이다. 작은 방 중앙에는 낮과 밤 관리자 공용 책상이, 그 위에는 서류작업이나 업무 보고용으로 쓰는 태블릿 패널이 놓여있다. 나름 사무실이라 세탁실과 이곳을 분리하는 벽이 소음을 약간은 낮춰준다.
근아는 바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 데스크를 호출해 버려진 음식을 펼쳐 보이고, 오늘 오전 수거한 세탁물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말을 전하면서 근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듯 몇 번이나 패널 너머의 모래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그때마다 모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