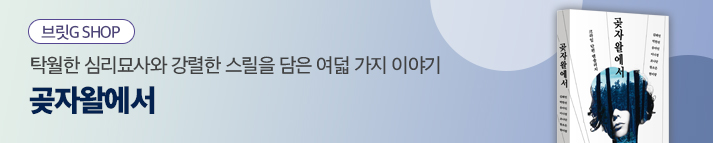내가 건달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래로 세상은 늘 불황이었다. 단지 덜 불황이냐 더 불황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2010년에 나는 스물네 살이었는데 그때는 덜 불황에서 더 불황으로 바뀌는 과도기였다. 반짝 살아나던 경기 부양의 불씨가 금세 다시 꺼지려 하고 있었다. 그 여파는 우리한테까지 미쳤다. 꼬박꼬박 돈을 내던 상인들이 앓는 소리를 해대며 상납을 미루는 것이었다.
나로 말하자면 돈을 빼앗는 일 자체에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다. 유리를 깨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지만 아버지뻘 되는 작자들을 두들겨 패는 건 아무래도 껄끄러웠다. 그들이 겁내는 게 내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내게 얻어맞으면서도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경멸했다. 때문에 나는 그들을 때리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그들 앞에서 으스댈수록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해서 푼돈이나마 걷히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힘만 빼고 말 뿐이었다.
이렇듯 예민한 시기에 宋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마 11월 말쯤으로 기억한다.
宋은 중학 동창으로, 나를 건달의 세계로 이끈 장본인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한 데 책임이 있다 뿐이지 직접적으로 조직에 발을 담그게 한 건 아니다. 그건 전적으로 내 선택이었다.
이따금 나는 또래 친구들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면 어땠을까를 상상했다. 평범하게 사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손윗사람들 대신 하급생들 지갑이나 갈취하며 졸업만을 기다렸겠지. 변변찮은 직장을 얻어 변변찮은 월급이나 받으면서 시시하게 살았겠지.
결국 힘쓰는 일 외에 별다른 재주가 없으니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게 현명했는지도 모른다.
宋은 달랐다. 타고난 센스가 좋다고 할까, 아무튼 꾀가 많고 셈에 밝았다. 생김새도 제법 번듯한 데다 언변도 좋아 쉽게 호감을 샀다. 건달이 아니었어도 宋은 어디서 무얼 하든 잘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宋이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2007년의 일이다. 폭행치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건 다른 간부이고 宋은 그를 대신해 자수했다고 들었다. 조직에선 환송회까지 열어주며 요란하게 배웅했었다. 그렇게 들어가 3년 만에 출소한 것이다.
우리는 시내의 한 주점에서 만났다. 아직 이른 저녁이라, 혹은 불황이라 가게에 손님은 우리뿐이었다.
“잘 지냈냐?”
宋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얼결에 손을 잡자 찌릿하고 정전기가 일었다.
내가 대답했다.
“똑같지 뭐.”
사실 나는 그 상황이 의아하고 어색했다.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퇴학의 원인이 되었던 패싸움 때 우리는 각각 다른 편에 있었다. 이후로 같은 조직에 몸담았다고는 해도 엄연히 소속한 계파가 달라 얼굴 볼 기회조차 드물었다. 어쩌다 길에서 마주쳐도 냉랭하게 지나칠 뿐이었다.
서로 치고받을 적에는 솔직히 무언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처럼 사적으로 만나는 건 상상도 못했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불러내선 안부나 물으니 어안이 벙벙한 것이었다.
어쨌든 나도 왠지 안부를 물어야 할 것 같았다.
“나오니까 어때? 위에서 잘 챙겨줘?”
“챙겨줄 거 뭐 있나. 용돈이나 두둑하게 받은 정도지 뭐. 그거 받고 손 씻기로 했어. 위에서도 은근히 바라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에 가게 하나 낼 거야.”
“무슨 가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사업이나 살짝 해볼까 하고. 실은 오늘 보자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이야. 나랑 같이할 맘 있나 해서.”
내가 당황해 머뭇거리니 宋이 덧붙였다.
“강요하는 건 아니야. 일이랄 것도 없이 그냥 취미 삼아 하면 되는 거라…. 관심 있으면 같이 하자고.”
“야, 혹시 보증을 서 달라는 거면….”
“아냐, 아냐. 밑천은 충분해. 너는 그냥 시간만 내주면 돼.”
나는 궁금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어디 으슥한 데로 데려가 해코지라도 하려는 걸까?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누가 나 담그라고 시켰냐?”
“김장 하냐? 담그긴 뭘 담가. 곧이곧대로 좀 들어.”
“다른 꿍꿍이 없는 거 맞지?”
“나 손 씻었다니까.”
“하지만 왜 나를…?”
宋이 말했다.
“너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입이 무거우니까.”
나는 그를 보았다. 그도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주점에선 청승맞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 하자.”
마침내 내가 대답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무슨 사업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로 술을 마셨고, 간간이 대화했으며, 드물게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살아온 궤적이 닮아 말이 통했고, 그러면서도 꽤 달라 지루하지 않았다. 텅 빈 주점을 나와서도 우리는 늦가을의 스산한 밤거리를 묵묵히 거닐다가 새벽 어스름이 깔릴 무렵에야 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