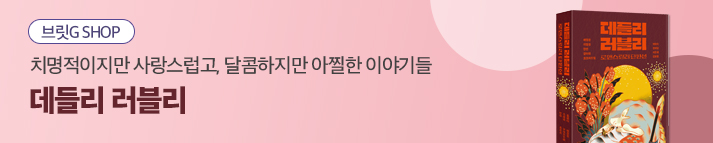내가 신기하다고 중얼거리자 당신은
“뭐가 신기해?”
라고 물었다.
놀랍고도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힌 건 나뿐인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그리 물으니 나는 그저 내 속에서 팽이처럼 회전하는 마음을 가만히 멈춰 세우고 싶어진다. 정지시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붙들어 매고 싶다.
돌지 마. 돌아 버리지 마. 그러면 안 된다고 발끝에 힘을 줘 보지만 소용없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의 여과도 거치지 않고 대답해 버리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건 영원히 내 몫이 될 것이다. 어떤 미래는 먼저 알 수 있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복종하자마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될 게 뻔하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겠지. 나의 초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모두 튕겨 낼 테지.
나는 잠자코 당신의 눈을 주시한다. 연한 밤색 눈동자는 소총 없이도 짐승을 사로잡는다. 전생의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텐데도 지금 이 순간 온 생애를 통틀어 우리 둘만이 각별히 이어져 있는 것 같다.
곤란하다, 정말 너무 곤란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등 뒤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뒷짐을 지고 있는데도 여유라고는 조금도 생기지 않는다. 손안에 움켜쥔 게 나를 이루는 본의인 것만 같아 이만 돌아가시겠다.
산중에서 살지 않은 지 오래라고 해도 엄연히 정상 포식자인데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니 호랑이가 제한 없이 나약해질 수 있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급류에 휩쓸리기라도 한 듯이 서서히 숨의 높낮이가 심해졌다.
“응? 뭐가 신기하냐고 물었잖아.”
두 눈에 비치는 초연함 앞에서 포효하고 싶은 걸 참느라 발톱을 조금 세워야 했다.
“……호환이 무섭지 않아?”
“호환?”
으름장을 놓아 보았으나 당신은 도리어 웃는다.
“나는 마마가 무섭지, 호환 따위는 무섭지 않은데.”
한때 호환을 두려워하던 이들은 모두 씨가 말라 버렸가, 탄식하다가 아니지 씨발 씨가 마른 쪽은 이쪽이지 하면서 도리질을 쳤다.
“조상 대대로 사무친 원한의 내력을 모르는가?”
“잘 알지.”
“근데 어떻게 동맹을 맺자는 거야?”
조금 전 당신은 내게 손을 잡자고 했다. 우리가 손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했다. 협조하면, 피 칠갑된 과거를 어느 정도 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손을 잡자니, 공교로운 이 관계를 즉시 끊고 멀어지는 게 마땅한데 같은 방향을 향해 어깨를 나란히 하자니. 이렇게 터무니없는 제안은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다.
무엇보다 당신은 긴밀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반드시 미워해야 할 부류의 인간이며, 아무리 긴 시간이 흘렀다 해도 옅어지거나 변색되지 않는 원한의 빛깔을 지난 원수나 마찬가지였다.
“무슨 생각하니? 얼굴까지 찡그리고.”
분명코 무채색이 어울리는 당신이 화려하게 웃는다.
“만, 만지지 마라!”
이마로 뻗어 오는 손을 보며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말았다. 두려움을 느끼는 쪽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태연한 척 표정 관리하는 일이 어려웠다.
우리가 어떻게 동맹을 맺는단 말인가. 서로 찢어 죽이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나는 가까스로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다.
“우스운 제안이다.”
“우스워?”
“그래. 말도 안 되지.”
위협적으로 보이게끔 한껏 어깨를 펴며 말했으나 당신은 그저 웃는다. 산뜻한 미소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말이 왜 우스워?”
한 걸음 다가오며 묻는 당신이야말로 맹수의 현신이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게 왜 불가능해? 조상들끼리 죽였다고 해서 후손인 우리까지 서로를 죽일 일인가? 너 참 재밌다. 사람 탈을 쓰더니 연약해졌네?”
하긴 너는 대호도 아니지, 당신이 중얼거린다. 고작 조그만 호랑이지.
나는 달려들어 당신의 가죽을 단번에 찢지 않고 침묵한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나의 행색을 떠올린다. 작은 체구의 조상을 둔 게 죄라면 죄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아담했다. 누님 아우들 또한 작았으며 당연히 그들과 같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나도 조그맣다. 세월이 흘러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목멱산에 살았던 호랑이들의 내력이었다.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이 정해 놓은 평균 체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은 아니어서 참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웃음당하다니.
“……감히.”
나는 당신을 조용히 노려보았다.
도력을 닦거나 쑥 또는 마늘을 먹은 덕에 사람이 된 건 아니었다. 빗발치는 탄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렵게 진화한 이 몸을 주제넘게 만만히 봤으니 이제 마음 놓고 적개심을 보여도 되겠지.
“그렇게 봐도 무섭지 않아, 호랑이야.”
당신은 손톱 거스러미를 뜯으며 미소 지었다.
“귀여울 뿐이야.”
큰 소리로 아르렁거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불쑥 손을 내밀었다.
“어때? 나랑 같이 일하자.”
“싫다.”
“일할 데가 필요하잖아.”
“레코드 가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디스코를 좋아하면서?”
“……디스코를 좋아하는 거랑 일터를 고르는 건 엄청 상관없는 일이다.”
석연찮은 호의를 거절하는 단단한 말이었지만, 발화한 순간 당신에게 무른 속성으로 변해 가닿는 게 느껴졌다.
“내가 무섭니?”
역시나 당신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는다.
“너 혹시 내가 무서워?”